다음주 월요일까지는 강의 일정이 있지만, 벌써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선 듯싶다. 밀린 일들과 강의 준비 말고 연휴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건 아니어도 관성적으로 모처럼 읽어볼 책을 꼽아보게 된다. 눈길이 가는 건 죽음을 주제로 한 책들이다. 벌써 나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꺾어진 건 분명하므로 '버킷리스트'도 꼽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해보고 싶은 일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적어두자). 그래서 손에 든 것이 케이티 로이프의 <바이올렛 아워>(갤리온, 2016)다. 바이올렛 아워? '우리가 언젠가 마주할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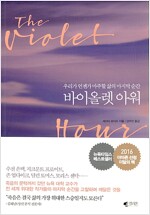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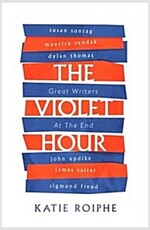

주문한 원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저자의 <이튿날 아침: 두려움, 섹스, 휴머니즘>도 같이 주문했다) 책은 미리 읽어가기로 했는데, 프롤로그를 보니 뉴욕대학의 교수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일찌감치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다. 열두 살 때 폐렴을 앓아서 한쪽 폐의 절반을 들어내는 대수술을 받은 것. 나도 고3 때 폐결핵으로 고생한 일이 있지만 저자에 견줄 바는 아니다. 일단 '인정'이다.
이미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나 다름 없다고 하는 이 책은 다섯 명의 죽음의 순간을 추적한다. 차례대로, 프로이트와 수전 손택, 존 업다이크, 딜런 토머스, 그리고 모리스 센닥, 5인이다. 내게는 그림책 작가인 모리스 센닥을 제외하면 친숙하거나 적어도 낯설지 않은 작가/시인들이다. 이 다섯 명을 고른 취지는 이렇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책이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특히 죽음에 민감하면서도 적절히 대응한 작가와 예술가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예술과 문학, 사랑과 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다룬 책이다. 또한 내가 선정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지나칠 정도로 명확히 표현한 사람들, 남다른 상상력과 지적인 투쟁심을 가진 사람들, 평범한 우리와 달리 죽음에 맞선 순간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11쪽)



같이 읽어볼 만한 책으로는 서른여섯의 젊은 의사가 스스로 마지막 순간을 기록해나간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 될 때>(흐름출판, 2016)와 신경외과 의사인 헨리 마시의 <참 괜찮은 죽음>(더퀘스트, 2016),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의 <만약은 없다>(문학동네, 2016) 등도 꼽을 만하다.



고전으로는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가려뽑은 <나이 듦과 죽음에 대하여>(책세상, 2016), 현대 작가의 책으론 줄리언 반스의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다산책방, 2016), 그리고 좀 다른 시각에서 광기와 자살, 묻지마 살인 등을 다룬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의 <죽음의 스펙터클>(반비, 2016)도 '관련서'로 지목하고 싶다(방안에서 바로 눈에 띄는 책들로 골랐다).
흠, 고르다 보니 이런 리스트는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다. 읽을 책이 이렇게 늘어나면 대체 우리는 언제 죽는단 말인가...
16.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