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내가 제목을 정한 게 아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강의에서 다루게 되면서 그제 읽은 책이 <한강, 채식주의자 깊게 읽기>(더스토리, 2016)였을 따름. 물론 고전이 아닌 특정 작품에 대한 논문집이 따로 나오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고, 이 경우에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편승하려는 속 보이는 기획의 산물인 게 뻔하다. 그럼에도 나름 '성실한' 강사답게 수강자를 대신해서 읽는 셈치고 읽었다. <채식주의자>를 다룬 다섯 편의 평문/논문 모음인데, 네 편은 어설프거나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었고, 한 편 정도만 읽을 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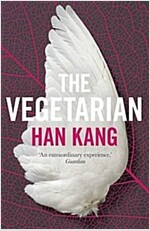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채식주의자>란 작품 자체가 내게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어설픈 작품이라는 점. 맨부커상 수상작이라는 후광을 달게 된 작품에 대해서 냉담하게 말하는 건 자칫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시적인 이미지나 문체가 부분적으로 강한 인상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말이 되는 이야기를 쓰는 데에서 산문작가의 본분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작품에서 나는 그런 작가를 발견하기 어렵다. 리얼리티가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여겨져서다. 억지스러운 구석이 많다는 얘기다. 김연수 작가의 품평을 흉내내자면 "개연성은 있으나 핍진성이 부족하다."
이 작품에 대한 불만은 한 시간 내내 떠들 수 있지만, 그냥 한 대목만 지적하자면, 주인공 영혜의 트라우마적 기억에 자리한 흰 개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렇다. 집에서 키우던 멀쩡한 개가 어떻게 하다 주인집 어린 딸(영혜)을 물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자초지종이 얘기가 안 돼 있어서 모를 수밖에) 그렇다고 해서 그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내달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죽게 만든 다음(달리다 죽은 개가 고기가 부드럽다는 게 이유다) 마을 사람들까지 불러서 온 가족이 개고기를 포식했다는 에피소드다('흰 개'도 보신탕으로 먹나? 드문 일이지 싶다).아홉 살짜리 주인집 딸을 물어뜯은 개라면 '미친 개'이고, 미친 개라면 보신탕으로 먹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은가. 해서 어떻게 해서 다리를 물어뜯겼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작가는, 그리고 영혜는 말줄임표로 대신한다.
"......내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이고 있어."
소설에는 이탤릭체로 표기된 영혜의 진술에서 서두가 말줄임표로 시작하는 유일한 대목이다. 나는 이런 처리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거두절미 스타일? 그것도 아니다. 핵심을 빼먹은 것이니까. 개한테 물렸기에 아이는 "그 개의 꼬리털을 태워 종아리의 상처에 붙이고, 그 위로 붕대를 친친 감고" 대문간에 나가 그 개가 학대받다 죽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꼿꼿하게 서서 지켜본다. "번쩍이는 녀석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난 더욱 눈을 부릅떠." 아무리 개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피를 토해 내면서 죽어가는 개의 모습을 보면 연민을 느낄 법도 하지만 아이(영혜)는 그렇지 않았다(이미 어릴 때부터 독한 성격이었다는 얘긴가?). 그 개를 재료로 만든 보신탕에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비웠다고 자랑스레 말한다.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죽은 개의 두 눈을 기억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성인이 되고 결혼 5년차 주부까지 된 영혜가 갑자기 그때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그 폭력성에 진저리치며 채식주의자가 된다? 납득이 가지 않는 연결이고 설명이다.
이 대목은 유려한 번역으로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도 잘 이해를 못한 성싶다. 원작과 그의 번역을 비교한 한 기사에서도 지적한 것이지만,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라는 문장을 데보라는 "He says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er punishment."라고 옮겼다. '더 부드럽다'를 'a milder punishment'(더 가벼운 벌)로 오역한 것. 아마도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몰라서 고기가 더 연해진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하긴 이해해도 문제다. 얼마나 잔혹하면서 엽기적인 응징인가! 아니면, 영어권 독자들이 느낄 법한 혐오감을 고려하여 일부러 잘못 옮긴 것인지도.
여하튼 이런 대목과 영혜의 꿈, 그리고 그녀의 극히 돌발적인 육식 거부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작가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냥 강렬한 이미지를 몇 개 던져놓으면 자연스레 서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듯싶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법이며, 그런 독자는 심지어 작가가 (시가 아닌) '산문정신'을 제대로 견지하고 있는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문득 작가가 쓴 산문집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그래서 찾아봤다. 에세이로 분류되는 한강의 책은 세 권 검색되는데, <내 인생의 영화>(씨네21북스, 2015)는 필자들이 한 꼭지씩 쓴 글모음집이니까 제외하면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비채, 2007)와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열림원, 2009) 두 권이고 모두 절판된 상태다.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는 좋아하는 노래에 사연을 덧붙인 책이라고 하니까 제쳐놓으면, 첫 산문집의 개정판으로 나온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이 그나마 정체가 궁금한 책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행산문'이어서 본격적인 산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내가 염두에 둔 건 동갑내기 작가(같은 70년생이다) 김연수의 <지지 않는다는 말>(마음의숲, 2012)이나 <소설가의 일>(문학동네, 2014), 내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문학동네, 2016) 같은 책의 한강 버전이다. 그가 이런 류의 책을 쓸 수 있을까, 궁금해진 것. 내기를 건다면, 나는 어렵겠다는 쪽이다.



이전에 읽은 기억이 없어서, 그리고 구매 기록도 없어서 첫 작품집 <여수의 사랑>과 <채식주의자> 바로 이후에 쓴 장편 <바람이 분다, 가라>를 어제 주문해서 받았다. <여수의 사랑>은 '문학과 지성 소설 명작선'에 포함돼 있는데, 이건 최인훈의 <광장/구운몽>, 그리고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과 어깨를 나란히한다는 뜻이다. 과연 그런가는 이 참에 읽어봐야 알겠지만 <바람이 분다, 가라>는 그냥 액면만으로 기대를 꺾게 만들었다. 소설이 아니라 단상집 같은 모양새여서다. 나는 지면을 빼곡히 채우는 게 일단 '산문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시처럼 듬성듬성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설에서 별다른 이유 없는 행갈이의 남발을 혐오한다. <흰>이라는 책을 '한강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쪽이다. '단상집' 정도 아닌가?
올해의 가장 핫한 작가에 대해 유감의 말을 적게 돼 나도 유감스럽지만, 어떤 사안에서건 소수의견은 있는 법이다. <채식주의자>가 어째서 좋은 작품인지 누군가 나를 설득해주면 좋겠다...
16.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