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저자'를 고른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캐나다의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앤 카슨과 산문집을 나란히 펴낸 김사과 작가, 이영광 시인, 3인이다.



먼저, 앤 카슨. '시로 쓴 소설' <빨강의 자서전>과 '허구의 에세이' <남편의 아름다움>(한겨레출판, 2016)이 같이 나왔는데, 일단 형식 자체가 흥미를 끈다. '시로 쓴 소설'은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의 형식인데,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궁금하다. 소개에 따르면 "앤 카슨에게 큰 명성을 안겨준 대표작"으로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중 열 번째 노역의 에피소드를 영웅이 아닌, 그가 화살로 쏘아 죽인 빨강 괴물 게리온의 입장에서 다시 쓴 작품이다. 신화 속 영웅과 괴물의 이야기는 비정하고 아름다운 소년 헤라클레스와 빨강 날개를 단 외로운 소년 게리온의 사랑 이야기로 옮아간다."

'고전을 다루는 포스트모던 작가'라는 평판은 그래서 얻게 되었나 보다. <남편의 아름다움>도 제목 자체로 눈길을 끄는데, "앤 카슨에게 '여성 최초 T. S. 엘리엇 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겨준 대표작"이라고. "존 키츠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서, 키츠의 시와 메모 편지 등에서 인용한 글이 29장의 서두를 장식한다. 화자인 '아내'가 어린 시절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배신을 겪고 이혼에 이르는 과정이 격렬한 탱고의 이미지 위로 흐른다. 부정한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는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주종적 관계에 대한 가슴 저릿한 탐구이다." 화제성에 비하면 분량도 얇은 편이어서 독서에 부담도 없다. 겨울 독서거리로 맞춤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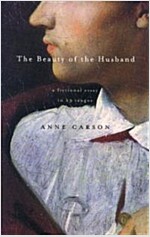
앤 카슨은 1950년생으로 2012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앨리스 먼로의 뒤를 잇는 캐나다의 대표 여성작가인 듯싶다. 그가 옮긴 <안티고네>도 궁금하다.



2005년에 등단했으므로 이제는 11년차 소설가가 된 김사과도 새 산문집을 펴냈다. <0이하의 날들>(창비, 2016). 여행산문집 <설탕의 맛>(쌤앤파커스, 2014)에 뒤이은 것이다. "나의 20대는 오롯이 '0이하의 날들'이었다"란 문구에서 예민한 자의식과 함께 강한 자기애도 느껴진다. "이번 산문집을 통해 작가는 그간 소설로써 이야기해온 출구 없는 세계의 전모,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더 가깝고도 내밀한 목소리로 펼쳐놓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년간 여러 매체에 발표한 글들을 묶어낸 이 산문집은 이제는 30대가 된 작가가 20대에 주로 써온 글들로, 시대와 세대를 읽는 한 젊은 소설가의 생생한 고민과 날카로운 시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어느 만큼 자기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사과는 가장 개성적인 목소리 가운데 하나다. <테러의 시>(민음사, 2012) 이후에 나온 책들을 모아서 읽어봐야겠다.



저자 소개에, 대학에서 영문학과 국문학을 전공하고 몇 권의 시집과 한국문학 관련서를 펴냈으며 현재는 미디어문예창작과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이영광 시인도 첫 산문집을 펴냈다.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이불, 2016). 시인은 "작년 올해, 시가 안 되던 시간에 어지러이 적어두었던 단상들을 손질해서, 산문집이란 걸 낸다"고 서문에 적었다. <직선 위에서 떨다>(2003)부터 <나무는 간다>(2013)까지 네 권의 시집을 펴냈고 아마도 학위논문일 성싶은데 <미당 시의 무속적 연구>(서정시학, 2012)를 상자했다.



첫 산문집에 대한 소개는 이렇다. "이 산문집은 여느 산문집과는 다르다. 시 같은 산문들이 불쑥불쑥 얼굴을 내밀고 글에는 따로 제목이 없다. 산문을 쓴다 해도 시인은 여전히 '자신 있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목도 달리 없고 산문이 때로 시의 몸을 지니게 되는 것. 세월호, 남의 시, 누군가의 소설, 시인들과의 술자리, 만화방, 바둑, 복싱 경기… 시인은 이 산문집에서 많은 것들을 읽어낸다.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집요하게 읽어내고 생각해내기 위하여 노력한다." 한 대목.
우린, 너무 살고 있다. 너무 서 있다. 죽여야 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격렬하다. 내 꿈은 이기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말하곤 했지만 농담은 아니었다. 이 생은 애초에 져 있는 것이다. 용기란 약해질 수 있는 마음이다. 아래에 설 수 있는 태도다 아래에서 위를 향해, 모두를 향해 말하는 행위다. "분노를 누르고, 당신의 칼을 도로 칼집에 넣는 용기를 보여주세요."(<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또 이런.
살 만큼 살고 죽을 만큼 죽어본 듯한 젊은 얼굴들이 늘어간다.
체계 말단의
알바들.
살 만큼 살고 죽을 만큼 죽어본 듯한
어린 얼굴들이 늘어간다...
이것은 사회가 아니다.
시가 되다 만 듯한 메모들에 불운하고 볼온한 시대의 공기가 스며 있다...
16.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