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연일 기승이다. 외출을 삼가고 있어서 여느 여름과 특별히 다르다는 느낌은 없지만 어제오늘 긴급재난문자가 연이어 온 것만 봐도 예사 더위는 아닌 모양이다. 그래도 일에 대한 의욕이 좀 떨어진다는 것 말고 특별히 '재난'스러운 건 없는 처지다. 아니 그게 좀 문제일 수는 있겠다. 며칠 축 처져 있으니. 그런 와중에도 책탐은 줄지 않아서 이런저련 욕심을 내본다. 그 가운데 좀 덩치가 큰 욕심은 몇 권의 역사서에 대한 것이다. 새로 나온 세계사와 근대문화사에 대한 욕심이다.



어제 주문해서 받은 책은 J.M. 로버츠와 O.A.베스타가 공저한 <세계사>(까치, 2015)다. '학술적으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보통 독자들에게도 가장 널리 읽히는 세계사'라고 광고하는 책. 실제로는 1976년에 초판이 나왔고, 번역 대본이 된 책은 2013년에 나온 6판이다. 애초엔 로버츠가 쓴 책인데, 5판부터 베스타가 가세했다. 번역서는 두 권짜리로 나왔지만 원저는 1,260쪽짜리 단권이다. 단권 세계사로는 가장 훌륭하다는 게 대략적인 평판으로 보인다. 소개는 이렇다.
이번에 국내에 첫 소개되는 제6판은 최근의 세계 역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증보하여 전면 개정해서 출간되었다. 전체 세계사를 시대별로 다루면서, 세부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또한 미래에 상당한 유산들을 남기고 인류의 역사적 흐름을 바꾼 주요 역사적 과정들을 정리하고, 그 사건들의 역사적 의미를 예리한 시각으로 탁월하게 보여준다.





분량으로는 <세계사>를 능가하는 게 에곤 프리델의 <근대문화사>(전5권, 한국문화사, 2015)다. 독어판 원저가 1,600쪽 분량이라니 말이다. 1931년작. 이만한 분량을 쓴 저자나 옮긴 역자나 다 경탄스럽다.
독일어판 1,600쪽 분량에 가까운 <근대문화사>는 출간되자마자 대중에게 폭발적 관심을 받았다. 당대에도 표현주의 작가 알프레트 되블린과 저널리스트 레오폴트 슈바르츠쉴트, 극작가 아르투어 슈니츨러 등의 추천을 받은 <근대문화사>는 수십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이 기념비적인 작품은 600여 년간 서구인이 겪은 문화적 부침의 역사를 섬세한 예술적.철학적 문화프리즘으로 그려낸다. 이 부침의 역사 속에는 예술과 종교, 정치와 혁명, 과학과 기술, 전쟁과 억압 등속의 거시적 문화 조류뿐만 아니라 음식.놀이.문학.철학.음악.춤.미술.의상.가발 등과 같은 미시적인 일상생활의 문화 조류도 포함된다.
기념비적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읽겠는가, 라는 점. 일단 5권의 책값만 138,000원이다(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으로 움베르토 에코가 엮은 <중세>는 1권이 80,000원이므로 4권이 완간되면 300,000원이 넘어갈 기세이지만, 단일 저자의 책만 고려하자). 게다가 2,000쪽을 훌쩍 넘는 번역서의 분량이라니!



이런 계산 때문에 주문은 잠시 보류해놓은 상태다(폭염이 지난 다음에 주문하는 게 택배 기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책은 영어판으로도 나와 있는 걸로 보아(3권짜리다) '수십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걸로 보인다(현재까지 절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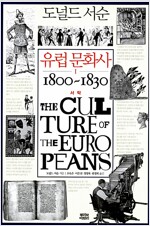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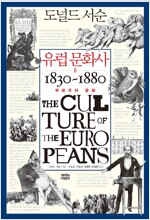



아무튼 분량으로는 도널드 서순의 대작 <유럽문화사>(전5권, 뿌리와이파리, 2012)와 견줘볼 만하겠다. 구입한다면 두 시리즈를 서가의 같은 칸에 꽂아두어도 좋겠다 싶다(당장은 <유럽문화사>의 행방을 모르겠지만)...
날도 더운데 두꺼운 책 얘기를 꺼내서 더 덥게 느껴지지만 책도 이열치열이란 게 있어서...
15.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