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 일을 전부 연휴로 미뤄놓았더니 나흘간의 휴일도 짧게 느껴진다. 연휴라곤 하지만 가족모임도 있으니 풀타임 '자유시간'이라곤 할 수 없다. 재택근무에 나서기 전에 신간들을 둘러보다가 다시 나온 '어제의 책'들을 관심독서로 올려놓는다. 소장도서라 하더라도 이미 서재가 기능을 상실한지라 읽으려면 다시 구입해야 한다. 장바구니에 넣은 두 권의 책은 로버트 단턴의 <책과 혁명>(알마, 2014)과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지식공작소, 2014)다.



11년만에 새로 나온 <책과 혁명>은 역자는 같지만 이번에 출판사를 옮겼다. 부제 '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 셀러'가 원저의 제목이다.
<고양이 대학살>로 잘 알려진 로버트 단턴이 이번에는 프랑스 혁명 전후 금서(禁書)의 목록과 당시 출판업계의 관행을 탐구한다. 치밀한 자료조사와 흥미진진한 서술, 책의 역사와 프랑스 혁명사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관점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단턴은 포르노소설, 연애소설, 에스에프, 중상비방문 등 사람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자극하는 도서들이 당시 사람들의 봉건적 인식체계를 뒤흔들었다고 본다. 단적으로, 섹스는 계층과 계급을 초월한다. 즉 섹스는 평등하다. 단턴은 포로노소설들로부터 ‘평등한 세상’이라는 혁명의 위대한 관념이 싹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로버트 단턴은 미시사, 문화사 연구를 주도하는 대표적 역사학자로 자주 호명됐는데, <책과 혁명>이 보여주듯 그의 출발점은 18세기 프랑스사 연구다.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18세기 파리의 의사소통망'을 다룬 <시인을 체포하라>(문학과지성사, 2013)도 <책과 혁명>과 나란히 읽을 수 있는 책. 강창래의 <책의 정신>(알마, 2013)의 첫 장도 <책과 혁명>의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다. <책과 혁명>의 두께가 부담스러운 독자라면 참고해도 좋겠다.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는 판이 두번 바뀌었다. 1995년에 초판이 나오고, 2001년에 재판이 나왔었다. 이번에 나온 건 번역도 일부 교정했다고 한다.
20세기 유럽 최고의 인문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슈테판 츠바이크의 회고록.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일부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아 출간하는 개정판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이 책에서 1914년, 유럽에서 설마설마했던 전쟁이 어떻게 어이없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는 "이성에 맞는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작가 로맹 롤랑,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휘자 브루노 발터 등 다양한 예술가, 학자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그의 정신세계를 심화시켰다. 그는 이 회고록에서 그 세계적 거인들과의 만남의 순간을 상세히 기록하며 시대의 풍경을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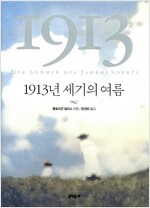


마침 지난해 가을에 나온 <1913년 세기의 여름>(문학동네, 2013)과 같이 읽어봐도 좋겠다. 소개에도 있지만 올해는 1차대전 발발 100주년이 되는 해라 여러 회고록을 포함해 관련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 기대해봄직하다. 덧붙여, 츠바이크가 좋았던 시절로 회고하는 빈의 세기말과 세기초에 대해선 칼 쇼르스케의 <세기말 비엔나>(생각의나무, 2006)과 스티븐 툴민과 앨런 재닉의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필로소픽, 2013)을 참고할 수 있다. <세기말 비엔나>는 <비엔나 천재들의 붉은 노을>(생각의나무, 2010)이라는 조잡한 제목으로도 다시 나왔다가 지금은 절판된 상태다...
14.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