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저자'를 골라놓는다. 이번 주는 국외 거물급 비평가, 철학자들로만 골랐다. 프레드릭 제임슨, 노엄 촘스키, 피터 싱어가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 이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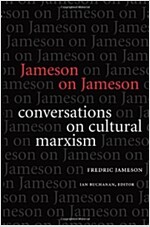

먼저 제임슨. '세계 지성 16인과의 대화'를 담은 <문화적 맑스주의와 제임슨>(창비, 2014)과 함께 <맑스주의와 형식>(창비, 2014)이 출간됐다. <맑스주의와 형식>은 <변증법적 문학이론>(창비, 1984)의 원제이자 개정판이다(30년만에 나왔다!). <문화적 맑스주의와 제임슨>의 소개는 이렇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있는 문학·문화비평가의 한 사람인 프레드릭 제임슨이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적 지식인 16인과 진행한 10개의 인터뷰를 시기순으로 엮은 책으로, 20세기의 온갖 문화적 산물에 대한 제임슨의 왕성한 탐구와 ‘문화적 맑스주의자’로서 그가 열정적으로 수행해온 지적 작업의 면모를 생생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제임슨 '가장 영향력있는 문학·문화비평가'로 호명되던 시절은 짐작컨대, 1990년대가 아니었을까.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쏟아지던 때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라고 비판하면서 소위 '문화적 맑스주의' 입장을 대표했었다. 아쉽게 생각하는 건 당시 그의 대표작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1992)가 번역되지 않은 점. 지금 생각해도 기이하기 짝이 없는데(창비의 책임 방기인가?), 그 때문에 지금까지 다수의 책이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느낌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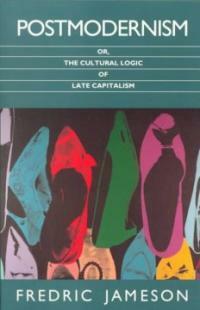

더불어 미스터리한 건 초기 주저인 <정치적 무의식>(1982)이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것. 이 또한 예고된 지 10년이 넘은 듯싶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간 소식을 접할 수 없는 희한한 책이다. 결과적으론 이 두 권이 빠진 모양새라 제임슨 수용은 앞니 두 개 빠진 형국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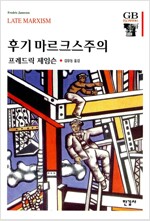


제임슨의 단독 저작으론 철학책 <후기 마르크스주의>(한길사, 2000)와 영화책 <보이는 것의 날인>(한나래, 2003)과 <지정학적 미학>(현대미학사, 2007) 등이 더 나와 있다. 제임슨의 악명 높은 문체 탓에 정말로 읽기 어려운 책들이다(내가 읽은 이론가들 가운데 최악이 제임슨이다). 이번에 나온 <맑스주의와 형식>을 원서와 함께 다시 읽어보고 싶다. 제임슨이야 별로 달라진 게 없겠지만, 나의 독해력이 십수 년 전보다 좀 나아졌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다.



그리고 촘스키. 이름은 '노엄' '노암' '놈' 등 제각각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촘스키. <촘스키,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갈 세계>(시대의창, 2014)가 신간으로 나왔는데, 원저는 2010년에 나온 <미래 만들기>다. 촘스키 '근황'을 말해주는 책. '만화로 읽는 21세기 인문학 교과서'를 표방한 <노암 촘스키의 생각을 읽자>(김영사on, 2013)도 최근에 나왔는데, 고등학생이나 예비대학생이 읽기에 적당한 입문서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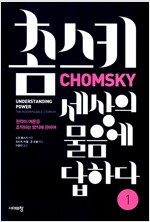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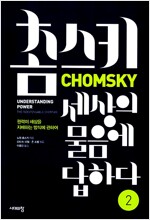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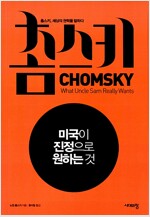


촘스키 책을 언급하는 김에 잔소리를 붙이자면, 국내 출간된 촘스키의 거의 모든 책이 제목에 '촘스키'를 달고 있고, 표지에도 더 크게 박혀 있다. 제목이 그냥 다 '촘스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 정도면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란 제목과는 반대로 '묻지마 촘스키'라고 해야 할까. 어떤 주제의 책이고, 전작들과는 어떤 연관성 속에 놓이는지 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촘스키에게 물어봐'식밖에 되지 않는다. '닥치고 촘스키' 독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은 독자는 내용을 가늠하기 어려워 좀 불만스럽다.



끝으로, 피터 싱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시대의창, 2014)가 재번역돼 나왔다. 마치 <실천윤리학>(연암서가, 2013; 철학과현실사, 1991)이 작년에 재번역돼 나온 것처럼. 원저는 1993년에 나왔으니 이 또한 20년 된 책이다. 어떤 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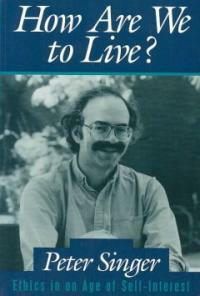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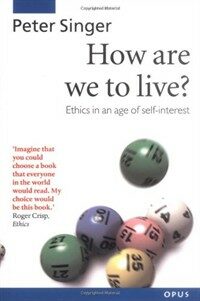
전 세계에 동물 해방 운동의 불꽃을 지핀 피터 싱어의 책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피터 싱어는 철학과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만 논의가 한정된 듯한 ‘윤리’의 문제를 구체적인 삶의 실천 영역으로 끌어당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생각을 ‘대자보’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피터 싱어는 서두에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향해 ‘궁극적 질문’을 던질 것을 요구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것이 바로 궁극적 질문이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각자 진정한 삶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자주 잊고 지내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윤리적 삶의 가능성’을 돌아보게 하는 화두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삶’이 현실에서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식적인 증명이다.
곧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를 '안녕들 하십니까?'란 질문과 겹쳐서 읽어도 좋겠다는 것. 주로 개인윤리 차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싱어가 한국의 현실을 좀 안다면 이런 제목의 책도 쓰게 되지 않을까. '정부가 이렇게 막 나가도 괜찮은가'. 또다른 갑오년도 근심과 함께 시작하게 돼 유감스럽다...
14. 01. 11.



P.S. 촘스키 얘기가 나온 김에 절판된 책에 대한 아쉬움도 적는다. <언어지식>(아르케, 2000) 얘기인데, <언어에 대한 지식>(민음사, 1983)의 개정판이었다. 나는 후자를 갖고 있어서 구해놓지 않았는데, 어느새 절판된 지 오래됐다. '언어학자' 촘스키의 기본 생각을 알려주는 책(초기 저작인 <데카르트 언어학>이란 책도 같은 부류인데,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전문서를 제외한다면, 현재로선 <촘스키, 사상의 향연>(시대의창, 2007) 같은 앤솔로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