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세 명의 저자를 '이주의 저자'로 꼽고 있지만(연간 150명이나 된다!), 때론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책들이 나오고 있기에 선정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보통은 구면인 저자들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선정을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주의 저자로 먼저 꼽을 디팩 초프라가 그런 경우다.



물리학자 레너드 믈로디노프와의 공저 <세계관의 전쟁>(문학동네, 2013)이 출간됐다. '세계적인 영성철학자이자 대체의학자'라고 소개되지만, 국내에도 많이 번역된 편이지만, 초프라의 책을 읽은 적은 없다. 그럼에도 한권을 고른다면 <세계관의 전쟁>이다. 이유는 물론 레너으와의 공저이기 때문이다. '과학과 영성,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부제대로 디팩과 레너드는 각각 영성과 과학을 대표하여 '세계관의 전쟁'에 임한다. 지적 이종격투기라고 할 만큼 흥미로운 일전이다.



<유클리드의 창>(까치, 2002)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된 믈로디노프는 스티븐 호킹과의 공저 <위대한 설계>(까치, 2010)으로 이름을 알렸고, <'새로운' 무의식>(까치, 2013)으로 독자층을 넓혔다(모두 까치에서 나왔군). <세계관의 전쟁>에 대해서는 마이클 셔머의 평이 눈에 띈다. "이런 중대한 주제를 다룬, 이제껏 내가 읽어본 책들 중 단연 최고다. 두 저자는 논쟁의 본질을 잘 담아냈다. 워낙 매력적이기에 여러분은 책을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과학과 종교의 전쟁에서 이 책은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새로운 변수이다."



두번째 저자는 에드워드 윌슨이다. 그의 <사회생물학> 개정판 번역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막간에 나온 <과학자의 관찰노트>(휴머니스트, 2013)도 '에드워드 윌슨'이란 이름을 상기시켜주어서 골랐다. <개미언덕>(사이언스북스, 2013) 같은 단독 저작(게다가 소설!)은 아니다. 15명의 현장 과학자가 각자의 관찰노트를 거리낌없이 내놓았고 에드워드 윌슨은 에필로그를 맡았다. 프롤로그를 쓴 마이클 캔필드는 '또다른 <비글호 항해기>를 기대하며'라고 적었다. 과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엿보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일반독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노트라고 할까.



참고로 다윈의 <비글호 항해기>는 현재 두 종의 완역본이 나와 있다. 가람기획에서 나온 장순근 번역은 최근 <찰스 다윈의 비글호 항해기>(리젬, 2013)로 다시 나왔고, 다른 하나는 샘터사본이다. <종의 기원>과 함께 <비글호 항해기>도 새 번역본이 더 나온다고 들은 듯싶은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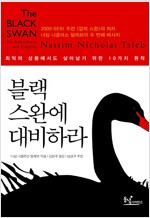

세번째 저자는 <블랙스완>(동녘사이언스, 2008)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신작 <안티프래질>(와이즈베리, 2013)이 번역돼 나왔다. '블랙스완'의 해독제가 '안티프래질'이라고. 꽤 두툼한 책인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사람의 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 강해지고 소문과 소요는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욱 격렬하게 번져가듯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스트레스, 무질서, 가변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안티프래질은 무질서와 불확실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 무질서를 원하는 특성을 뜻하며, 탈레브가 ‘깨지기 쉬운’을 의미하는 프래질(fragile)에 ‘반대’라는 의미의 접두어 안티(anti)를 붙여 만들어낸 신조어다. 탈레브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작 <블랙 스완>에서 개연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며 ‘월스트리트의 현자’, ‘월스트리트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800페이지 가량의 이 방대한 책에서 블랙 스완 현상에 대한 해독제로서 안티프래질을 소개하고, <안티프래질>에서 불확실성, 무작위성, 가변성, 무질서를 피하지 말고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다"고 평했다. 그런 용도만으로도 일독의 가치는 있겠다...
1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