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의 '문화와 세상' 칼럼을 옮겨놓는다. 워킹 푸어에 관한 책들을 읽다가 자연스레 신빈곤층 문제를 화제로 삼게 됐다. 한동안 사라졌던 용어가 올해부터 다시 등장한 것도 새삼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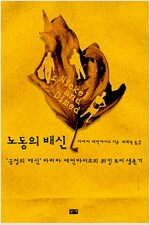


경향신문(12. 08. 10) 신빈곤층과 위기국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다가 자취를 감춘 용어가 있다. ‘신빈곤층’이란 말이다. 2009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 자신이 신빈곤층 문제의 대책 마련을 자주 주문했다. 안양의 보건복지종합상담센터를 찾아서 “신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빈곤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해 3월에 들어서면서 ‘신빈곤층’이란 말은 공문서에서 ‘위기가정’으로 대체됐다. 신빈곤층이라는 말이 자칫 현 정권이 만들어낸 새로운 빈곤층을 가리키는 말로 오해될 수 있다는 염려에 따른 조처였다. 사소해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애썼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신빈곤층이 행정상의 용어는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위기가구’란 말을 쓴다고 했다. 실직이나 소득상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일컫는 말이다. 그걸 갖다가 청와대에서는 약간 변용하여 ‘위기가정’이라고 했다. 정부로선 ‘가정’ 문제가 ‘빈곤’보다도 더 중차대한 관심사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신빈곤층’이 ‘위기가정’으로 치환됨으로써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새롭게 부자가 된 계층을 ‘신흥 부유층’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신빈곤층’은 새로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가리킨다.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계기는 알다시피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와 IMF체제였다. 경제위기와 함께 중산층이 무너지고 다수가 빈곤층으로 급전직하했다. 그로 인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지만 빈곤층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이들을 신빈곤층이라고 부른 것이니 이 용어에 대한 현 정부의 과민반응은 얼른 납득이 되진 않는다. 차이가 없지는 않다. 재등장한 ‘신빈곤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돼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예상한 2012년의 경제동향에는 신빈곤층의 확장 전망과 함께 ‘하우스 푸어’와 ‘워킹 푸어’, ‘리타이어 푸어’를 3대 신빈곤층으로 지칭했다. ‘하우스 푸어’란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 저금리 때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빈곤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다. ‘리타이어 푸어’란 아직 널리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퇴직 후에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진 경우다. 문제적인 건 비정규직과 저임금 직종의 확산으로 늘어난 ‘워킹 푸어’다.

오늘날 취업은 더 이상 빈곤탈출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노동의 배신>에 보면, 미국인의 94%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워킹 푸어 계층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거비, 탁아비용, 의료보험료, 식비, 교통비, 각종 세금 같은 필수 항목에 지출할 경비도 벌지 못한다. 놀랍게도 미국 가정의 29%가 그렇다. 우리는 사정이 좀 나은가?
과거 미국에서는 부잣집 아이들도 여름방학에는 인구의 ‘나머지 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 인명 구조원이나 웨이트리스, 청소부 체험을 해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 진로를 위한 서머스쿨이나 전문직 인턴과정을 이수한다고. 우리에게도 친숙한 풍경이다. 빈곤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빈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마치 사회적 금기처럼 돼 버렸다. 열심히 일해도 사람답게 살기 힘든 사회는 ‘위기가정’이 아니라 ‘위기사회’이고 ‘위기국가’다. 신빈곤층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되묻는다.
12.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