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974호)에 실은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마이클 샌델의 화제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와이즈베리, 2012)을 서평거리로 골랐다. 지난주 대구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KTX 안에서 읽은 책이기도 하다.

주간경향(12. 05. 08) 시장지상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덕분에 국내에선 가장 유명한 철학자 반열에 든 마이클 샌델의 신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출간됐다. 문제의식은 간명하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즉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여 샌델은 ‘과연 그래도 좋은가?’란 성찰적 물음을 제기한다. 물론 이 물음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라는 우리의 심정적 판단에 잘 부합한다. 샌델의 강점은 구체적 사례와 이성적 논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데 있다.
샌델은 먼저 시장과 시장 중심적 사고방식이 사회생활 전체를 잠식하게 된 것이 지난 30년간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라고 지적한다. 이른바 ‘시장지상주의 시대’다. 샌델은 2008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도 자본주의적 탐욕이 아니라 시장의 무차별적인 팽창에 있다고 본다.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와 병원과 교도소가 늘어나고 전쟁을 민간군사기업에 위탁하는 현상이 그러한 팽창의 사례다. 물론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현실도 있다. 가령 이마나 신체 일부를 임대하여 상업용 광고를 게재한다든가, 아프거나 나이 든 사람들이 생명보험 증권을 사서 피험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들이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돈벌이 따위가 그렇다.
하지만 ‘자본주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다지 먼 미래로만 보이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하면, 건강과 교육, 공공안전, 국가보안, 사법체계와 환경보호, 스포츠와 여가활동,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적 재화에 시장논리가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현실을 가리키는 이름이 ‘시장사회’다. 시장이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도구에 머무는 ‘시장경제’와 달리 시장사회에서 시장은 아예 생활방식 자체다. 과연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유토피아’가 우리의 지향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역할과 영향력은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 모든 것의 시장가치화, 무엇이 문제인가?
샌델은 주로 두 가지 문제점을 비판의 근거로 든다. 하나는 불평등의 문제다. 모든 것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당연하게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더욱 확연해질 것이다. 단지 비행기 좌석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돈이 차등적인 대우를 가능하게 해준다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나 모두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란 인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공공선’ 또한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점은 부패다. “삶 속에 나타나는 좋은 것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는 그것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샌델은 지적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교환되는 재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에게 돈을 주면서 책을 읽게 하는 경우 독서는 내적인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 있으며, 기부금 입학을 허용할 경우 대학 재정은 확충될지 모르지만 대학입학의 가치는 훼손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면, 시장에 속한 영역은 무엇이고, 시장에 속하지 않은 영역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재화의 의미와 목적,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그것은 무엇이 좋은 삶인지 대한 숙고를 우리를 이끈다. 그렇다면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구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다. 따라서 각자의 도덕적·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공개적으로 숙고·토론하는 것이 시장지상주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이다. 시장지상주의 시대는 그러한 숙고와 토론이 공공담론의 장에서 약화됐던 시대와 일치한다는 샌델의 지적은 음미해볼만하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시장이 결정한다.
12. 0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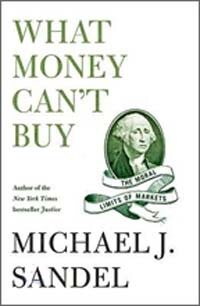
P.S. 관심저자의 책인지라 영어본도 같이 구해서 읽었는데, 내가 읽은 것과 다르게 번역된 대목들이 있어서 지적해놓는다. 서론에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샌델은 정치권의 무능력과 함께 공적 담론의 위기를 지적하는데, 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다.
정치적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귀다툼을 벌이고, 라디오 토크쇼에서 당파에 치우쳐 신랄한 비판을 주고받거나, 의회 바닥에서 이념적인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행위가 주를 이루는 시대에는, 이렇듯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도덕적 질문을 놓고 논리에 근거한 공적 토론을 벌이는 것이 임신과 출산, 아동, 교육, 건강, 환경, 시민권, 그밖의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토론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믿는다.(32쪽)
일단 우리말로 어색하다. "공적 토론을 벌이는 것이 (...)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토론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믿는다"고 주장하는 셈이니까. 원문은 "it's hard to imagine a reasoned public debate about such controversial moral questions as the right way to value procreation, children, education, health, the environment, citizenship, and other goods."이다.
역자는 "to imagine a reasoned public debate about such controversial moral questions"이 가치를 평가하는(to value 이하) 올바른 방법(the right way)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었는데, 나로선 as 이하가 questions를 받는 걸로 읽힌다. 다시 옮기면, (이렇게 여차여저차한 시대에는) "임신과 출산, 아동, 교육, 건강, 환경, 시민권, 그밖의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와 같은 논쟁적인 도덕적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공적 논쟁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논쟁이 불가능한 건 아니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샌델의 주장이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공적인 논의/논쟁의 필요성은 책 전체를 통해서 샌델이 강조하는 바인데, 역시나 같은 서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시장논리가 속할 수 없는 영역은 어디인지 판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좋은 삶에 관해 대립되는 개념들을 공공의 장에 받아들임으로써 정치에 활력을 줄 것이다.(33쪽)
'좋은 삶에 관해 대립되는 개념들'은 'competing notions of the good life'를 옮긴 것이다. '대립되는'이 오해를 유발하기 쉬운데, '경합하는' '경쟁하는'이란 의미로 옮기는 게 좋겠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두고 서로 경합하는 개념들'이란 뜻이다. 마지막 5장에서도 "Such deliberations touch, unavoidably, on competing conceptions of the good life"라고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또한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좋은 삶에 상충되는 개념에 관해 깊이 생각하기 마련이다."라고 부정확하게 옮겼다. "competing conceptions of the good life"이란 문구의 개념을 잘못 잡은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옮기면, "그러한 숙고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좋은 삶인지 경합하는 개념들을 건드리게 된다." 곧 무엇이 좋은 삶인가란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것. '좋은 삶'에 대한 숙고와 토론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샌델에게서 핵심적인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