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의 '로쟈의 번역서 읽기'를 옮겨놓는다. 아침에 보낸 원고인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은행나무, 2011)을 거리로 삼았다. 표제글 자체는 50여 쪽 정도의 짧은 글로 <월든>(펭귄클래식코리아, 2010)에도 부록으로 수록돼 있다. 인용문은 두 번역본 모두에서 가져왔다. 덧붙여 참고한 책은 박홍규 교수의 <나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필맥, 200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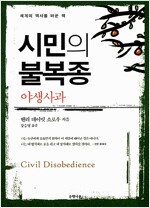


한겨레(11. 12. 24) 양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노예일뿐
“왜 당신네 미국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군인들 말만 듣고 소로가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요?”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말이다. 그가 격찬한 소로는 물론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이다. 살아서는 거의 무명인사였고 사후에도 문명에 반대한 자연주의 작가, 그래서 ‘숲 속의 로빈슨 크루소’ 정도로만 알려진 소로는 톨스토이의 말을 통해서 비판적 사상가이자 저항적 지식인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월든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생활한 경험을 적은 <월든>의 저자로 이름이 높지만, 톨스토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그보다 먼저 발표된 <시민의 불복종>(1849)이었다. 애초엔 32살의 소로가 한 잡지에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글이다. 소로는 무엇을 말했나.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는 금언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소로는 당시 멕시코 전쟁(1846~1848)에 나선 미국 정부를 맹렬히 비판한다. 영토 확장에 욕심을 부린 미국이 텍사스를 합병하면서 벌어진 이 침략전쟁에 대해 소로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상설 정부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 결과”로 일어났으며 국민들은 이런 처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고, 그다음에 국민이라는 게 소로의 기본 입장이다. 그가 보기에 법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어떤 권리인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의무”가 소로가 말하는 권리다. 법이 인간을 더 정의롭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존중할 가치가 없는 법을 존중하다 보면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불의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 소로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식과 양심에 반하여 참전하게 된 대령, 대위, 하사, 사병, 탄약 운반 소년병 등의 행렬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행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스로가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그림자이자 흔적에 불과하다는 것이 된다. 즉 “육신은 살아 있어도 이미 몸의 절반 이상이 땅속에 묻힌 채 장송곡을 듣고 있는 인간”이나 다를 바 없다. 그것은 기계이고 또 노예이다.
그런 신념을 가진 소로가 노예제에 반대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는 대놓고 말한다. “나는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정치적 조직을 한순간도 나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는 자유의 피난처임을 자임해온 나라의 국민의 6분의 1이 노예이고, 그 나라가 침략국이기도 하다면 정직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이고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생각만으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허다한 사람들이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소로는 꼬집는다. “기껏해야 그들은 선거 때 값싼 표 하나를 던져주고, 정의가 그들 옆을 지나갈 때 허약한 안색으로 성공을 빌 뿐이다.”
투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옳다는 쪽에 표를 던지지만 옳은 쪽이 승리를 해야 한다며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 정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가볍게 표시하는 정도다. 소로는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그가 납세를 거부하다가 투옥당한 일은 한 가지 사례다.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부당하게 감금하는 정부하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역시 감옥이라고 소로는 말했다. ‘꿈꾸는 자’와 ‘달리는 자’가 잡혀가는 나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11. 12.. 23.



P.S. 글의 말미에서 '꿈꾸는 자'와 '달리는 자'란 말이 염두에 둔 건 물론 송경동 시인과 정봉주 전 의원이다. '시민 불복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