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캐서린 맨스필드의 작품집이 나왔다. <뭔가 유치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민음사). 10년 전에 문동카페에 연재했던 로쟈의 스페큘럼에서 맨스필드의 단편들을 읽은 기억을 최근에 되살리게 되어('지난오늘'에서 몇 차례 옮겨놓았다) 안 그래도 관심을 가던 차였다. 오래 전에 헤어진 애인까지는 아니고, 여동생과 재회하는 느낌이랄까(35살에 요절했기에 항상 아련하게 떠올려지는 작가가 맨스필드다). 여동생이 없지만 어차피 상상적 관계이니 혈육이 못 되란 법도 없다.



캐서린 맨스필드(1888-1923)에 관한 몇 가지. 일단 뉴질랜드 출신의 작가다. 버지니아 울프, D. H. 로렌스 등과 교분이 있었다(로렌스와 더 가까웠는데, 상류층 출신이 울프와는 달리 로렌스와는 처지가 비슷했던 탓이다). 그리고 단편소설만 썼다. 정확히 말하면 장편소설을 쓰지 않았다. 시집과 비평집도 갖고 있으나 아무래도 문학사가 기억하는 것은 단편작가로서의 맨스필드다. 순정한 단편작가.
문학강의에서 주로 장편소설들을 다루기에 단편작가를 읽는 일은 드문 편이다(러시아문학에서는 고골과 체호프의 단편들, 그리고 세계문학에서는 앨리스 먼로 정도. 물론 에드거 앨런 포나 모파상의 단편들, 그리고 호손과 멜빌의 단편들도 읽지만 전체 강의에서 보자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단편은 독자적인 장르이고, 대개 장편소설과 감당하는 몫이 다르다. 그리고 근현대문학사의 주류는 아무래도 장편소설에 의해 주도된다. 그에 비하면 시와 단편소설은 주변적 장르다. 그래도 가끔은 주변적인 것에 끌리기도 한다. 맨스필드처럼 '뭔가 유치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작가를 만날 때면 더더욱.
작가 프로필에 따르면 맨스필드는 생전에 서너 권의 단편집을 발표했다. 뉴질랜드에서의 소녀시절을 다루었다는 <전주곡>(1918)은 위키피디아에 서지가 뜨지 않는다(이런 경우도 있나?).
<독일의 하숙에서>(1911)
<축복>(1920)
<가든파티>(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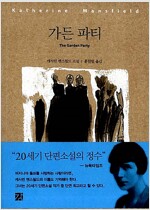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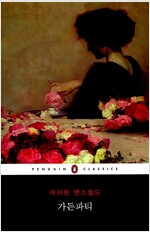

생전에 마지막 발표한 작품집이기도 해서 가장 유명한 소설집이 <가든파티>(<원유회>로도 번역)다. 국내 출간본 대부분이 이 제목으로 돼 있다. 표제작과 '차 한 잔' 등이 대표작.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작가 사후에 유작이 두 권 더 나온다.
<비둘기의 둥지>(1923)
<뭔가 유치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1924).
이번에 나온 번역본은 전체 25편 가운데 13편을 옮겼다니까 절반을 옮긴 셈. 사실 맨스필드는 작품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기에 단편 전집 내지 준전집도 나올 수 있는 작가다(현대문학판을 기다려볼까).
지난주에 또다른 재발견된 단편 작가로 루시아 벌린을 다루기도 했는데, 오직 단편만을 쓴 순정한 단편작가들만 모아서 조명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이 경우 조이스 캐롤 오츠 같은 장르 불문 다작의 작가는 빠진다). 아, 맨스필드와 울프의 결정적인 차이도 그것이다. 단편만 쓴 작가와 단편도 쓴 작가(울프와 맨스필드를 다룬 책들도 있는데 구해봐야겠다. 울프가 뉴질랜드 '촌뜨기' 맨스필드를 무시했다던가, 질투했다던가).
왠지 친근하면서도 아련한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를 떠올리는 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