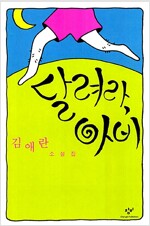김애란의 <달려라, 아비>(창비)가 리마스터판으로 다시 나왔다(다시 보니 머쓱하게도 작년 9월에 나온 것이다). 리카버판과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표지 말고도 더 많은 걸 바꿨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작가의 한 주기가 일단락됐다는 느낌도 준다. 데뷔는 2002년이라지만 작품집으로는 <달려라, 아비>가 첫 작품이고 이제 15년이 흘렀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에는 첫 산문집도 묶어냈다. <잊기 좋은 이름>(열림원).
<달려라, 아비>가 2005년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한 이래 김애란은 한국문학의 기대주이자 젊은 문학의 간판이었다(1980년생이다). 나이로는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었으니 그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게 될지 검토와 전망도 필요해 보인다. 작가로서의 자취를 살펴보면 이제까지 네권의 단편집과 한권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달려라, 아비>(2005)
<침이 고인다>(2007)
<비행운>(2012)
<바깥은 여름>(2017)
<두근두근 내 인생>(2011)
작품집을 통독하지 않고 띄엄띄엄 읽었지만(통독한 건 <바깥은 여름>과 <두근두근 내 인생>이다. 2000년대 한국문학에 대해 강의하거나 책을 내게 될지 아직 모르겠으나(여성작가 강의에서 황정은은 다루었고 강경애부터 황정은까지 읽은 여성작가 편의 ‘한국현대문학 수업‘은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김애란을 건너뛸 수는 없다. 강의하는 입장에서 관심은 무엇을 대표작으로 꼽을 것이냐는 문제다. 실제적인 문제로 한권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달려라, 아비> 리마스터판은 그런 문제를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간의 잠정적 인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더 굳어질 수도 있을 텐데, 내게 김애란이 던진 수수께끼는 단편과 장편 사이의 격차다. 자기 세대의 가장 뛰어난 단편작가가 재난에 가까운 장편을 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두근두근 내 인생>에 대해 주례사 비평을 아끼지 않은 비평가들의 얼굴을 나는 다시 보게 된다. 상식적이게도 뛰어난 대중성이 작품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베스트셀러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 아직 새로운 장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나로선 다음 작품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장편으로도 뛰어난 성취를 보여줄지, 아니면 빼어난 단편작가로 남을지. 그렇다고 반드시 두 장르 모두에서 성취를 보여주어야 하는 건 아니다.
모파상은 단편과 장편 모두에서 기량을 발휘했지만, 체호프는 단 한편의 장편도 쓰지 않았다. 체호프의 사례를 따르자면 극작 전공의 김애란은 희곡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장르를 선택하는 일은 작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사다. 김애란도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