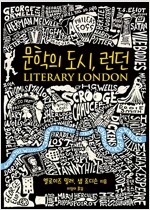런던에서의 마지막날 아침이 밝았다. 어제까지 공식일정은 마무리했다. 오늘은 오전에 소호거리에 있는 마르크스의 집을(현판만 붙어 있는 것으로 안다) 찾아보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다. 오후에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네덜란드항공이라 이번에도 암스테르담을 경유한다).
현재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중인데 이제는 런던식 교통체증에도 익숙해졌다. 좁은 도로를 마치 전통처럼 고수하다 보니 런던의 교통난은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었는데 런더너들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듯하다. 이 또한 영국식일 터이다. 대신에 도심 녹지가 30퍼센트에 이르고 크고작은 공원이 3천 개가 있다고 하니 런더너의 삶이 팍팍한 것만은 아니다. 고도제한으로 고층빌딩도 없고 네온사인도 없는 거리는 런던을 항상 런던이게끔 한다. 세월의 마모를 버텨내는 런던!
어제 일정은 버지니아 울프(와 댈러웨이 부인)의 산책길을 따라가본 워킹투어와 찰스 디킨스 박물관 방문으로 구성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서 시작하여 세인트제임스파크와 버킹검 궁전 앞을 지나 리젠트파크까지 이어진 워킹투어는 3개의 호수를 거치고 런던 도심을 가로지르는 여정으로 3시간이나 소요되었다(당초 2시간쯤으로 생각한 일정이었다). 폭풍의 언덕 트래킹과 함께 이번 문학기행의 하이라이트. 중도에 <댈러웨이 부인>에도 나오는 전통 있는 서점 해처드(1797년에 문을 열었다)에도 들러 영국식 서점도 구경할 수 있었다(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점답게 품위 있는 책진열과 배치를 보여주었다).
수제 햄버거집 바이런에서 점심을 먹고 디킨스 박물관을 찾았는데 런던의 작가 디킨스에게 바쳐진 런던 유일의 문학관이다. 내막을 알아보니 그가 살았던 다른 집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1837-39년까지 3년 못 되게 살았는데 당시 신혼의 디킨스는 세 자녀와 처제 등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가 사랑했던 처제 메리 호가스가 숨을 거둔 것이 1837년이었고 화제작 <올리버 트위스트>를 발표한 것도 이 시기다. 1839년말에 디킨스 가족은 식구가 늘어난 데다가 수입도 늘어서 리젠트파크 쪽의 더 큰집으로 이사한다. 박물관은 4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층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실제 살았던 집을 박물관으로 꾸몄기 때문일 텐데 디킨스의 명성에 비하면 소박하다는 인상까지 주었다. 1870년에 사망한 디킨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다.
디킨스 박물관에서 나온 일행은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트라팔가 광장 옆에 있는 오스카 와일드의 조각상을 찾았다(1998년에 세워졌다). 더블린에서 시작한 여정이 그렇게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