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 합본호(1344호)에 실린 리뷰를 옮겨놓는다. 릴케의 <말테의 수기>에 대해서 적었다. 애초에는 돌아온 탕아에 대한 릴케의 새로운 해석에 대해 적으려고 했던 것인데, 분량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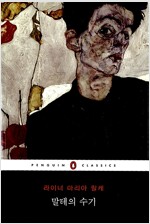

주간경향(19. 09. 23) 말테는 왜, 무엇을 바로 보고자 했나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시가 ‘가을날’이다. 자연스레 ‘가을날’의 시인 릴케도 떠올리게 된다. 그가 남긴 유일한 장편소설 <말테의 수기>(1910)를 가을맞이로 다시 읽었다. 원제는 ‘말테 라우리츠 브리게의 수기’. 제목대로 시인의 분신격 인물인 말테 브리게의 성찰과 단상들을 모은 기록이다.
이 소설 혹은 수기가 내게 가장 와닿았던 때는 스물여덟 살 무렵이었는데 작품에서 말테의 나이다. “우스운 일이다. 나는 여기 작은 방에 앉아 있다. 나 브리게는 스물여덟 살이 되었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 나는 여기 앉아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테가 앉아 있는 곳은 파리 한구석의 싸구려 호텔 6층 방이고, 릴케의 파리 체류 시기를 고려하면 때는 1902년 9월이다.
보통의 소설에서라면 파리 같은 대도시에 상경한 시골뜨기 주인공이 성공과 출세를 도모하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터인데, 말테는 그와 달리 방구석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고작 도서관을 드나들 뿐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는 대단한 무엇이 될 생각이 없다. 대신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이 이제껏 어떤 실제적인 것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고, 인식도 못했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가능할까?” 따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럴 수 있다.”
무슨 뜻인가?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잘 보고, 생각하고 기록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냥 흘려보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버터빵과 사과 한 개를 먹는 학교 휴식시간처럼.” 이런 문제의식하에 말테는 이제야말로 제대로 보고 생각하고 기록하고자 한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보기다. 말테는 여러 차례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무엇을 보는가. 가장 먼저 관찰하는 것은 파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559개의 병상이 있는 큰 병원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가기에 마치 죽음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 이러한 죽음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기만의 죽음’을 죽겠다는 소망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말테는 시종관이었던 자기 할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는데, 두 달간 지속된 죽음의 과정을 멀리 떨어진 농가에서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죽음이었다. 릴케 시의 주요 주제이기도 한데, 말테는 사람들이 마치 과일이 씨를 품듯이 저마다 자신의 죽음을 품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여자들은 자궁 속에, 그리고 남자들은 가슴속에. 그 죽음은 삶과 함께 과일처럼 익어간다. “그런 죽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독특한 품위와 조용한 자긍심을 부여받고 있었던 것이다.”
릴케는, 그리고 말테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오는 것 같은 파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않고 창작에만 집중하며 평생 배회하는 삶을 살았다. <두이노의 비가>나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같은 대표작을 완성하고서 몇 년을 더 살았을 뿐인데, 그럼에도 그 유명한 묘비명을 미리 써놓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겹겹이 싸인 눈꺼풀들 속/ 익명의 잠이고 싶어라.” <말테의 수기>는 그러한 시적 여정의 이정표로 읽을 수 있다.
19. 09. 13.



P.S. 릴케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김재혁 교수의 저서와 역서를 몇 권 참고할 수 있다. 리뷰에서 릴케가 평생 배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적었는데, 그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릴케의 시적 방랑과 유럽여행>(고려대출판문화원)이 요긴한 참고가 된다. 볼프강 레프만의 평전 <릴케>(책세상)가 절판된 것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