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새로운 비평용어사전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나서 사라 밀즈의 <담론>(인간사랑, 2001)을 원저(1997)와 함께 도서관에서 대출해 절반 정도를 읽었다. '담론'은 물론 'discourse'의 역어인데 푸코가 처음 소개될 즈음만 해도 '언술' '언설' '술화' 등의 경쟁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략 '담론'으로(언어학에서는 '담화'로) 통일되어 가는 듯하다(알라딘에서 '담론'을 검색하면 현재 286건의 상품이 뜰 정도로 상용화돼 있다).






그러한 용어의 정착에 기여한 책으론 밀즈의 책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다이안 맥도넬의 <담론이란 무엇인가>(한울, 1992/2002)와 푸코의 <담론의 질서>(새길, 1993; 서강대출판부, 1998)를 꼽을 수 있겠다. 토도로프의 <담론의 장르>(예림기획, 2004)도 번역돼 있고, 국내서 가운데서는 학술서로 분류될 이정우의 푸코 연구서 <담론의 공간>(민음사, 1994; 산해, 2000)이나 고명섭 기자의 서평집 <담론의 발견>(한길사, 2006)은 '담론'이란 용어를 표나게 내세운 경우이다(한국학 관련서들을 제외할 경우 그렇다).

사라 밀즈의 책은 그러한 단상을 잠시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그다지 재미있거나 유익한 책은 아니었다(이미 '담론'을 다루는 다른 책들을 읽은 탓인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재미있는 내용은 내가 아직 읽지 않은 나머지 절반(4,5,6장)에 집중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5장의 제목이기도 한 'Colonial and post-colonial discourse theory'를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담론 이론'이라고 생경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자의 독특한 취향을 고려하연서 읽어야 할 터인데 그럴 만한 여유가 내겐 없다. 게다가 간간이 눈에 띄는 오역과 고유명사의 독특한 표기 등이 이 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든다.
가령 러시아의 이론가 미하일 바흐친은 내내 '미하일 박틴'이라고 옮기고 있다(아예 'Mikhail Bakhtin'을 'Mikhail Baktin'이라고 병기하면서!). 번역서가 나온 2001년이면 바흐친의 책들이 그래도 적잖게 소개된 형편이었는데도 말이다(역자가 국내의 이론 담론에 둔감했다는 것밖에 안된다). 그리고 저자가 푸코의 담론이론을 더 정교하게 이론화한 사례로 들고 있는 '미셸 페쇠(Michel Pecheux)'의 경우도 역자는 '미셸 뻬슈'라고 옮겼다. 물론 취향에 따라 그렇게 옮길 수도 있다. 단, 국내의 문헌들에 소개된 '페쇠'를 역자가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다(적어도 맥도넬의 <담론이란 무엇인가> 정도는 참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페쇠의 공로는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자 미셸 페쇠의 작업은 보통 미셸 푸코의 작업과 함께 읽는 것이 유리하다. 담론에 관한 그의 작업(페쇠, 1982)은 그가 단어들의 의미와 단어들이 더 큰 규모의 구조와 갖는 관계의 의미를 단어와 문장을 스스로 의미를 갖는다고 상정하지 않고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페쇠의 작업은 그가 미셸 푸코 이상으로 담론의 충돌적인 성격, 즉 담론이 항상 다른 입장들과 대화 또는 갈등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담론 구조의 본질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다."(29-30쪽)
그러니까 페쇠는 단어나 문장 들이 갖는 자체적 의미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바로 그보다 큰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했으며, 한편으로 그러한 시도의 이론적 원천을 푸코라는 것. 하지만 "담론이란 용어는 푸코의 작업에서는 잘 정비된 이론적 관념 체계에 뿌리를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푸코 자신의 표현을 빌면, "나의 모든 책들은... 도구로서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한다."(34쪽) 이런 식의 연결이 뭔가 어색한 것은 인용문에 오역이 포함돼 있어서이다. 마지막 문장의 원문은 "All my books ... are little tool boxes...."이다('나의 모든 책은... 작은 도구상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옮겨놓으면 번역서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참고로, 저자가 참조하고 있는 페쇠(1982)는 <언어, 의미론, 이데올로기>(1975)의 영역판이다(두껍지 않은 책이다). 어쨌든 담론과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 페쇠가 기여한 거로 보면 되겠다. 그러한 구도는 푸코와 알튀세르의 작업을 접합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
밀즈의 <담론>를 읽으며 그래도 얻은 소득은 이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일종의 긴장관계에 놓인다는 사실이다('담론과 이데올로기'는 2장의 제목이기도 하다). "모든 문화이론가와 비평이론가들은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에 토대를 둔 작업과 담론에 의거한 작업 중 어느 쪽을 원천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극심한 이론적 어려움을 겪었다."(51쪽) 즉, 담론과 이데올로기 중에서 어느 것이 '베이스'이고 또 '베이스캠프'이어야 하는가, 가 논란의 쟁점이라는 것.
"작업의 토대를 이데올로기에 두는 이론가와 담론 이론에 두는 이론가 사이의 극명한 대조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정치적 올바름/성차별주의에 대한 논쟁일 것이다.(...) 이데올로기 비평가와 담론이론가 모두 어떤 언술이 성차별적인지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견해에서는 성차별주의는 허의의식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알튀세르의 용어로 표현해서 주체가 질의받는, 즉 스스로를 특정 유형의 성적 주체로 인식하기를 요구받는 방식으로 보여진다.(...) 담론이론의 관점에서는 성차별주의가 주체집단에 부과된 일단의 믿음의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된다."(7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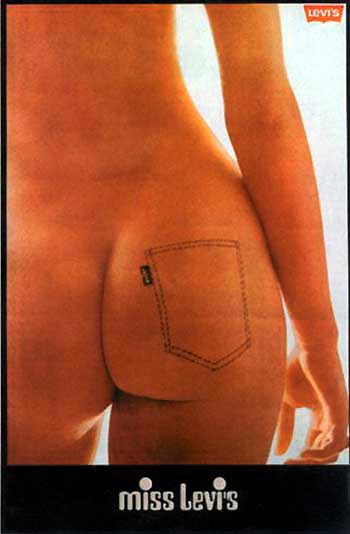
인용문에서 '언술'은 'statement'의 역어이다('언표'라고 자주 옮겨지는). 이데올로기 이론가나 담론이론가 모두 어떤 언술/언표가 성차별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것을 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는 것. 알튀세르의 용어로 표현해서 '주체가 질의받는' 방식이라고 보는 게 이데올로기 이론가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질의받는'는 알튀세르의 술어 '호명받는(interpellated)'을 잘못 옮긴 것이다(인문이론서의 역자가 소위 알튀세르의 '호명이론'에도 무지하다는 것은 좀 놀랍다).






요컨대,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성차별주의적 표현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지표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에 담론이론의 입장은 성차별주의가 단순히 '부과'되는 것이라 투쟁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성차별주의는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억압적 전략이지만 담론이론에서는 성차별주의는 논쟁의 자리이다. 성차별주의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권력적인 위치를 얻어내기 위한 다수의 남성의 시도가 정당화되는 전장이다. 성차별주의는 또한 여성들이 항변하고 이러란 저항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이다."(73-4쪽).
내가 읽은 한도 내에서 핵심적인 대목이기에 원문을 옮겨적자면: "Thus, whilst within an ideological view sexism is an oppressive strategy employed by men to bolster their own power, within a discourse theory model, sexism is the site of contestation; it is both the arena where some males are sactioned in their attempts to negotiate a powerful position for themselves in relation to women, but it is also the site where the women can contest or collaborate with those moves."(45쪽)
원문의 'those moves'를 국역본은 '이러한 저항운동'이라고 옮겼는데 내가 보기엔 근거가 없다(일단 'those'는 '이러한'이 아니다). 'those moves'란 복수형이 받을 수 있는 건 앞에 나오는 'their attempts'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여성들은 논쟁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는 게 원문의 내용이다. 해서 다시 옮기면,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성차별주의가 남성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 이용하는 억압적 전략이라면, 담론이론의 모델에서 성차별주의는 논쟁의 장소이다. 즉, 성차별주의는 남성들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권력적인 위치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인가받는 격투장이면서, 동시에 여성들이 그러한 시도와 논쟁하거나 반대로 그와 협력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담론 이론의 편에 서고 있는 사라 밀즈의 정리는 사실 푸코의 견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며 인용문 자체가 <성의 역사1>에서의 인용을 부연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담론-권력론을 푸코 스스로가 요약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서 유의미한데 이런 내용이다.
"담론이 침묵보다도 더 권력에 봉사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담론이 권력의 수단도 되고 효과도 되는 동시에 권력의 장애물, 권력이 비틀거리며 부딪히는 벽, 저항의 지점, 반대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담론은 권력을 생산하고 전달하며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소멸시키고 폭로하며 허약하게 만들고 권력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73쪽)
대략적인 요지는 맞지만 첫문장은 오역이다. "담론이 침묵보다도 더 권력에 봉사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성의 역사> 영역본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문은 "Discourse are not once and for all subservient to power or raise up against it, any more than silences are."(44쪽, 영역본 110쪽) 고등학교식 영문법을 되새겨보자면, A whale is not a fish any more than a horse is.(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와 같은 구문이다. 즉, "담론은 침묵과 마찬가지로, 권력에 전적으로 복종하지도 전적으로 저항하지도 않는다." 침묵은 복종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항의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담론 또한 그렇다는 얘기이다.

이 책에서 내가 챙긴 건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그 정도의 상식이고 그런 상식의 확인이다. 그러니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비하면 당혹스러운 대목들은 보다 자주 눈에 띈다. 그걸 늘어놓는 것도 소모적이므로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99쪽 이하에서 푸코의 <담론의 질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인 일인지 역자는 푸코의 논문/강연 제목인 'The order of discourse'를 모두 '사물의 질서'라고 옮겼다.
우리말로는 단행본 <담론의 질서>라고 번역돼 나왔지만(영역본 <지식의 고고학>에 부록으로도 붙어 있다) 콜레주 드 프랑스의 취임강연문이기도 한 이 글의 영어본은 로버트 영이 편집한 <텍스트 풀기(Untying the text)>(1981)에 실려 있다. 이 텍스트를 황당하게 역자는 내내 '사물의 질서'라고 옮기고, 112쪽에 가서야 원래대로 '담론의 질서'라고 번역해준다(역자가 둘인가?). 이해 못할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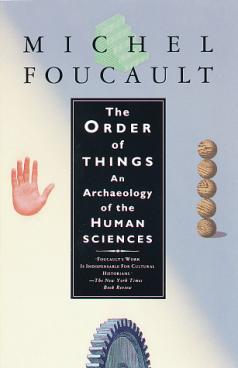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한다면, 역자가 <말과 사물>의 영역본 제목인 <사물의 질서(The Order of Things)>와 <담론의 질서>를 혼동한 게 아닌가 싶다(여담으로 덧붙이자면 영역본 제목인 <사물의 질서> 또한 <말과 사물>로 옮겨줘야 한다. 자신의 무지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면. 절판중인지라 우리가 현재로선 푸코의 <말과 사물>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흥미로운 건 이러한 혼동/착오가 역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 사라 밀즈의 원서 참고문헌에도 푸코의 <말과 사물> 영역본(1970)이 <담론의 질서: 인문과학의 고고학('The Order of Discourse: An Archaeology of Human Sciences)'이라고 오기돼 있다(164쪽). 루틀리지의 편집/교정자들도 눈이 밝은 편은 아닌 모양이다.
책은 어제 그냥 반납하려다가 읽은 시간이 아까워서, 그리고 또 'discourse'를 '논술'이라고 내내 번역한 또다른 번역서가 생각나기도 해서 간단히 정리도 해둘 겸 몇 자 적어보았다. '논술 읽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07.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