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1278호)에 실은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헨리 소로의 <월든>이 갖는 현재적 의의에 대해 적었다. 다수의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읽은 건 지난해 소로 탄생 200주년 기념판으로 나온 열림원판 <월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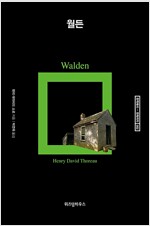
주간경향(18. 05. 28) 시대를 앞서 결행한 독자적인 삶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은 생태주의의 고전이다. 고전을 두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별해 보려는 것은 무의미하다. 고전 리뷰가 할 수 있는 건 다르게 읽어보는 것 정도다. <월든>은 그간 다수의 번역본이 나왔지만 지난해 여름 소로 탄생 200주년 기념 번역판이 새로 나와서 독서의 계기로도 맞춤하다.
‘숲속의 생활’을 기록한 <월든>이 고전으로 자리매김되고 소로가 생태주의의 수호성인으로 존경받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1854년에 출간된 <월든>은 고작 2000부가량 판매되고 절판되었기에 소로 생전에 이 책을 읽은 독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는 소로와 <월든>이 등장하는 것은 한 세기도 훨씬 더 지나서다. 허먼 멜빌과 마찬가지로 소로 또한 시대를 너무 앞질러 산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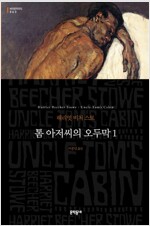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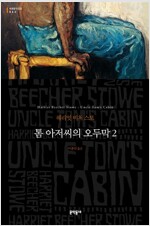
소로의 선구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노예해방론이다. 1840~50년대 미국은 흑인노예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불붙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1852년 출간된 스토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노예제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대립은 더 격화되고 결국 남북전쟁으로 치닫는다. 전쟁이 끝난 1865년에서야 노예제는 공식 폐지된다. 하지만 소로는 노예제 폐지보다도 앞서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지금 남부와 북부에는 인간을 노예로 삼으려고 눈을 번뜩이는 악랄한 주인들이 많다. 남부의 노예감독 밑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북부의 노예감독 밑에서 일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의 노예주인이 되는 것이다.”
백인 노예주로부터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로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는 일이었다. 이 노예상태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자기착취의 상태다. 각자가 자기를 노예로 구속하고 착취하는 것이다. 때문에 노예해방에 견주자면 자기해방이 요청된다. 이 해방은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은 자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자기에게 이르는 결단과 모색을 필요로 한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간 숲속의 생활을 감행한 배경이다.
소로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하나의 실험”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선배들이 분명 적지 않지만 그들의 경험이 내게 말해주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 가령 소로는 우리가 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고 더 적게 갖고도 만족하는 법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지 의문을 갖는다. 경제생활을 다룬 장에서 소로는 여러 지출명세서를 동원하여 얼마나 적은 지출로도 생활이 꾸려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심지어 그는 가축을 이용한 농사에도 반대하는데, 그 경우 사람이 가축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소로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각자는 독자적인 개성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로가 한 일은 개인을 새로운 수준으로 재발명한 것이다. 시대를 앞질러서 결행한 그 일은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월든>이 계속 읽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18.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