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7월 이라구?!
난 겨울 이불을 이번주 내내 빨아 말리고 장롱에 넣고 그랬는데? 지난주말에야 에어컨 설치한 건 안자랑. 더워도 선풍기 돌리면서 창문 다 열어놓고 '먼지가 많으네' 라면서 걸레질을 했는데. 아, 맞다, 수박이랑 자두도 많이 먹었지. 여름이 맞구나. 나만 몰랐네.
큰 아들 녀석이 방학인듯 아닌듯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재수강! 반성해라! 돈쓰는 넘!) 지내고 막내는 매일 얼음물 두 통씩 가방에 넣어다니는데, 땀에 절은 야구모자는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모르는 나는 아, 맞다 여름이구나 싶다. 김애란 작가님 땡큐, 밖은 여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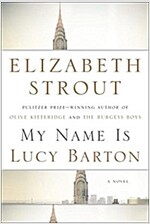
어제밤 마지막 챕터를 다 읽은 Elizabeth Strout 의 책은 아프고 무겁다. 이야기가 다 끝났지만 내 마음에는 끝나지 않고 묵직한 느낌이 (아, 이건 Abel의 마지막 챕터와 겹치는지도) 계속 된다. 좋은 이야기는 이렇다. 책을 덮고도 (이북을 끄고도. 난 이북으로 읽었는데 알라딘엔 이북 데이타가 읍씀) 계속 남는 등장인물들의 걱정, 사연, 그리고 마음들. 리뷰평은 Olive Kitteridge 보다 박하지만 더 아픈 사연들과 약간 억지스러운 인물 관계들 탓인듯 하다. 이제 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묻지말아요) 지나온 세월, 어린 시절의 아프고 억울한 기억들을 자꾸 꺼내 옆에 두고 겹쳐보게 된다. 이 책의 많은 등장인물들은 전작 My Name is Lucy Barton의 주인공 Lucy의 주변 인물들이다. 그녀의 어린시절 동네 사람들. 그녀를 측은하게 혹은 더럽게, 아니면 부러워하며 쳐다본 사람들. 각각이 아픈 사연들, 때론 범죄를 끼고 살아가는데 (어디나 있지요, 몰카!)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고 벌이는 기싸움 혹은 공감의 장면이 인상 깊다. 작가 Strout 가 계속 글을 써주길 바란다. 작가는 상처를 그냥 덮지 않고 꺼내고 헤비고 바람을 쐬게 한다. 억지로 약을 바르진 않으니 계속 아플테지. 천천히 마르고 아물면서. 딱지 아래엔 흉터가 징그럽게 생기고. 이 짜릿하고 묵직한 마음으로 7월을 시작하니 나쁘지 않아. 흐리지만 계속 빨래를 하고 널겠어. Strout 작가 이름 덕분에 Stout 맥주가 생각나고 그르네. 아침부터.
상반기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Strout 리뷰인듯 아닌듯 막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