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기운이 살짝.
뭔가 되려고 읽은 것은 아니었는데, 읽으니 자꾸 뭐라도 되고 싶은 욕심이 난다. 채 얼마 읽지도 않았으면서 염치도 없이. 책상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한없이 앉아있을 텐데. 아무래도 살아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가볍다. 글로 옮기면 활자들이 날아올라 옅게 증발할 것 같은 말들, 경험들, 기억들. 소소해서 보잘 것 없거나, 혹은 소소한 것들 사이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캐어낼 눈과 손이 없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syo야, 이놈 자식아, 니가 지금 읽는다고 읽지만, 봐, 사람 앞에 앉혀두고 십 분을 이야기 나눠도 듣는 게 있고 말하는 게 있는데, 책 한 권과 두 시간을 씨름하면서 읽기만 할 뿐 쓰는 게 하나도 없다면, 뭔가 이상하잖아?
결국 읽는 일도 지금 똑바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
171001 ~ 171010 27권
문학 10권










1. 히로시마 내 사랑
: 고통은 사랑이 되고 사랑은 망각이 되고 망각은 이름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마침내 고통의 이름으로 부른다. 그 밤 이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건, 결국 모든 일의 행로는 한 군데다. 히로시마와 느베르는 그들 바깥의 그 무엇도 상징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이 향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연쇄충돌 가운데 한 지점일 뿐이다.
2. 법 앞에서
: 마음의 밑바닥을 박박 긁는 글쓰기. 카프카의 글에 공명하려면, 내 마음에도 바닥과 맞닿은 데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카프카를 읽다가, 와, 내 이야기 같아,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날 저녁은 혼자서 보내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3. 그늘의 발달
: 이게 다 박재삼 때문이다. 내가 시를 좋아하게 된 것도, 시가 좋아 많이 읽으면서도 내 또래 젊은 시인들의 시를 슥슥 받아들이는 뇌구조가 되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고민 없이 문태준을 꼽는 것도. 모든 게 다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때문이야.
4.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 사랑받는 시집은 사랑받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들을 다 알아 내 그러모아도 사랑받는 시집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랑받는 시집은 사랑받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5. 밤이 선생이다
: 오래 읽은 사람이 쓰는 글, 오래 쓴 사람이 읽는 세상. 오래 오래 읽고 쓰시기를.
6. 녹턴
: 며칠 전 쓰기를,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한 챕터씩 읽겠다는 전략의 문제였는지 뭔지, 너어어어어무 재미없어서 잠만 잘 잤다." 했는데, 통렬하게 반성한다. 재밌다. 웃긴다. 웃길 줄 아는 사람이다. 침대에 누워 자기 전에 읽은 책에 대해 다시는 지껄이지 말자. 그건 읽은 거 아니다.....
7. 창백한 언덕 풍경
: 우울하고, 괴기스럽고, 떠도는 이야기들. 안개처럼 흐릿하고 퍼져 있어 실체를 드문드문 비추는 서술들.
8.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
: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쓴 글들이라 그런가, 뭐 쏘쏘임. 그나마 최근 것들 읽으면서 이 사람 에세이는 솔직히 나랑 잘 안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거였어.
9. 밸런타인데이의 무말랭이
: 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시기에 쓴 이 글들은 또 낄낄 웃으며 재밌게 읽었다. 무라카미의 에세이는 정말 알 수가 없다. 허허.
10.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 이 책 읽혀주고 싶은 사람 많다. 대구 경북에는 더 많다. 읽고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헤쳐온 삶에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보일 수 있는지를.
힘내라, 마르크스!! 9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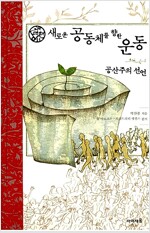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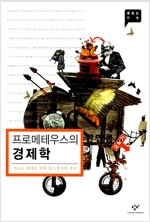

11. 마르크스 평전
: 그야말로 "평전"다운 구성이다. 벌린이 마르크스의 사상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아탈리는 그의 외모, 말투, 버릇, 인간성부터 철학과 투쟁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고루 묘사한다. 재미는 이쪽이 좀 더 있다. 아무래도 사람 냄새가 더 난다.
12. 칼 마르크스 전기 2
: <다시 쓰는 맑스주의 사상사>라는 책에서 이 책을 제외한 그 어떤 마르크스 평전도 논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소개해놔서 기어이 사서들로 하여금 도서관의 보존서고를 뒤져내게 시켜 찾아낸 책이다. 1권은 소실.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소련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가 1973년 출판한 작품인데, 칭찬받을 만하다. 정말 건조한, 미사여구가 거의 없는 건조한 서술에 두 권 합치면 1000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양. 그런데 그 건조한 서술이 독자를 혼란시키는 일 없이 돌직구로 쏙쏙 꽂아준다. 물론 100퍼센트 객관적인 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소련에서 나온 책들이 열심히 까인다는 말도 있다. 내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기라 우긴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장 "정통적"이고 "완벽한" 전기라는 말은 인정. 아, 갖고 싶다, 이 책.
13.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 왜 이 책을 개론서 가운데 최고라 부르는지 책이 스스로 여실히 증명했다. 이 책 한 권 들면, 필요 없어지는 자잘한 책들의 목록이 길다.
14.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 입문서는 단연 앨피, 아직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는 탄탄한 시리즈.
15. 자본과 노동
: 마르크스가 직접 손을 댄 <자본>의 입문서. 희한하긴 한데,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분위기.
16.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운동 공산주의 선언
: 정말 하나도, 하나도 틀린 말, 혹은 틀려진 말이 없는 200년 전의 말. 이런 글을 뚝딱뚝딱 쓰는 남자. 멋진 남자 마르크스.
17. 마르크스 21세기에 끌려오다
: 마르크스의 이름은 절반 정도는 훼이크고, 제국, 문화, 종교, 타자, 세계화, 젠더 등 21세기를 진동하는 굵은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쇄신되어야 하는지를 폭넓게 따져보는 좋은 책.
18. 프로메테우스의 경제학
: 철학적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푸는 책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사실 오히려 비전공자 입장에서 마르크스는 의외로 어렵지 않은 철학자다. 그러나 본격 경제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어떨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 어렵고 복잡한 세계가 기다릴 걸? 근데, 한 번 열어보고 싶지 않니? 위협하면서도 유혹하는 희한한(어쩌면 유혹이 다 그런건지도) 책 되겠다.
19. 세계를 뒤흔든 공산당 선언
: 선언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선언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다수의 혁명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일품이다. 게다가 고병권 선생님의 해제는 그야말로 용 눈알에 점을 찍는다.
그 외 8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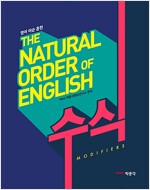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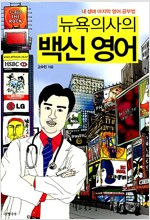
20. 일요일의 인문학
: 의외로(?) 속눈썹이 긴 장석주 선생님. 이 책이 유독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제 장석주를 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싶다. 그의 글들이 마음을 흔들기보다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존재 자체로 여전히 가치 있는 작가라는 사실은 틀림없지만, 내 독서는 내 개인의 문제니까.
21. 물욕 없는 세계
: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의 목에 칼을 가장 깊숙이 대고 있는 전사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들이 자본주의 소비와 소유 자체에서 일제히 이탈하여 자본을 굶기는 일이라는 것인데, 흥미롭다. 자본이 그렇게 쉽사리 죽어주진 않겠지만. 병행 전략으로 의미가 있겠다.
22. 강영계 교수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야기
: 크다, 넓다, 든 것이 많다, 낡았다.
23. 자크 라캉의 세미나 읽기
: 아니야, 아직 아니었어.....
24. 푸코 & 하버마스
: 백만 년만에 슬쩍 다시 간 보고 있는 푸코. 진정한 빨갱이가 되려면 알아야 할 게 많다.
25. 시몬 드 보부아르 익숙한 타자
: 지금 보부아르는 번역된 책도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입문서조차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좀 더 알고 싶다 싶을 때쯤 휙 넘어가는 아쉬운 책이지만, 아쉬우나마 시작하기에는 이보다 더 마땅한 책이 없다.
26. 영어어순훈련 수식
27. 뉴욕 의사의 백신영어
연휴 전에 읽겠다고 쌓아 놓은 책탑은, 사실 망했다. 연휴라서 더 많이 읽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syo는 친구가 꽤 많은 놈이었고, 연휴가 길다 보니 친구들도 이런 저런 생각 끝에 syo를 떠올린 모양이고, 줄창 술을 마시다 보니 몇 번을 토했는지 모를 지경이다..... 가로수야, 미안하다. 그런 봉변은 처음이지?
계절이 바뀌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지하게 한 번 또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140년 쯤 더 살 계획이니까, 휴, 생각할 게 산더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