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자를 위하여 ㅣ 민음의 시 77
문정희 지음 / 민음사 / 1996년 2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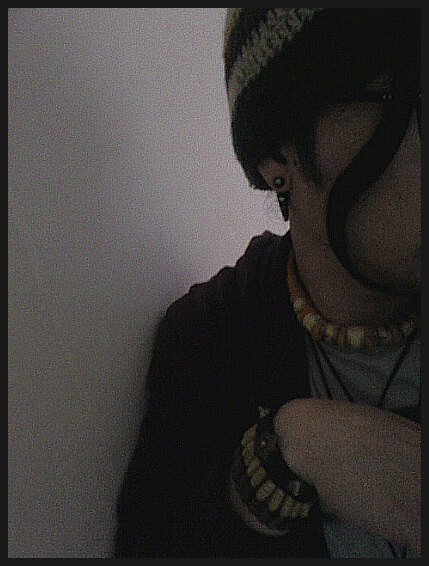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강원도에 홀딱 빠졌다. 이름 때문에 나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신기하게도 강원도의 지명은 모두 시적인 느낌을 간직했다. 나는 물치항이라는 그 말이 주는 느낌이 좋아서 물치항에 갔고, 양양이라는 그 순한 어감'이 좋아서 양양을 찾았다. 아야진도 마찬가지였다. 이름이 예뻐서 버스터미널에서 우발적으로 고른 행선지였다. 속초에 터를 얻을까 하고 찾아간 곳은 터앝에 잡초 무성한 빈집'이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시한부 선고 받고 요양차 이곳에 머문 30대 서울 남자였다고 한다. 오기였을까 ? 시한부라는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을까 ? 그는 2년 치 월세를 일시불로 미리 셈을 치른 후 혼자서 터앝을 가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머문 기간은 4개월이 전부였다고. 쓸쓸히 죽어갔다고. 그러니깐 그 빈집은 여전히 죽은 자가 세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집을 소개한 노인이 말했다." 사람 손때 묻은 흙'은 용케 알아. 주인 없으면 제멋대로 자라지. 사랑 받지 못한 아이들처럼 ...... " 노인의 말에 문득 코멕 매카시가 쓴 < 모두 다 예쁜 말들 > 에 나오는 문장이 떠올랐다. 흉터에는 신기한 힘이 있다고, 과거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그 빈집은 그 사내의 흉터였다. 사랑 받지 못하고 웃자란, 잡초 무성한 터앝도 그가 남긴 흉터'였다. 쪽창에서 바라본 터앝은 자꾸 그가 살아온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접힌 부분 펼치기 : 속초에서 1년
속초에서 1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속초에서 1년 넘게 혼자 살았다. 그때 나는 담 낮고 마당 넓은, 마을 아래로 넓은 동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을 얻어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었다. 그리고 마당 안에도터앝을가꿔서 된장찌개'에 넣을 파를 뽑고, 고추를 따서 요리를 하고 싶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사치였다. 검은 색 리브라도리트리버 종 개 한 마리와 함께 말이다. 그러면 혼자 살아도 그리 쓸쓸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 아, 고양이도 한 마리 기르고 싶었다!요즘 고양이를 보면 예뻐서 죽을 것 같다. ) 그런 마당이 있다면 한여름 진탕 취해서 마당에 놓인 평상에 누워 모기들에게 많은 피를 뜯겨도 기분 좋을 것 같았다.
처음 집을 보러 다닌 곳은 원조 아바이 순대 마을로 유명한 청호동’이었다. 실향민들이 하나 둘 모여서 살던 마을이었다. 마을 집들이 모두 단층으로 이루어져서 묘하게 기묘한 풍경을 선사했다. 납작한 성냥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랬을까 ?청호동은 마치 바다보다 낮은 마을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파랑이 높은 날에는 바다가 마을을 삼킬 것만 같았다.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열 군데도 넘게 집을 보았으나 인연이 아니었는지 집을 얻지는 못했다. 마당 넓고 담 낮은 집들은 하나같이 텃밭이 없었고, 넓은 텃밭이 있는 집은 공교롭게도 마당이 없었다. 인연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래도 나는 틈만 나면 45,000원 주고 산 낡은 자전거를 타고 청호동을 어슬렁거리기를 좋아했다. 조용한 동네였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거나, 정신이 불안해서 유령이 찾아오는 날이면 자전거를 타고 청호동을 찾고는 했다. 상희네 슈퍼 앞 전봇대는 유난히 불이 밝았는데, 나는 새벽 문 닫은 슈퍼 앞 평상에 앉아서 전봇대 불빛에 의지해서 책을 읽고는 했다. 그때 읽은 책이 잭케루악의길위에서’였다.
그 후로도 집을 구하느라 몇 개월이 흘렀다. 그러던 중 벼룩시장에 나온 광고에 싸게 나온 집을 하나 발견했다. 전화를 하니 집 주인은 방 두 개에 텃밭을 가꿀 수 있다고 했다. 이내 혼자라고 묻는다. 혼자라고 했더니 대뜸 “ 혼자서 이 텃밭 가꾸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한다. 나는 < 치킨 런> 을 타고 힘차게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아, “치킨런”이란 내 자전거 이름이다. 속초에 도착한 다음 날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전거를 사는 일이었다. 치킨런은미색이 출중하여 몇 번이나 아이들에게 납치를 당하기도 했으나, 속초가 워낙 바닥이 좁아서 길 가다가 우연히 두 번이나 내게 발견되어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자전거는차마 소리 내어 울 수가 없어서 속으로만 울고 있었다. 더러운 사내들의 엉덩이가 자신의 순결한 안장에 올라탔다고. 나는 자전거를 위로하며 한 마디 했다. 말 안 해도 잘 안다. 너의 몸 위에 누군가는 올라탔지만, 그렇다고 너의 순결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란다. 울지 마, 치킨런 !
주인 말대로 그 집 텃밭은 넓었다.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텃밭은 형체를 잃고 무성한 덤불이 되어 있었다. 봄날 바람에 실린 씨앗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는 고집 센 늙은 광부의 수염처럼 제멋대로 뻣뻣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에 들었다. 방세도 저렴했다. 방은 무척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넉넉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이상했다. 10개월은 보증금 없이 월 10만 원이었고, 그 이후로는 전세 전환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월세면 월세고, 전세면 전세이지 처음 10개월 간은 보증금 없는 월 10만 원이고, 10개월이 지나면 전세로 전환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 서울 토박이 특유의 의심병이들어서 계속물어봤더니 주인 할머니는 마지못해 말했다.
2년 선월세를 지불하고 이곳에 와서 살던 세입자가 있었다오. 서울에 가족들을 남겨둔 채 혼자 이곳에 정착했다고. 시한부 선고 받고 서울에서 내려온 30대 후반의 남자였다고. 텃밭 가꿔 채소 기르고, 맑은 공기 마시면 몸이 나아지리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보증금 없이 2년치 월세를 미리 지불하고 이곳에 정착해서 텃밭을 가꿀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만 가을에 가고 겨울 끝 무렵, 이른 봄에 죽었다고 한다. 그의 마지막 죽음은 그렇게 쓸쓸했다고. 주인 입장에서야 선월세를 미리 받았으니 상관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걸려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방을 놓아서 그 돈을 돌려주기로 세입자 유가족과 약속을 했다고 한다.
나는 고민고민하다가 그냥 돌아섰다. 그 사내는 왜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달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무모하게 2년치 선월세를 지불했을까 ? 오기였을까 ?삶이 억울해서 오기를 부린 것일까 ? 지금쯤 누군가는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갈 것이다. 서울에서 온 사내가 가꾸려고 했으나 이른 봄날에 몸이 썩어서 가꾸지 못한 그 텃밭을,새로 온 세입자가 가꾸고 있을 것이다.
펼친 부분 접기 ▲
반면 통리는 김혜순 시인의 < 트레인스포팅 > 을 읽다가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이 마늘처럼 아려서 통리를 찾아갔다. 시인 가운데 강원도에서 난 사람이 많은 까닭은 다 그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한계령도 마찬가지다. 문정희 시인의 < 한계령을 위한 연가 > 를 읽다가 그리워졌다. 오지 땅끝 가장 높은 곳, 한계령. 더 이상 갈 곳 없는 끝. 시인은 한겨울이라는 단어가 주는 시린 촉감에서 한계령을 뽑아낸다. 한겨울과 한계령은 묘하게 닮았다. 그곳에서 폭설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한다. 묶였으면,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
미시령을 넘다가 고속버스에 갇힌 적이 있다. 3월 진눈깨비가 내리는, 안개 주의보가 발령난 날'이었다. 어디선가 교통 사고가 난 모양이었다. 붉은 색 야광봉이 짙은 운무 속에서 반짝 반짝. 버스에서 내려 오줌을 누었다. 출가를 꿈꾼 적 있다. 어릴 때 닮고 싶은 위인이 누구냐는 말에 항상 원효대사'라고 답하고는 했다. 홍길동처럼 요술을 부리잖아요 ! 나는 27년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은 남자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이내 접었다. 애인의 젖가슴이 너무 예뻐서 접기로 했다. 봉봉 오렌지 쥬스 속 알갱이처럼 톡톡 터지는, 한 세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젖가슴을 탐했다.
여름에는 촉촉한 검은 동굴 속에 숨어서 아예 나오질 않았다. 문어처럼 다리만 삐쭉 내밀고는 여자가 흘리는 눈물을 잡아먹었다. 아, 동굴에 갇혔다. 여자와 사랑을 나눌 때마다 나는 늘 내가 광부'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다. 여자는 동굴이고 나는 광부였다. 여자의 몸속은 더웠다. 깊이 들어갈수록 숨이 막히고 땀은 등골을 타고 또르르 내려와 아랫 골에 고였다. 섹스는 끝이 막힌 굴'에서 시커먼 석탄을 캐는 일. 오, 오오 눈부신 고립. 아, 아아. 내가 곡갱이질을 할 때마다 동굴은 아아, 소리를 냈다. 신기한 일이다. 동굴은 어떻게 해서 인간의 언어를 배웠을까 ? 모를 일이다.
■ http://blog.aladin.co.kr/749915104/6249238 : 미시령.
■ http://blog.aladin.co.kr/749915104/6255383 : 사진기를 주웠어.
■ http://blog.aladin.co.kr/749915104/6249245 : 배추.
■ http://blog.aladin.co.kr/749915104/6249224 : 서랍.
■ http://blog.aladin.co.kr/749915104/6249254 : 목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