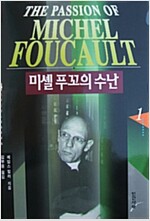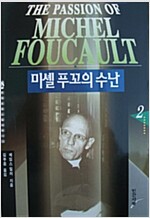넘나 읽고 싶었는 데 절판 되었던 (게다가 중고 거래에는 험악한 가격으로 풀려있던) 폴 벤느의 푸코에 관한 저작이 역자의 ‘개정판 옮긴이 후기’를 첨부해 두터워 진 채로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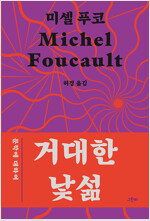


다정한 이웃이 몸소 출간 소식을 알려주셨고 비슷한 날짜에 나온 푸코의 문학관 <거대한 낯섦>(과 그를 읽기 위한 사드…ㅋㅋ)보다는 폴 벤느의 푸코가 더 읽고 싶어서, 진짜 손 부들부들 하면서 샀다(장바구니에서 다른 거 무시하고 딱 이것만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뒤에는 알라딘 본 투리드 무지 노트와 홉스).

운동 다녀와서 래핑 벗기자 마자 이 감격적인 소식을 알리는 바이다! (아.. 내일 마감인데 🥺😩)
목차를 살펴보니 눈이 가는 부분은 약 60페이지(책 360페이지)를 할애해 전개된 개정판의 역자 후기 <푸코를 불태워야 하는가?>다. 진짜 침도 안 삼키고 순식간에 읽어내리다가, 일단 워워~나 자신을 말리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일시정지 시켰다. 한마디로 *2021년에 있었던 기 소르망의 <푸코의 소아성애 폭로 스캔들>에 대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그래서 푸코가 했냐고 안 했냐고?라고 묻고 싶은 분께 읽는 즐거움을 빼앗지 않기 위해 진실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으며.
다만 만약 누군가 -쟝쟝, 너는 푸코가 페도필리아라도 사랑할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한 현시점의 대답을 한다면.
나는 *푸코가 아주 엄밀하고 다면적인 ‘철학자’*(스스로는 지난 세계의 철학을 상대화시키며 아니라고 주장했지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 이다. 요점은 ‘철학자’라는 거다. 내게 있어 ‘철학함’의 수준이 아니라, 철학‘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있다면. 삶을 살다가 마주치는 문제 의식에 대해 사유를 통해 얻어낸 어떤 개념의 획득(언어를 갖고 싶다라고 나는 종종 표현한다)인 것 같다. 아주 거칠게. 그건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하며, 꼭 고급스러운 글씨가 아니라도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상의 철학자다.

어제부터 시작된 푸코 <감시와 처벌> 강독에서 조난주 선생님은 책을 ‘무엇을 정치화 할 것인가?(혹은 일상을 정치화하기)’라는 질문을 안고 읽어보자고 하셨는데. 내가 앞으로 정치화하고 싶은 질문은 취향이다. 즉, 취향은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 : 일상적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모종의 권력 관계”에 대해 숙고해 보는 것. 문득 내가 읽기 좋아하는 종류의 글은 그런 글이란 생각. (일단 여기서 매듭)
푸코의 독특한 성적 취향 역시 그렇다. 장난처럼 푸코는 나를 사랑할리 없는 게이라고 놀리…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가 복잡하게 사유를 전개할 수 있었던 ‘위치성’(지도와 달력이라고 푸코는 표현한다)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 매번 장난쳐서 미안한데… 뭐, *장난할 수 있음*도 엄밀하거나 권위세울 필요가 없는 *내 위치성*이라고 해두자. (이러다 기 소르망 꼴 나겠네ㅋㅋㅋ 하지만 전 유명하지 않습니다. 더 유명해지기 위한 위치성을 획득해야 하는 처지라면 또 모를까.)
여하튼 지금 나는 무진장 바쁜 상태에서 점심 먹을 시간을 쪼개서 책을 훑다 말고 이걸 쓰고 있고, 천천히 곰곰 읽고 싶다는 욕망을 뒤로한 채, 재출간을 기다렸던 책 <푸코, 그의 사유 그의 인격> 소식과, 그것을 바로 구매해 버린 나의 훌륭한 구매력…(-_-;;; 책 살돈 버느라 책 볼 시간 없다는 비극과 함께)을 자랑합니다… 히히
다 쓰고 나니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책 <푸코 그의 사유, 그의 인격> 개정판 역자 후기에서 내가 푸코의 사생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 맞춤한… 몇 가지 문장들을 인용해 오는 걸로. 글 급 마무리.
“(252) 하지만 소르망과 밀러는 푸코의 사유와 저작이 개인적 성향(특히 성적 지향)의 직접적인 표출이자 행동의 합리화 혹은 자기 변호라는 지극히 통속적인 시선에 머무른다. 이는 푸코가 제기하는 철학적 논점들을 사생활의 모래밭 속에 묻어버리고, 그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전기적 환원론의 좁은 쇠 우리 안에 몰아넣는다.”
<미셸 푸꼬의 수난>의 그 밀러 맞다ㅋㅋㅋㅋ 자기의 성적 판타지 푸코한테 투사했다고 디디에 에리봉에게 대차게 까인 것 같지만 정작 앨휘봉씨는 자신의 학자적 판타지를 투사했다고 푸코의 반려인 드 페르는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읽었음. 그리고 내 생각에 이런 모든 인터뷰들에 무덤에서 나온 푸코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장기하 주의) “그건 니(들) 생각이고”
해석될 여지와 비밀도 많은 이 철학자의 일생은 어떤 서사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치명적 매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식의 읽기가 내게 필요하지는 않다. 내 경우 타인들의 규정에 쉽게 휘둘리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푸코를 읽고 있는 중 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민감함과 취약함 그걸 스스로 부수고 싶어 하는 신랄한 부분에 대해 동일시를 하게 된다.
“(266)이러한 불일치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그 기원을 찾으려면 어차피 확인 할 수도 없는 ‘의식의 심층’을 들여다보려 애쓰기 보다는, ‘역사의 표면’을 있는 그대로 짚어가는 편이 훨씬 생산적일 테다. 달리 말해 푸코 개인의 충동, 욕망, 성향을 제멋대로 추정하지 말고, 그의 사유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며 말과 글로 질서 지어졌는 지를 파악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뜻이다.”
- 폴 벤느, <푸코 그의 사유, 그의 인격> / 이상길, <푸코를 불태워야 하는가? -철학자의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의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