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여행기에 관심이 없다고 몇번쯤 말한 것 같다. 그 유명한 『Love & Free』 라는 책은 반값에 사고서도 억울해했다. 으윽, 이게 뭐야, 알라딘 서재의 다른 분들의 글을 읽는 쪽이 훨씬 유익하겠잖아, 라고도 생각했다. 중고샵에 팔기도 민망했다. 나는 그 책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여행기에 관심이 없다고 몇번쯤 말한 것 같다. 그 유명한 『Love & Free』 라는 책은 반값에 사고서도 억울해했다. 으윽, 이게 뭐야, 알라딘 서재의 다른 분들의 글을 읽는 쪽이 훨씬 유익하겠잖아, 라고도 생각했다. 중고샵에 팔기도 민망했다. 나는 그 책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행기는 내가 쉽게 고르지 않는 책이고, 좀처럼 읽으려 들지 않는 분야다. 그러다 나는 이 『인도발자국』을 만난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책이다. 저자는 본인을 스스로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라 칭했지만, 사진들이 좋다. 그런데 그 좋은 사진들에 덧붙여진 작가의 글들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사진위로 덧붙여진 글이라는 자체도 그렇지만, 그 글들의 표현. '꼬드긴다' 를 유혹한다라고 바꾸어 썼으면 어땠을까. '기다 아니다' 대신에 '옳다 옳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나는 내심 안타깝고 아쉬웠다. 이 좋은 사진들에 이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니. 이런건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바꿔줄 수 있지도 않았을까.
내가 아쉬운 이유는 이 책에 실린 사진이 무척, 대단히 좋아서다. 차라리 사진집으로 바꿔서 나왔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녀가 찍어내는 인도의 밤풍경은, 하- 그야말로 환상이다. 내가 좀 옮겨오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찍어봤는데, 아뿔싸, 그녀의 사진들을 좀 망치고 만다.

그녀가 찍어낸 인도의 모든 사진들이 꽤 근사하지만, 그 밤풍경은 정말 환상이다. 저녁과 밤. 나는 인도에 대한 어떤 호감도, 호기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찍어낸 밤 사진들 때문에 갑자기 인도에 가고 싶어지기도 했다. 인도에 가면, 인도의 밤을 맞으면, 이런 풍경들을 내가 정말 볼 수 있는걸까? 이것들이 정말 진짜인걸까? 내가 내 눈으로 이런 풍경들을 볼 수도 있는걸까? 이런 풍경들을 찍어대는데 그녀가 정말 '아마추어'인걸까? 내가 가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나는 사진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녀가 근사한 사진을 찍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가졌고, 그렇기에 그녀의 이 책에 실린 글들이 아쉽고도 아쉬웠다. 사진을 옆으로 둔 채 글들을 따로 썼다면, 아니면 사진만 올리고 글을 생략했다면 더 좋은 책이 되지 않았을까?
무릇 밤이란 밤이란 그 단어 자체로 환상과 낭만을 포함하지 않는가. 밤풍경, 밤거리, 밤정(情), 밤의 농담, 밤의 웃음, 밤의 통화, 밤의 편지, 밤의 만남 그리고 밤의 당신과 나. 밤에 무언가를 함께 하는 사이라면, 특별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테다. 그런 밤의 인도를 그녀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밤이라면, 나는 인도에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오- 그런데 나는 주말에 완벽한 여행기를 만나게 된다. 여행기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제목부터 설레이는 책이다. 게다가 무려 '동유럽 독서여행기'란다.
 굴라쉬 브런치. 대체 이 있어보이는 제목을 어쩌면 좋아. 책을 받자마자 휘리릭 넘겼다. 더할나위없이 설레인다. 아, 이 책을 대체 어쩌면 좋아. 굴라쉬는 뭐지? 러시아어를 하는 친구에게 굴라쉬에 대해 묻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는 검색창에 굴라쉬에 대해 검색해본다. 그러나 예상했던것처럼, 굴라쉬에 대한 설명은 이 책 안에 존재한다.
굴라쉬 브런치. 대체 이 있어보이는 제목을 어쩌면 좋아. 책을 받자마자 휘리릭 넘겼다. 더할나위없이 설레인다. 아, 이 책을 대체 어쩌면 좋아. 굴라쉬는 뭐지? 러시아어를 하는 친구에게 굴라쉬에 대해 묻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는 검색창에 굴라쉬에 대해 검색해본다. 그러나 예상했던것처럼, 굴라쉬에 대한 설명은 이 책 안에 존재한다.
굴라쉬: 얼큰한 쇠고기 수프. 체코의 대표적인 전통요리다. 소고기와 야채를 넣고 끓인 진한 수프로 파프리카나 고추를 넣어 매운 맛이 난다. 빵과 곁들여 먹으면 한 끼 식사로 거뜬하다. 걸쭉한 국물이 마치 우리의 육개장과 비슷한 풍미가 어우러져 해장용으로도 좋을 듯. 한 마디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는 의미.
오! 대체 이 작가는 누구인가!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얄팍한 감상만을 써넣는 여타의 여행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 작가는 책을 알고 글을 아는 작가다. 여행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여행을 가기전에 예행연습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어딘가를 여행하기 전에 그곳을 배경으로 한 책이나 영화로 예행 연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에게는 그것이 사랑에 빠지기 위한 구실이다. 사랑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려는 덧없는 몸부림이 아니던가. 그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다."
이 여행기를 읽어가노라면, 내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그녀의 글쓰기를 만나볼 수 있다. 단순히 그녀가 어디에 가서 무얼 느꼈다, 라고 얘기했다면, 나는 그녀의 이야기들에 반할 수 없었을 터. 그녀는 그 모든 곳, 모든 상황속에서 자신이 보았던 영화와 책에 대해 이야기 한다. 각주처럼 책의 본문 밑에 나와있는 각 작품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하나같이 보석처럼 빛을 발한다. 게다가 그녀가 읽었던 책들이란 어느것하나 버릴 것이 없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메모하고 싶다. 그러나 책을 읽다가 메모하는 것은,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내게 꽤 번거로운 일이라, 지겹도록 밑줄만 긋고 동그라미만 그린다.
나는 졸린고양이처럼 솔직해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그녀는 영화 『타인의 삶』을 얘기하고, '보후밀 흐라발'의 『엄중히 감시받는 열차』를 얘기한다. 엄중히 감시받는 열차는, 내가 보았던 '이리 멘젤' 감독의 『가까이서 본 기차』의 원작인데, 작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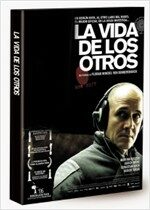


그러나 사연 많은 여자는 눈밑에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법, 또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궁금해 하지 말라는 점잖은 경고가 번드기고 있는 듯도 하다, 라는 표현을 써낼 수 있는 이 책의 작가는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사랑해요!),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 있는 나날』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체코의 맥주를 마시다가 슬프게도 바닥에 다리가 닿지 않는다. 인생이란 이런거다, 라고 씁쓸해 하면서도 카프카를, '펄 벅'의 『대지』를,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를, '미셀 투르니에'의 『예찬』을 나에게 들이민다. 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허투로 여행을 하지 않았다. 보고 싶은것과 먹고 싶은것을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자세로 새로운 장소를 대해야 할지 미리부터 준비한다. 책을 읽는게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쯤은 그녀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그녀는 최선을 다할뿐이다. 그러니 그런 그녀가 써내는 책이 허투로 된 여행기일리가 없다. 그녀가 달아주는 주석은 주석 자체만으로도 반짝거린다. 나는 그녀가 달아놓은 그 모든 작품들을 차례로 섭렵하고 싶어졌다. 그중에 이미 내가 읽거나 본 것이 있다는 건 어쩐지 좀 뿌듯해지는 느낌을 준다.
물론, 이 책이 완벽한 책은 아니다. 이 책도 역시 나에게 아쉬움을 준다. 나는 이 작가가 조금 더 완벽한 여행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좀 더 글을 잘 쓸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 그녀의 글쓰기가 백프로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것 같아 여간 아쉬운게 아니다. 조금 더 힘을 빼고 조금 더 여유롭게 썼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글쓰기가 나왔을텐데, 하는 생각이 책장 한장 한장마다 아쉽게 묻어난다. 이 책 곳곳에 밑줄 그을 만큼 완벽한 문장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그 거리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가슴 뻐근하게 사랑할 줄 아는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는 문장.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 내 가슴에 파고드는 문장을 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쩐지 좀 긴장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책 속의 그녀를 보노라면, 그런 그녀라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녀가 미국에 갔다 온 여행기를 좀 내줬으면 싶다. 당신이 다녀온 미국에 관한 것이라면 읽을 맛이 날 것 같아요, 라고 응원도 해주고 싶다. 그녀가 일본이나 중국에 다녀와도 또 괜찮겠다. 그녀는 허투로 여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 여행속에서 여유를 찾는다 해도 그 여유속에도 생각이 묻어나는 그런 작가니까, 이 작가라면 어디를 다녀와도 꽤 근사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그 여행들 속에 이렇게 책과 영화를 섞어서 얘기해준다면, 나는 가만히 이곳에 앉아서 그 모든것들을 누릴 수 있을텐데.
완벽하게 멸치똥을 빼주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나는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은 여행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여행기. 새벽 한시가 넘어 글을 쓰는데 전혀 후회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책속의 작가가 언급한 책, 영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