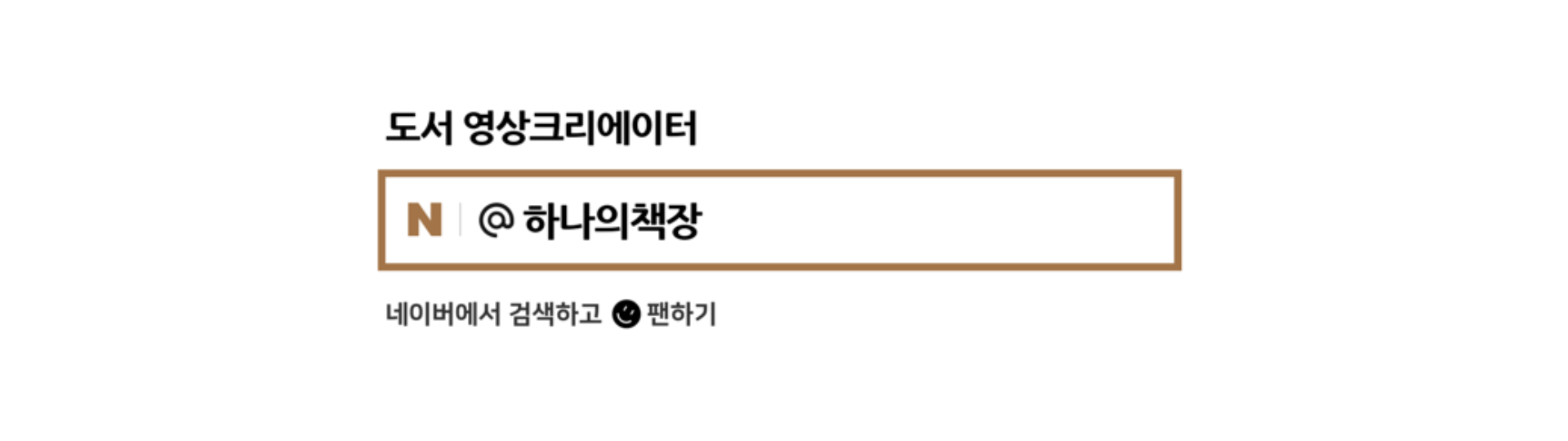아무튼, 여름
저자 김신회
제철소
2020-05-29
에세이 > 한국에세이
여름은 결국 열 가지 풍경보다 한 가지 뜨거움으로 기억되는 시간이다.
■ 책 속 밑줄
좋아하는 게 하나 생기면 세계는 그 하나보다 더 넓어진다. 그저 덜 휘청거리며 살면 다행이라고 위로하면서 지내다 불현듯 어떤 것에 마음이 가면, 그때부터 일상에 밀도가 생긴다. 납작했던 하루가 포동포동 말랑말랑 입체감을 띤다. 초당옥수수 덕분에 여름을 향한 내 마음의 농도는 더 짙어졌다.
여름옷을 입을 때마다 몸에 대해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옷 앞에서 살까 말까 망설이거나 사놓고도 못 입던 옷을 발견할 때 ‘입고 싶다’보다 ‘입어도 될까?’가 먼저 떠오른다. 옷은 예쁜데 내가 입어도 예쁠까. 팔뚝살에 탄력도 없고, 허벅지도 두껍고, 배까지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내 몸을 검열하다 보면 그 옷은 나를 위한 옷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옷을 입으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거야, 정작 입고도 불편할 거야…. 그렇게 입고 싶은 옷은 저 멀리 치워두고, 입어도 되는 옷만 고르게 된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여름마다 수영장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정모를 하고 싶다. 여름이 되면 수영하고 싶지만 수영을 못 하고, 그러면서도 결코 수영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임 이름은 ‘수수수’. 일종의 자조 모임인데 언젠가는 수영할 수 있게끔 서로를 응원하는 모임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수영을 배우지 않게끔 서로의 발목을 잡는 모임이다.
좋아하는 계절을 닮은 사람과 좋아하는 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았다. 그동안 혼자로도 충분했던 여름의 순간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색깔을 덧입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여름이 끝나는 것처럼 이 사랑도 끝이 날 거야. 난 다시 혼자가 되고 싶어 할 거야.
그동안 내가 식물에 쏟은 정성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관심이나 애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은퇴를 하거나 자식들을 집에서 떠나보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매일 아기 돌보듯 식물을 가꾸는 걸까. 우리 아빠도 그러시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은 꼭 필요하다.
그 시절 내가 그리워한 건 여름이 아니라 여름의 나였다. 여름만 되면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 하는 나, 왠지 모르게 근사해 보이는 나, 온갖 고민과 불안 따위는 저 멀리 치워두고 그 계절만큼 반짝이고 생기 넘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겨울인 사람은 여름 나라에서도 겨울을 산다.
돈을 벌게 되고 나서부터 여름이 되면 집착하듯 여행을 떠났다. 홀쭉한 통장 잔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건 문제 되지 않았다. 어렸을 때 하지 못한 경험을 지금이라도 스스로 선물하고 싶었다. ‘이제는 여행 가는 데 부모님은 필요 없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뻔질나게 나 자신을 여행시켰다. 모든 시간이 즐거웠을 리 없다. 아등바등 무리해야 떠날 수 있는 여행이었으니까. 하지만 몸소 만든 시간을 통해 텅 비어 있던 내 안의 어떤 구멍을 채워나갔다.
지극히 사사로운 여름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별게 아니다. 여름을 즐기는 데 필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순수한 기대라는 것. 내 흑역사들이 여름을 진심으로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게 될지 몰라도 이렇게 소심하게나마 여름을 아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근사한 추억 같은 거 없어도 여름을 사랑할 수 있다.
바닷물은 말보다 서늘하고, 피부에 닿는 햇살만큼이나 직설적이다.
■ 끌림의 이유
요즘 따라 하루하루 마음의 온도를 가늠하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늘 누군가 혹은 어떤 기억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잔잔한 물결을 만듭니다.
『아무튼, 여름』은 여름의 일상과 감정을 담백하고 섬세하게 포착한 글들입니다.
무심한 풍경, 소소한 행동 속에서도 작가 특유의 유머와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읽다 보면 여름에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습함과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감촉이 생생하게 다가와 계절이 주는 감각과 마음의 온도를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책장을 덮고 나서도 한참을 여운 속에 기대게 되는 이유는 아마 제 마음이 여름에 물드는 순간들이 포착되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 간밤의 단상
김신회 작가의 전작인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를 좋아해서 선물도 여러 번 했던 제게 『아무튼, 여름』 또한 익숙하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책장을 덮으려고 하니 방 안에 남은 여름의 기운이 문득 피부에 닿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름날의 숨소리처럼 조용히 마음에 앉습니다.
곧 시작되는 장마, 긴 장마 끝에 다가올 뜨거운 한낮의 햇살 그리고 지난 여름의 기억들.
책을 읽고 나니 작고 따스한 여름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펼쳐보게 됩니다.
여름은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와 그늘에 숨어 있는 무더위처럼 말이죠.
우리는 각자의 온도에 물들어 있고 긴 장마 끝에야 한여름의 태양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나와는 다른, 조금 더 따뜻해질 내일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 건넴의 대상
소소한 일상이 담긴 감성어린 에세이를 마주하고 싶은 분
여름이 물씬 묻어난 책을 추천받고 싶은 분
♥
이 책을 읽고 마음에 남은 문장이나 순간이 있다면 공감(♥)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감상이 더해지면 이 공간은 조금 더 깊고 따뜻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