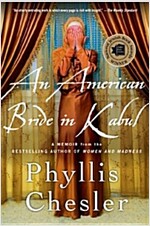
1. An American Bride in Kabul
밀린 책 읽기에 여념이 없는 요즘이다. 2챕터 남았던 책을 마저 읽었다.
카불의 미국인 신부, 필리스 체슬러는 제2세대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중의 한 명이다. 미국으로 유학 온 아프칸 남성과 결혼해 카불에서 5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간신히 카불을 탈출했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지적이고, 여유로우며, 개방적이었던 남편이 카불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린 일에 대해 체슬러는 이렇게 쓴다. 그는 나를 진지한 지적, 미적 포부를 가진 미국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아프칸 아내로 대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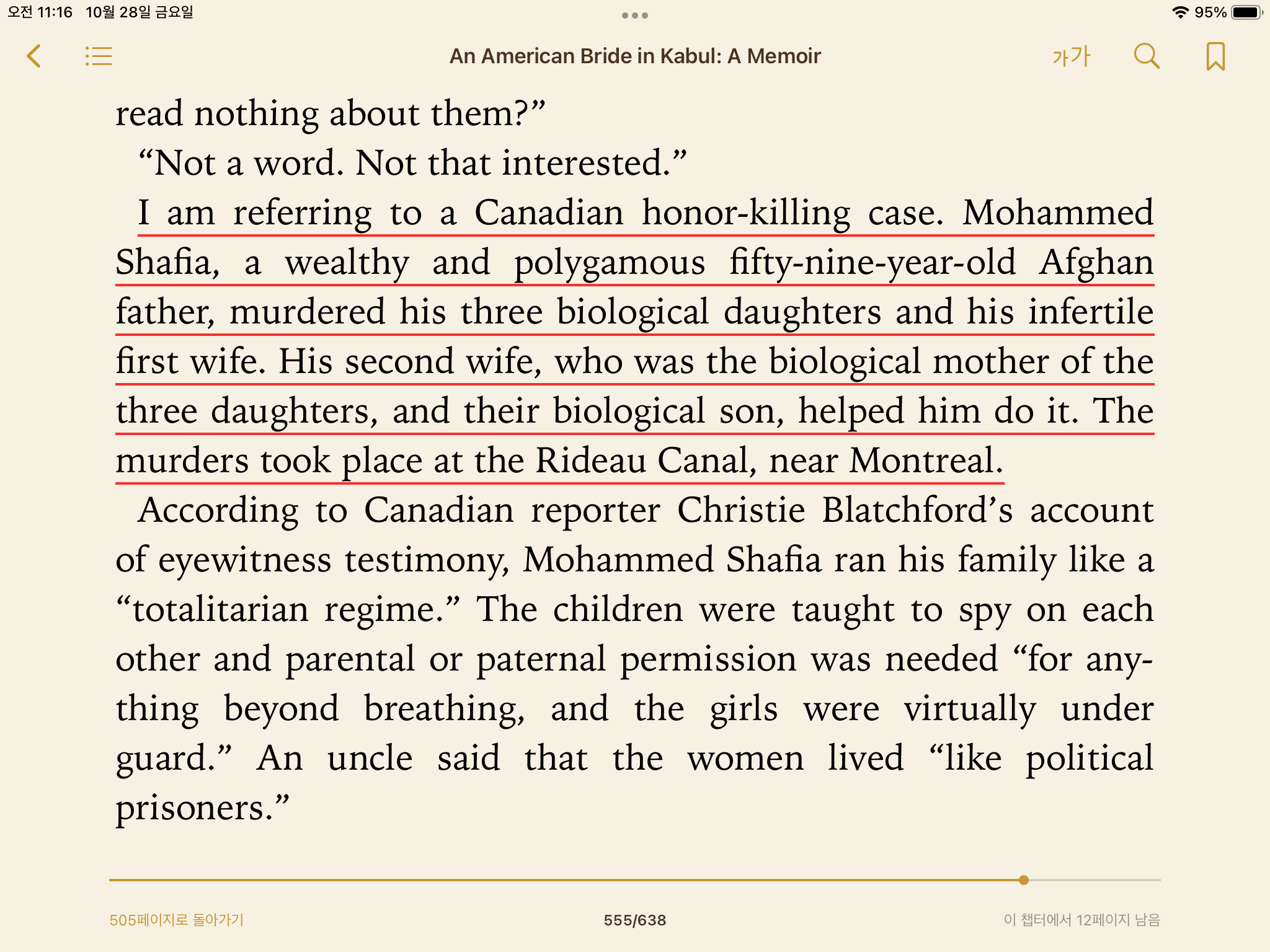
명예 살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아프칸이 아닌 미국 혹은 캐나다에 살면서도 과거의 관습 때문에 아버지 혹은 남자형제들에게 살해당하는 여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이론가이자 혁명가로서의 그녀를 보여준다. 페미니즘은 서구 사상의 산물이라던가, 명예 살인을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당히 맞서 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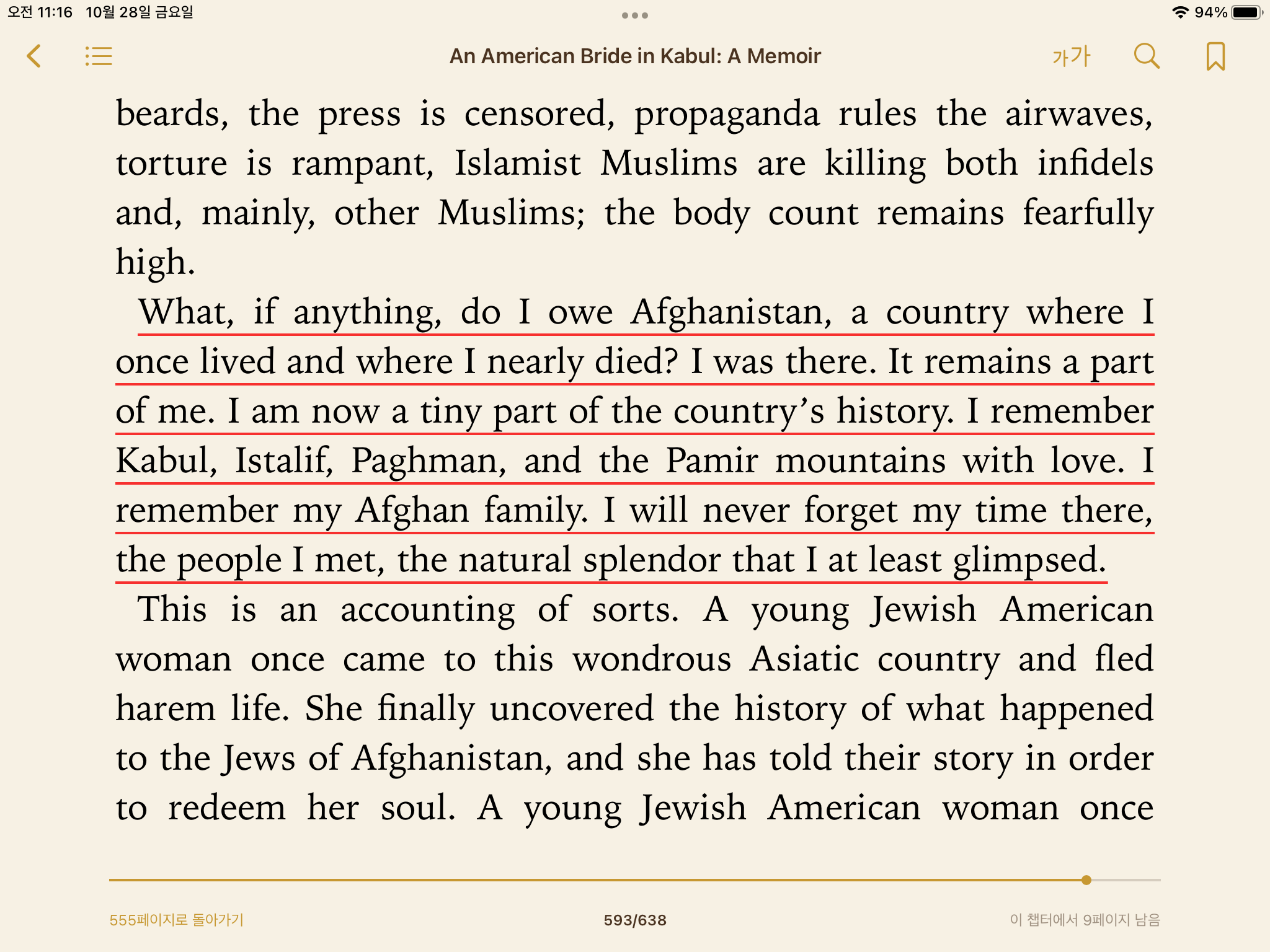
지독한 과거, 죽을 것만 같은 고통으로 점철된 과거를 직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이다. 체슬러는 그 과거에 당당히 맞섰다.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그 나라가 자신을 억압하고 감금하고 굶주리게 했음에도 자신을 그 나라 역사의 일부라고 여겼다. 그곳에서의 삶을 잊지 않았고, 자신은 이미 탈출에 성공해 꿈꾸던 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곳의 억압받은 여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싸웠다.
이론가이자 혁명가. 페미니즘의 산증인. 예언가. 실천하는 지성. 진정한 영웅, 마이 히어로. 필리스 체슬러.

2.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글이 사람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나.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노출시키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전시하는가. 전영애 교수님의 글은 따뜻하다. 따뜻해서 지금이라도 찾아가면 금방 차를 한 잔 내어 주실 것 같고(이건 예의가 아니라서, 해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하다), 이 책에서와 같은 좋은 이야기를 한없이 들려주실 것 같다.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을 끌었다. 치열하게 공부하며 살아냈던 시간이 눈앞에 그려졌는데, 아이를 낳은 지 2달 만에 유학길에 오르는 몸과 마음을 상상하면 더욱 그랬다. 저자가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거쳐 대학에 임용되고 그리고 정년퇴임을 하고 여백서원을 지었던 일들이 모두 꿈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돌아보면 그 캄캄하고 절박했던 세월이 내 인생의 초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막하게 쭈그리고 앉아 읽고 손가락이 굳도록 적었던 것들이, 혼자 힘으로 무얼 읽고 읽어내는 일, 지금껏 제 자양분입니다. 그 캄캄한 10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 시절 제가 의지했던 건 미안하기만 한 제 아이들로부터 받은 힘이었고(아이들은 고맙게도 잘 커주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받은 소중한 장학금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무언가 보답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89쪽)
특히, ‘캄캄한 10년’이라는 문구가 오래오래 뇌리에 남았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정받는, 혹은 평가받는 그 모든 시간 바로 앞에. 나 혼자 책을 펴고 읽고 번역하고 쓰고 공부하는 그 인고의 시간이, 그 캄캄한 10년이 얼마나 길었을까,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하루를 살았다고 말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 오늘 바로 해야 할 일,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함 속의 공부에 대해 생각한다.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치의 공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독서괭님과 서곡님의 페이퍼 덕분에 놓치지 않고 마저 읽을 수 있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3. Mr. Wrong Number
일전에 친구들과 원서 읽기를 하던 중에 친구 한 명이 내게 연애 사건 발생(?)과 관련해서만 봤을 때, 일단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친구는 내 글과 내 댓글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 때는 그게 맞는가, 내가 정말 그런가, 생각했더랜다.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며 친구의 생각이 옳음을 확인했다.
제목이 9할인 로맨스 소설이니, 이 책은 Wrong Number을 가지고 여주에게 문자를 보낸 Mr.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겠다.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 번 실수로 문자를 보내고, 재미있고 위트 넘치는 대화를 나눌 수는 있겠으나, 그다음날 혹은 며칠 후에 또 다시 그런 문자가 온다면? 바로 차단이다. 더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남자인 척하는 여자이든, 여자인 척하는 남자이든 관심이 없다. 모르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걸로 이야기는 끝이다. 하지만, Mr. Wrong Number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여주는 계속해서 답장을 한다. 스스럼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멍청한 질문과 멍청한 대답을 주고 받으며 킥킥거린다. Mr. Wrong Number가 29, 여주가 25이라서 가능한 걸까?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가끔,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더 솔직해진다. 말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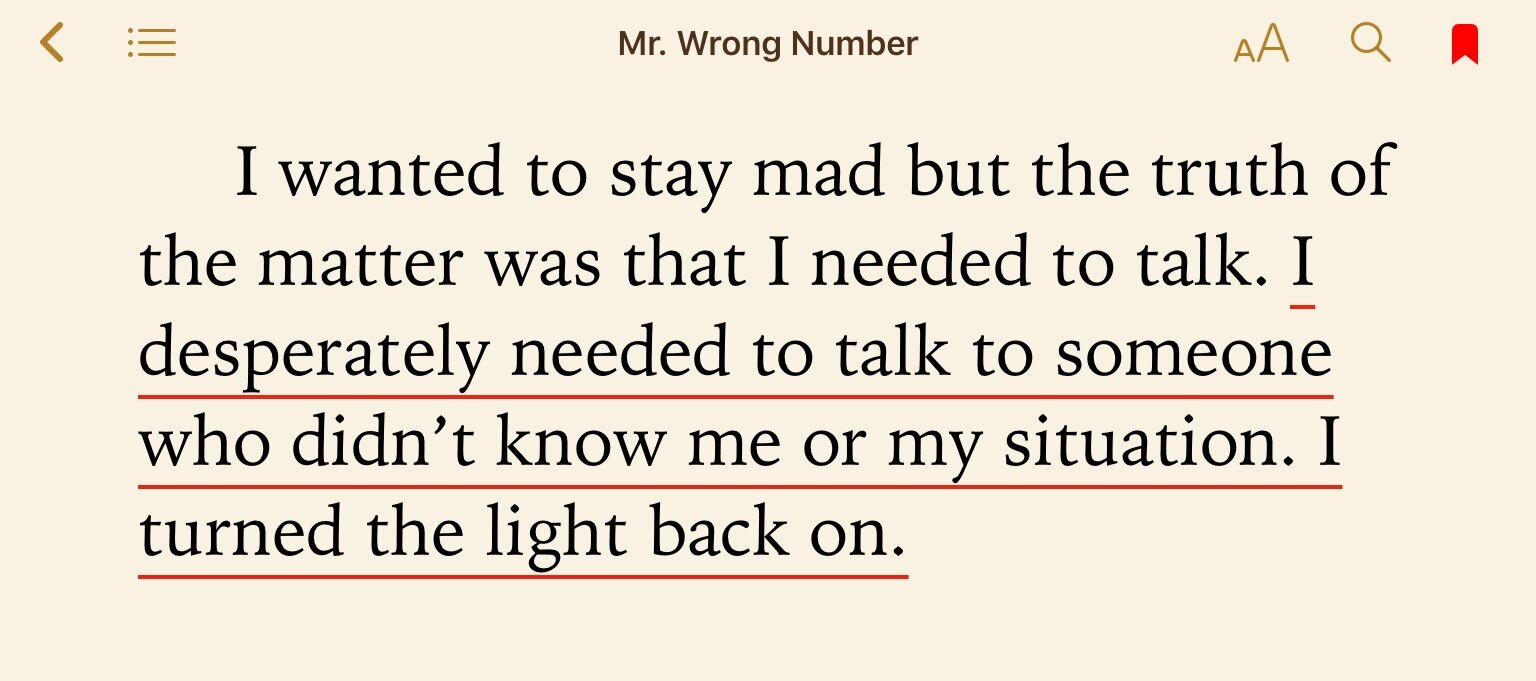
만약 Mr. Wrong Number와 여주(Mr. Wrong Number는 그녀를 Miss Misdial이라 부른다)와의 이야기가 전부였다면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남주는 따로 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여주 오빠 절친인데, 두 사람은 참을 수 없는 끌림 때문에 키스를 하고, 그건 실수였다고 합의했지만, 또 다시 길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그것마저 실수라고 주장하는 여주에게 남주는 fun fling, 썸을 타는 정도의 가벼운 연애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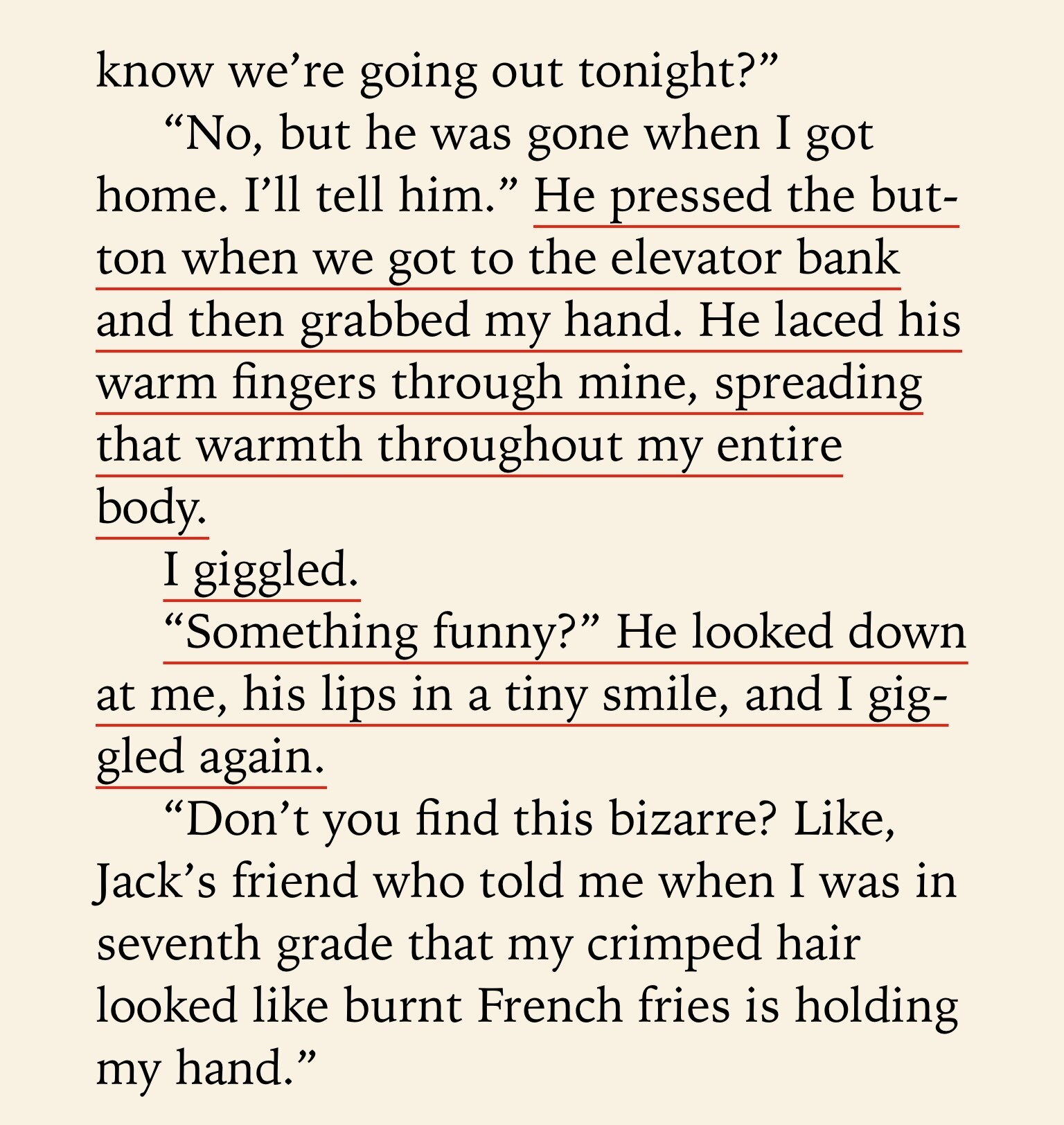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좋았다. 손잡기가 섹스보다 좋다거나 혹은 섹스가 손잡기보다 강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긴 시간 서로를 알아 왔고, 또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생활습관, 약점, 일말의 비밀까지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게다가 이미 섹스까지 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알콩달콩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이 즐거웠다.
위의 인용문 보면 확인 가능하지만 보통 혹은 보통보다 쉬운 수준이다. 다만,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를 놀리면서 주고 받는 농담들은 너무 ‘재치 만점’이라 이해하지 못 하고 패쓰하는 경우도 많았다.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Love you For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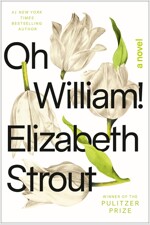
4. 오, 윌리엄
<오, 윌리엄> 출간을 축하드리며, 집에 있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책을 꺼내 보았다. 나는 이 중에 한 권을 읽었고, 한 권을 반정도 읽다 말았고, 두 권은 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제일 먼저 읽은 스트라우트 책은 <에이미와 이저벨>이어서, 내게 스트라우트는 좀 쎄고 강한 인상이다. 다른 책들도 읽게 될 날을 고대한다. 더 미루면 안 되는데, 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