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스팀 청소기가 선사하는 세계
세탁기는 매주가 아니라 매일 빨래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진공청소기와 양탄자용 세제는 먼지와 살거나 카펫 위의 얼룩을 참고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식기세척기, 빵 보온기, 냉동고, 믹서 같은 기계들은 모두 임무의 물질적 구현체이자 노동하라는 소리 없는 명령이다. (257쪽)
한경희 스팀 청소기가 한참을 유행한 후, 나도 한 번! 이라는 생각으로 스팀 청소기를 샀다. 진공 청소기만으로는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고 바닥은 물걸레질이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엎드려 물걸레질 하는 게 즐겁지 않아,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체험하는 게 좋겠다 싶었다. 큰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작은 애랑 둘만 있는 오전 시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후 스팀 청소기로 바닥을 닦았다. 아침 일찍 청소를 시작해도 스팀 청소기에서 뿜어지는 뜨거운 열기에 금방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곤 했다. 나시 티셔츠에 핫팬츠. 해변으로 달려 나갈 만한 복장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바닥을 닦았다.

『부엌 청소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자는 없다』. 제목 그대로다. 물론 나도 거실 바닥을 스팀 청소기로 박박 밀면서 오르가즘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순간순간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어렸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청결한 환경이 중요하니까. 나는 바닥 청소에 진심이었다. 나중에 집을 내놨을 때, 집을 보러 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닥이 참 깨끗하다고 말했다.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바닥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나중에서야 진짜 우리 집 바닥이, 정확히 ‘바닥’이 그렇게나 깨끗하다는 걸 알게 됐다. 10여 년 전, 나의 젊음과 에너지를, 나는 바닥에 쏟아부은 셈이다.
지금은 열심히 바닥을 닦았던 그 집에서 나와 두 번 더 이사했고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 이제는 바닥 청소를 하지 않는다. 이사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두어 번 바닥 청소를 하긴 했는데, 스팀 청소기는 베란다에 내놓았다. 닦아도 닦아도 더러워지는 바닥에 더 이상은 진심을 쏟지 않기로 했다.
2)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핑계
이미 보았듯이 어머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훨씬 더 보수적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페미니스트들도 가정중심성을 전적으로 숭배하고 있었다. … 게다가 페미니스트들은 사회 복지와 개혁운동, 심지어 참정권 투쟁까지 여성의 적극적 행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핑계로 삼을 수 있었다. (275쪽)
나는 이 문단을 월요일에 읽었다. 월요일에 ‘Do not miss the sea’를 쓰고 나서, 누군가 이 문단도 좀 읽어보라고 내 앞에 가져다준 게 아닌가 싶었다. 페미니즘이 말하는 것 혹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한 정도로 그 범위가 넓다. 숨겨져 왔던 여성의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가사부불노동, 돌봄노동, 꾸밈노동, 가정폭력, 성매매 역시 페미니즘이 다루는 중요한 의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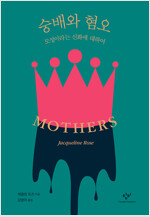
그중에서도 ‘모성’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숭배와 혐오』에서 재클린 로즈가 말했던 것처럼 ‘모성은 우리의 개인적, 정치적 결함, 다시 말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잘못된 일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떠맡은 희생양이다(6쪽)’. 어머니는 이 세상 모든 실패의 이유다.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용인하는 분위기지만, ‘모성’은 여전히 성역이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성이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최후의 정서적 보루가 ‘모성’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야당 정치인은 야무진 외모와는 달리 살림에는 ‘허당’임을 방송에서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줬다. 그래도 되었기 때문이다. 성공한 여성 정치인은 살림을 못 해도 괜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한 여성 정치인도 포기할 수 없는 일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모성’이다. 자녀에 대한 애달픈 마음, 아픈 자식을 향한 절절한 모정. 나는 ‘모성’이야말로 페미니즘의 가장 치열하고 섬뜩한 경합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월요일에, 나는 애나였다. <엄마 걱정>을 썼던 기형도의 마음 같지는 않더라도 엄마가 그리운 마음에 대해, 난 조금은 안다고 생각한다. 어스름한 저녁, 퇴근길의 엄마를 마중하러 동생 손을 잡고 집을 나서고, 사거리 ㅇㄴ약국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노라면 신호등이 열 번이나 바뀌어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 서로 연락할 수도 없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혹 엄마랑 길이 어긋났을까.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순간이면 거짓말처럼 엄마가 나타났다. 아빠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엄마는 일하러 가지 않고 대신 집에서 아빠 일을 도우셨는데(?) 난 그게 그렇게나 좋았다. 학교에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있었다. 그런 나, 엄마를 기다리는 나. 애나였던 나를 뒤로하고.
오늘은 사라가 된다. 바다를 그리워하는 사라. 고향을, 고향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사라. 내가 이루었을지도 모를 사회적인 성취를 헤아려보는 사라. 세월 속에 감추어 두었던 꿈을 조심스레 꺼내 보는 사라. 돌아갈 수 없음에 안심하고 동시에 슬퍼하는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