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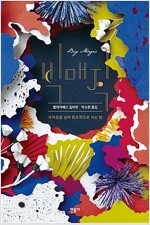

저번 주에는 프랑스어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같이 공부해보자는(정확히는 가르쳐 주겠다는) 친구의 제안에 “나는 아-베-체-데도 모르는데 괜찮아?”하고 물었는데, ‘아-베-체-데’가 아니라 ‘아-베-쎄-데’로 물어야 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다. 평생 동안 영어가 어려웠고 지금도 못 하지만, 적어도 프랑스어만큼은 아니니까. 프랑스어 책을 펼칠 때마다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의 경험이 놀랍고 신기하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차분해진다. 프랑스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을 듯 하다. 왕초보 프랑스어라든가, 기초 프랑스어 100일이라던가, 슬기로운 프랑스어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프랑스어 만만세라든가.
이 책은 비연님 서재에서 발견한 책이다. (이 자리를 빌어 비연님! 땡큐요^^) 엘리자베스 길버트에 대해서라면 호불호가 나뉠 텐데, 나는 좋아하는 쪽이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도 좋았지만, 『결혼해도 괜찮아』에서 전작의 전 세계적인 대성공 이후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강요할 때, 사람들이 요구한 무언가에 스스로를 맞춰가고 싶을 때, 나는 아직 글 쓸 준비가 안 되었네, 하며 토마토 키우기에 집중하는 장면에서 내 사랑은 더욱 확실해졌다.
Ideas are a disembodied, energetic life-form. They are completely separate from us, but capable of interacting with us – albeit strangely. Ideas have no material body, but they do have consciousness, and they most certainly have will. Ideas are driven by a single impulse: to be made manifest. And the only was an idea can be made manifest in our would is through collaboration with a human partner. (35p)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받아 들일만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그녀의 주장은 흥미롭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한다. 자신에게 찾아왔던 영감을 무시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소설가 친구에게 옮겨갔던 일 말이다. 그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듯 싶다. 구체적인 스토리라인의 아이디어가 볼키스를 통해 그녀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그래서 제목이 ‘매직?’
다음 챕터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던 과학자들이 어떻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발견을 할 수 있었는지 말하려는 듯 싶다. 앨프레드 윌리스라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학자는 『종의 기원』의 등장을 촉진시킨 사람이다. 윌리스는 종의 진화에 대한 간략하고 개념적인 논문을 학회에 제출했는데, 논문 심사 위원 중 한 명이었던 다윈의 스승은 윌리스의 논문이 다윈과 같은 생각을 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다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윈의 주장과 연구가 윌리스와 같은 학보에 실리도록 권했다. 다윈은 떠밀려 출판함으로써, 간신히 자신의 연구와 주장의 소유권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양자오의 『종의 기원을 읽다』에서 읽은 내용이다.
영어로 말해야하는 밤인데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된 책을 읽는다. 일요일마다 재활용을 정리해 내놓는데, 일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 월요일 다음에는 목요일이고, 그 다음은 토요일이다. 그리고 재활용의 일요일.
월, 목, 토, 일, 월, 목, 토, 일, 월, 목, 토, 일, 월, 목, 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