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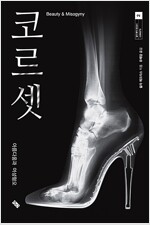
열다 페미니즘 총서의 네번째 책, 『젠더는 해롭다』를 읽고 있다. 페미니즘의 눈으로 본 트랜스젠더 정치학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저자 쉴라 제프리스는 『래디컬 패미니즘』, 『코르셋 : 아름다움과 여성혐오』의 저자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할 때, 사회 전반의 ‘이성애’ 선호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나같은 경우라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기 보다는 ‘성적 환상’에 대한 의문이 더 커졌다. 인간이 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 남녀의 성적 동요와 감흥, 성 충동과 대상에 대한 갈망이 인생에 있어 그렇게 큰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는 뜻이다. 나는 그랬다. 마리 루티의 말을 빌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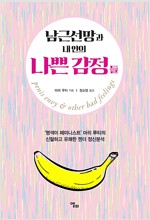
사랑이 부여하는 힘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전히 살아있다는 느낌, 내 삶을 완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충족감 때문에 연애를 하는 사람도 많다. 지루하고 짜증 나던 인생이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을 쉽게 포기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이 들뜬 상태는 빠르게 희미해진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에서 얻는 만족에 비해서 말이다. (123쪽)
저자는 동성애와 트랜스 젠더리즘이 구성된 과정상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그들의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시각과 ‘양쪽 다 생물학적 결정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트랜스젠더’라는 인간 분류가 남성 권력의 영향으로 생겨났다고 주장한다.(75쪽)
블랜차드, 베일리와 같은 학자들은 동성애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트랜스섹슈얼리즘, 즉 자기여성화도착증을 성적 취향이자 일종의 이상 성욕이라고 본다. 이는 자기 머릿속에서 여성성과 관련 있는 모든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자가 단순히 크로스드레싱에서 만족하지 않고 물리적 수단을 통해 몸에 여자됨을 새겨넣는 과정을 이해하게 해준다. 마취술의 발달과 호르몬제의 개발을 통해 ‘여자가 되고 싶은 이들의 욕구’가 ‘마땅히’ 충족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의료계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젠더 차이 철폐를 목표로 내세웠던 페미니스트들이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부분집합으로 개발된 퀴어이론의 등장으로 이론 싸움에서 주도권을 빼앗겼고, 트랜스젠더 행위가 퀴어 정치를 대표하는 관습으로 자리잡는데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여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페미니즘도 존재할 수 없다. 페미니즘은 여자라는 특정 피지배 집단을 해방하기 위한 정치 운동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자를 지우면 페미니즘도 그 의미를 잃는다. ‘여자’는 퀴어 이론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118쪽)
이에 대해선 책 맨 앞에 번역가인 유혜담의 빛나는 문장이 있다.
나는 내 주변 여자들이 그렇듯 ‘굳이 따지자면’ 페미니스트였다. 페미니즘은 시시한 상식이었고 나에게 해줄 게 없어 보였다. 페미니즘은 나 같은 보통 여자를 위해 이룰 건 다 이뤄버려서 이제 다른 소수자를 돌보는 운동에 가까웠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당연히 그런 소수자 중 하나였다.) 페미니즘이 생태주의부터 자본주의까지 온갖 불의에 맞서 싸울 때 나는 여자로서 응원이나 해주면 되는 거였다. (4쪽, <나는 왜 ‘터프’가 되었는가>)
이제 막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듣는 그 모든 이야기. 이성애자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느냐. 기혼인 네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느냐. 페미니스트라면서 너는 장애인 인권에는 관심을 갖지 않느냐. 페미니스트인 네가 육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너는 페미니스트라면서 환경 운동에는 왜 동참하지 않느냐. 모든 페미니스트 앞에는 ‘진정한’ 혹은 ‘완벽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만이 페미니스트이며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못한다면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세상의 그 모든 아우성에 더해서, 이제는 호르몬 처방을 거부하고 수술도 하지 않은 채 평생 남자로 살아오다가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한 사람들에게 ‘혐오’를 일삼는 집단이라고 비판 받는 집단. 남자에 더해, 남자가 된 트랜스젠더에게 억압받는 사람들. 이제 여자 화장실, 여자 교도소, 여성 쉼터에서조차 맘편히 쉬지 못 하는 사람들. 백래시 정도가 아니라 앞뒤 좌우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
김영란 전 대법관의 신간 『판결과 정의』의 첫 문장. 마음이 콩콩.
가부장제는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인류 발전단계의 한 형태였던 농경 사회 이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