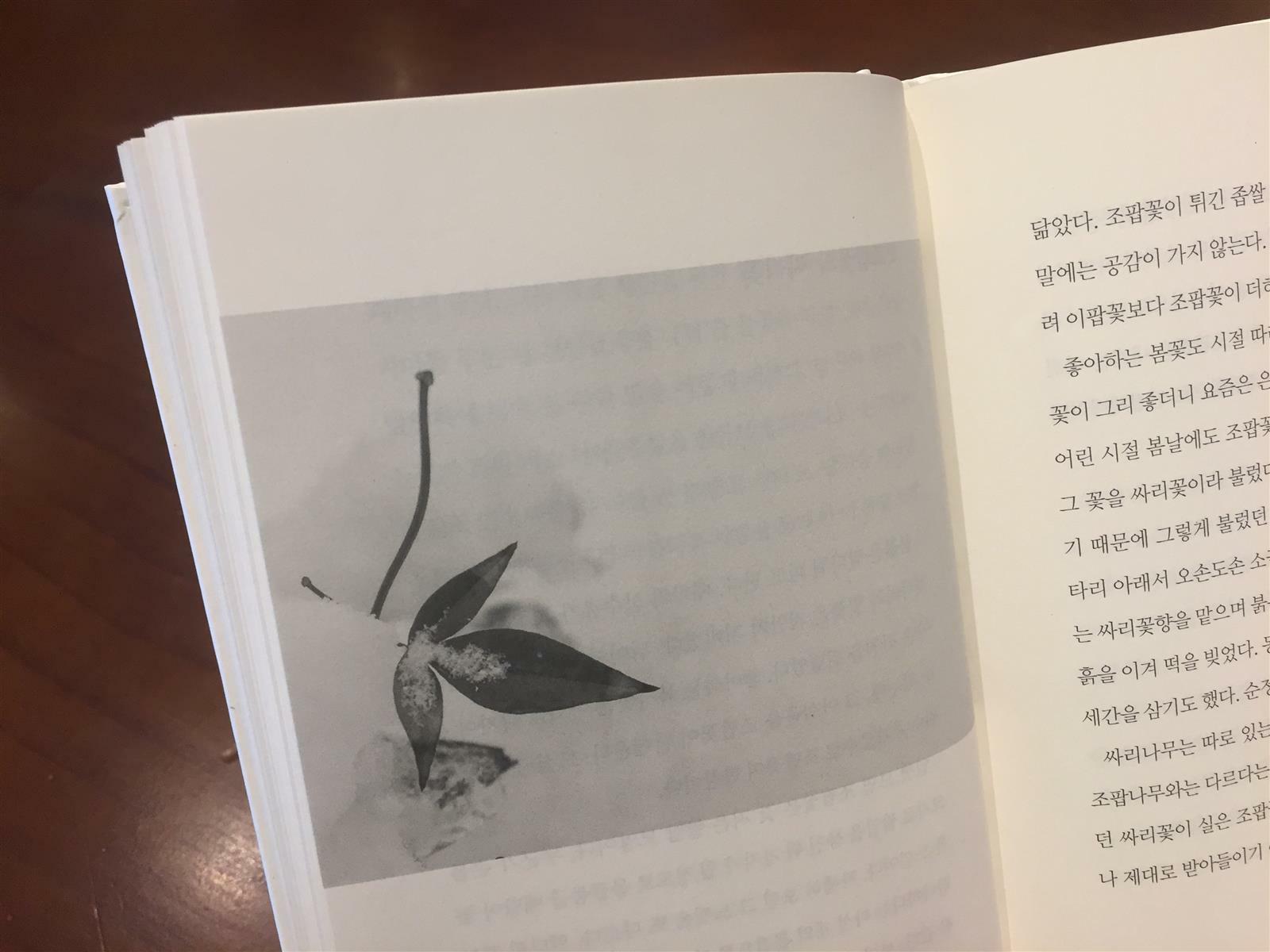-

-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
김살로메 지음 / 도서출판 아시아 / 2018년 5월
평점 :



일천 글자 미니 에세이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은 각각 사람, 생활, 책, 일상, 글의 다섯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는다.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남자인 줄 알았던 여자 시인 쉼보르스카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다. 지독하게 추운 날씨. 장갑을 낀 채 시를 쓴다는 폴란드 시인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가끔 달빛이 들 때 온기에 겨워 장갑을 벗는다는 폴란드 시인은 쉼보르스카 자신이기도 할테니, 장갑을 끼고 시를 쓰다 달빛에 장갑을 벗는 쉼보르스카를 상상한다.
『숨그네』는 이 책을 읽으며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소설이다. 몽환적이며 비약적인 문체,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의 조합이 헤르타 뮐러를 통해 가능하다는 말에 금방 솔깃해진다.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도 그렇다. 어디까지가 문학일까. 어디까지가 사적인 기록일까. 사람들은 유명인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기록을 궁금해한다. 롤랑 바르트는 메모지에 어머니에 대한 단상을 적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 이야기는 고백으로서만 자리할것인가. 내 이야기는 문학이 될 것인가. 그의 애도일기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롤랑 바르트의 죽음이 앞당겨짐으로 해서 가공되지 않은 채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나도 롤랑 바르트를 읽고 직접 확인하고 싶다. 그의 기록은 고백이 되었을까. 아니면 문학이 되었을까.
책에 대한 글들을 재미있게 읽었지만 이 책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집밥’이라는 글이었다. 『타임푸어』의 이 문단이 떠오르기도 했다.
집안의 먼지가 다 없어지고 냉장고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자. 케첩으로 만든 스파게티와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하다(<타임푸어>, 454쪽)
외지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돌아오는 주말, 엄마는(저자는) 중복되지 않게 식단을 짠다. 아침엔 초밥, 점심엔 냉면, 저녁엔 피자, 다음날 아침엔 고깃국, 점심은 스파게티, 저녁은 삼겹살. 엄마로서의 임무를 끝내고 뿌듯해하는 찰나, 아들이 속내를 말한다. 집밥이 그리웠는데, 엄마가 차려준 건 집밥이 아니라 요리였다나. 아들이 바란 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소박한 밥상이란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시원한 열무김치, 고등어 한 토막. (31쪽)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서도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어머니에게서 한참이나 먼 불량 엄마지만, 끼니 걱정하는 마음만은 똑같이 품고 사는 1인으로서 그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한편 ‘엄마,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소박한 밥상이예요’라고 말하는 이 아들이 너무 예쁘다. 예쁘게 말하는 아들은 듬직하게 다 자란 멋진 청년이 분명하겠지만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의 참맛을 아는 이 아들은, 참 예쁘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한다. 소박하고 평범한 밥상, 도란도란 마주앉아 오늘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고, 마주 보고 웃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김살로메 작가의 에세이를 읽었다. 집밥 같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든든한 한 끼가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글을,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