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맛
서른 살 생일날 먹은 케이크가 냉장고에 아직 몇 조각 남아 있던, 그러니까 풋풋한 시절의 따뜻한 어느 날, 이랬다. 젊었다.
키친 테이블 위에 올린 팔로 오른쪽 볼을 괴고 조용히, 테이블 너머에서 잘그락 잘그락 설거지에 열중하는 뒷모습을 본다. 아무렇게나 머리를 묶고 아무렇게나 옷을 걸친 저 사람. 아무래도 좋은 사람. 투명한 머그컵의 둘레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기 좋은 사람. 괜히 한 번 불러 볼까. 슬그머니 다가가 안아 볼까. 아니면, 하얗고 따뜻한 저 목의 줄기 어디쯤에 하얗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으며 슬쩍 가슴을 움켜쥐어 볼까. 뭐야, 저리 안가? 후후, 이것은 어제 저녁 설거지 하다가 난데없이 유린당한 내 엉덩이의 복수다. 에이, 됐다, 못 만지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시선을 돌려 머그컵 겉면에 맺혀 있는 작은 물방울을 들여다본다. 뭔가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창이 넓은 집, 점심이면 스미는 햇살만으로도 초겨울은 거뜬히 넘길 수 있는 빛이 많은 집이라 유리로 된 물건들이 이 집 안에서 조금 더 아름다웠으므로, 혹시 저 사람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그 뒷모습과 내 눈 사이에 머그컵을 가져다 들고는 이리저리 초점을 맞춘다. 커피 마실래? 뒷모습이 전기포트 스위치를 올리며 말한다. 응, 커피. 무슨 커피 마실래? 음, 갈색. 검은 거 마시지 왜? 갈색이 달잖아. 검은 건 써. 그럼 마시고 이 닦아. 알았어. 꼼꼼히 닦았나 볼 거야. 머그컵 좀 갖다주고. 뒷모습이 잠깐 앞모습이 되었다가 다시 뒷모습이 되어 찬장에서 커피를 꺼낸다. 아까 그냥 가슴 만져 볼 걸 그랬나? 갸웃갸웃 하는 동안 뒷모습이 양 손에 머그컵 하나씩을 들고는 앞모습이 되어 맞은편에 앉는다. 내 머그컵은 갈색, 앞모습의 머그컵은 검은색. 일루 와, 옆에 앉아. 싫어, 니가 와. 내가 간다. 그 사람 앉은 의자에 억지로 엉덩이를 들이민다. 에이 참, 멀쩡히 빈 의자 냅두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왼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 내 오른쪽 허벅지 위에 반쯤 걸쳐 앉는다. 불편해? 괜찮아. 안아 줄게. 오른손으로 어깨를 둘러 감고, 방금 전까지 앞모습이었던 옆모습과 조용히 커피를 홀짝인다. 있잖아, 아까 자기 설거지할 때, 가서 가슴 만지려다가 참았어. 대단하지? 변태. 뭐가 변태야. 자기도 어제 나 설거지할 때 엉덩이 막 만졌잖아, 야하게. 그건 자기 엉덩이가 만지고 싶게 생겨서 그런 거고. 자기 가슴도 보면 막 만지고 싶게 생겼거든? 야, 설거지하는데 뒤에서 엉덩이는 보이지만 가슴은 안 보이거든? 아닌데. 자기 건 뒤에서도 귀퉁이 조금 보이는데? 변태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그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뽀뽀나 하자.
으, 검은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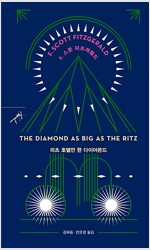
사랑에 대한 글은 이제는 읽기도 쓰기도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실은 본능, 충동, 욕망 등의 변장일 뿐이라고 단정하며 짐짓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이 성숙하다고 믿는 미성숙한 소년들을 뿌듯하게 만들기는 하겟으나, 그것은 사랑에 대한 온갖 미신과 기만을 재생산하는 담론들 속에서 달콤하게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태도라고 할 수도 없다.
_ 신형철,『정확한 사랑의 실험』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의 일을 끝냈어요. 이제는 다리를 쭉 뻗고 즐길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니,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 거요.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저녁이라고."
_ 가즈오 이시구로,『남아 있는 나날』
둘 다 지금까지 키스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한 시간이 흐르자 키스를 해 보았는지 못 해 보았는지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였다.
_ 스콧 피츠제럴드,『리츠 호텔만 한 다이아몬드』
검은 마음
이건 이 자리에서 지어낸 이야기다.
"인간이 오감 중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은 시각이야. 그렇지만 눈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오히려 시선은 때론 폭력이나 감옥처럼 동작하기도 해. 사르트르나 푸코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귀와 코와 혀는 어떨까. 메커니즘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역시 그 감각들 또한 주체를 위해 복무하는 경향이 커. 객체를 분석하고 해체하는 데 쓰이는 메스나 망치 같은 거야.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감각들에 너무 의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촉각은 어떨까. 만지는 것은 상대의 체온을 느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 역시 그 손을 통해 나의 체온을 느끼지. 맞닿아 있는 두 피부 사이에 우열은 없어. 경계만 있을 뿐이지. 그 경계 또한 우리가 모두 체온을 지닌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점점 흐려지고. 누구에게나 말없이 안아주는 따뜻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한 경험 한 번 쯤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난 생각해. 우리는 이제 촉각을 배우고 촉각을 익히고 촉각에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체온을 나누는 대상으로 인식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슬픈 싸움들을 종식시키고 하나된 인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저 눈동자만 굴리며 차갑게 쳐다만 보기보다 이 손, 오로지 이 뜨거운 손으로 말이지."
"음, 시도는 좋았어. 그래도 아직 가슴은 안 돼."


어두운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웃음과 함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악마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 힐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_ 금정연,『실패를 모르는 멋진 문장들』
나는 동물이다. 나는 내 욕망의 전략에 이끌리어 내가 선택하고 사유하는 양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사유하는 척한다. 그러나 내 눈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 이쁜 여자의 젖·궁둥이, 내 코에 들어오는 최루탄 가스 냄새-오, 이것은 생각하기도 싫다. 벌써 맵다-물 비린내, 내 입에 들어오는, 맛있는 과일, 단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욕망이다. 내 욕망은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그 나름의 필승의 전략을 짠다. 나는 백전백패다. 내 욕망은 나에게 억합하지 말라, 해방하라고 권유한다. 권유하는 것은 욕망이고, 나는 수락하고 선택한다. 끔찍하다.
_ 김현,『행복한 책읽기』
...
쓰고 보니 가슴 특집 같다. 가슴에 환장한 놈 같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게 오해입니다!
물론, 넌 참 가슴 좋아해, 이렇게 요약되는 말의 다채로운 배리에이션들을 사귀는 사람들로부터 참 많이도 들었고, 지금도 착실히 듣고 있다. 생후 일주일만에 분유를 먹어야 했던 불우한 성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프로이트 이야기는 꺼내 보지도 못했다. 그러고 보면 참 쓸모 없다, 그 할아범.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syo가 실제로는 꼭히 가슴이 아니라 그저 말랑말랑하거나 몰캉몰캉한 것이라면 어디든 좋아한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요즘은 가슴에 집착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편인데 사실 비결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잔악무도하다. 바로 팔뚝, 등, 배로 옮겨 간 것이다..... 내 생각에도 정말 악랄하다..... 난 좋은데, 말은 안하지만 차라리 가슴 시절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눈치다.
나보다 가슴 큰 여자가 나타나서 너 꼬시면 어쩔래, 하는 식의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어릴 적에는 많이 들었으나, 그녀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는 첫째로, syo는 사실 가슴이 어찌됐건 그런 건 모르겠고 무조건 귀여운 게 장땡이라는 극성진성귀여움성애자라는 것과, 둘째, 이게 더 크리티컬한 건데, syo는 사실 가슴이 크건 작건 있건 없건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살며 그 누구에게도 "꼬심"을 당해 본 역사가 없는 인간이며, 미루어보건대 그런 기조는 앞으로도 한없이 무한하게 이어질 것 같다는 슬픈, 내게만 슬픈 진실......
하지만 귀요미 멍멍이들은 어쩐지 syo를 좋아하지. syo도 멍멍이를 좋아하고. 그럼 된 거야.
으하하하하 그럼 된 거야........



심상정,『난 네 편이야』를 마침.
스기타 아쓰시,『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를 읽는 중.
발터 벤야민,『모스크바 일기』를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