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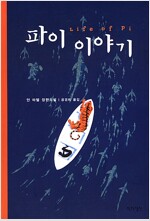

나만의 파리

“ 김수희가 부릅니다. << 너무합니다 >> ” 색소폰이 구슬프게 울리더니 김수희의 < 너무합니다 > 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 마지막 한 마디 그 말은 / 나를 사랑한다고 ~ ” 시작부터 타령’이다. 아니나 다를까, “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가세요 / 날 울리지 말아요 ~ /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 당신은 너무합니다. ”
떠난 남자에 대한 원망이 알알이 박힌 노랫말'이다. 노래 속 남자는 요샛말로 헤어지는 여자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고 떠나는 유형이다. 飛鳥不濁水 / 비조불탁수’ 라는 말이 있다. 날아가는 새는 노닐던 물을 더럽히지 않고 떠난다는 뜻이다. 여자가 남자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 정희진의 << 정희진처럼 읽기 >> 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꼭지’는 얀 마텔의 << 파이 이야기 >> 라는 소설에 대한 메모‘다. 제목은 “ 아무 인사도 없이 ” 이다.
1977년 7월 2일. 거대한 화물선이 침몰한다. 힌두교도이자 무슬림이며 크리스천인 파이라는 사연 많은 이름의 인도 소년과 250킬로그램짜리 뱅골호랑이가 227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다. 둘은 멕시코 해안에서 구조된다. 아니, 소년은 구조되고 리처드 파커(호랑이 이름)는 뭍에 닿자마자 근처 밀림으로 들어간다. 소설과 달리 영화는 사라진 밀림 입구를 두 번 클로즈업한다. 통증이 느껴지는 압권이다. 소년은 엉엉 운다. 살아남은 감격 때문이 아니라 7개월 넘게 함께 했던 리처드 파커가 뒤도 안 돌아보고 “ 아무 인사도 없이(so unceremoniously) ” 떠났기 때문이다. 운동 경기 때 득점을 해도 세러머니를 하는 게 인간인데...... “ 나는 그가 내 쪽으로 방향을 틀거라고 확신했다. 날 쳐다보겠지. 귀를 납작하게 젖히겠지. 으르렁대겠지.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매듭지을거야.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밀림만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더니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날 살게 했던 리처드 파커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 .... ( 중략 ) ... 인간이 급격히 외로워진 시기는 의미, 이성, 역사주의 따위를 앞세워 자연을 공격하면서부터다....... 사람은 인연 덕분에 산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스스로 부여한 의미일 뿐 자연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 아무 인사도 없이, 66~67쪽 中
한쪽은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인사 한 마디 정도는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망 섞인 말을 한다. 둘은 서로 상반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감정에서 파생한 넋두리이니 이심전심인 셈이다. 두 사람 모두 떠난 자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두 사람이 보기에는 둘 다 "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한 " 사람이다. 이 감정(들)에는 원망이 섞였으나, 어디 미움뿐이랴. 사무친 정에 대한 깊은 회한이 짙게 남아 있으리라. 정희진은 리처드 파커의 거시무언(去時無言) 장면에서“ 나도 그 장면에서 울었다 ” 고 고백한다. 나는 정희진의 말에 격하게 공감했다. 하지만 내가 이 소설을 읽은 것은 아니다. 영화를 본 것도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 파이 이야기 >> 는 톰 행크스가 열연한 << 캐스트 어웨이 >> 와 닮은 구석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50kg짜리 벵골호랑이 대신 250g짜리 배구공 윌슨’이 등장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지 않은가 ? 모래알이든 바윗덩어리이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이니 말이다. 척 롤랜드(톰 행크스)는 땟목 위에서 뜻하지 않는 일(폭우)로 망망대해에서 윌슨과 헤어진다. 척 롤랜드는 애타게 윌슨을 부르지만, 윌슨은 아무 인사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 리처드 파커(호랑이)처럼 말이다. 척 롤랜드의 쇳소리 나는 울음에는 서운함과 그리움이 묻어 있다. 그는 울면서 외친다. " 아'임 쏘리, 윌슨 ! " 떠나는 자에게 남겨진 자가 먼저 미안하다고 소리치는 것이다.
나도 이 장면에서 울었다. << 캐스트 어웨이 >>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2년 전 성탄 전야로 되돌아가야 한다.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250그램짜리 배구공이 아니다. 그보다 더 작은 2.5그램에 대한 이야기다. 작다고 눈물의 염도나 싱거운 것은 아니다. 모래알이든 바윗덩어리이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이니 말이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연이 길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서사이나, 웃으면서 읽어도 좋다.
깊은 밤, 티븨를 켰다. 오늘 같은 날은 볼 만한 영화'가 많지, 성탄 특선(特選)이니까 ! 이제 막, 끝났는지 캄캄한 화면에서 엔딩 타이틀이 느리게 올라가고 있는 채널을 발견했다. 곧이어 다음 상영작을 예고하는 자막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떴다. 캐, 스, 트, 어, 웨, 이. 문득 이 영화는 " 특선 " 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많이 양보한다고 해도 " 성탄 " 에 어울리는 영화도 아니었다. 함박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에 무인도에 갇힌 벌거숭이 사내의 1인 모노로그'라니 !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성탄과 특선에 어울리는 작품을 물색했지만 마땅히 볼 만한 작품은 없었다. 하는 수없이 << 캐스트 어웨이 >> 를 보기로 했다. 시작은 딱히 재미있지도, 그렇다고 지루하지도 않았다.
지루하다 싶으면 책을 읽다가 책이 지루하다 싶으면 영화를 보았다. 내가 영화에 집중하기 시작한 때는 " 배구공 " 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척 롤랜드(톰 행크스) 는 그 < 공 > 에게 " 윌슨 " 이라는 사람 이름을 부여한다. 그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빵이나 잼'보다는 " 친구 " 였다. 윌슨은 과묵한 친구였지만 척 롤랜드에게는 " 빵 터지도록 잼나는 친구 " 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혼잣말이 늘면 광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윌슨과 (혼잣말이 아닌) 대화를 한다. 그때부터 이상한 기시감이 들기 시작했다. 영화 내용'에 대한 데자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 속 어떤 체험과 연결된 정서'였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이내 풀렸다.
척 롤랜드가 망망대해'에서 " 윌슨 " 을 떠나보내는 장면'에서 나는 척 롤랜드'보다 많이 울었다. 꺼이꺼이 울었다. 엉,엉,엉,엉,엉...... 나는 척 롤랜드를 연기한 톰 행크스'보다 척 롤랜드가 당시 처했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내 눈물은 같은 아픔을 공유한 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연민이었다. 척 롤랜드에게 윌슨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크로넨버그'가 있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 자유로움의 상징이었던, 나만의 파리 ! 속초에서 < 1년 > 을 살았다. 내가 살던 곳은 m 모텔 105호 달방'이었다.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했으나 어느 순간, 우울증이 깊어서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다. 노트북 모니터는 항상 텅 비어 있었다. 커서는 인적이 드문 길 위에서 기름이 떨어져 멈춘 자동차처럼 제자리에서 깜빡거릴 뿐 나아가질 못했다.
불안을 동반한 불면이 깊어 갈수록 < 술 > 에 내 몸을 의지하게 되었다. 외롭고 낮고 쓸쓸했다. 이 낯선 타관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달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음을 소거한 채 낚시 채널을 시청했다. 유일한 낙은 낚시줄에 잡힌 대어를 보는 것이었다. 그때 날 찾아온 것은 " 파리 " 였다. 파리 한 마리가 내 달방으로 날아왔다. 당시 날씨는 겨울을 눈 앞에 둔 쌀쌀한 늦가을이었기에 파리가 살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한파를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견딘, 지상의 마지막 파리'였던 것이다. 늦가을 모기는 잡는 것이 아니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 내가 이 속담을 알게 된 계기는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에서였다. 나 또한 그 파리를 잡거나 쫓아낼 생각이 없었다.
둘째 날, 파리는 천장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다음날, 동네 마트에서 횟감을 사서 혼자 달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파리'가 내 주위를 윙윙 날아다녔다. 생선 냄새를 맡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며칠 동안 달방을 나간 적도 없고 창문을 연 적도 없었으니, 내가 며칠 전 본 파리가 분명했다. " 배가 고프겠구나 ! " 생선 회 한 조각을 바닥에 내려놓자 파리가 그 살점 아래 내려앉았다.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파리와 나는 달방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이름도 지었다. " 이제부터 넌 크로넨버그다 ! " 그렇게 보름을 함께 보냈다. 배구공을 보며 대화를 나눴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나는 침대에 누워 맞은편 천장에 붙어 있는 파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 어느 소설가가 그러더라. 전쟁터에 나간 병사는 누구나 살아남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살아서 제일 마지막에 죽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두려운 거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두려운 거다. 난...... 네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넌 두려운 거야. 이 지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파리이거든...... "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겨서 잠시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룰 수는 없었다. 파리의 끼니가 걱정되어서 꿀물을 사발에 가득 담은 후 달방'을 떠났다. 내가 다시 달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것은 파리였다. 하지만 파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얼어서 죽었니 ? 아니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거니 ? 몇 시간 동안 파리의 흔적을 찾아헤매다 지쳐서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났다. 두려웠다. 그 감정은 고독도 아니었고 외로움도 아니었다. 적군이 우글거리는 적지에서 혼자 살아남은 듯한 느낌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다니 살짝 배신감도 들었다. 그리고는 이내 피식, 웃음이 났다. 파리가 떠났다고 슬퍼하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
사람은 인연 덕분에 산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스스로 부여한 의미일 뿐 자연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정희진의 문장이다.
- 생각해 보면 안철수는 날지 못하는 새‘다. 문 박차고 세상 밖으로 멋지게 비상하고 싶었으나 날지 못하는 < 닭 > 인지라. 물 위에서 난다고 날갯짓만 하다, 물만 흐리고는 자맥질로 가까스로 연못을 빠져나간 꼴이다. (안철수 얘기는 여기서 그만 !)
- 파커와 파이 그리고 척 롤랜드와 윌슨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두 서사는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