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상통 ㅣ 시작시인선 49
김신용 지음 / 천년의시작 / 2005년 4월
평점 :

절판

환상통
김 신용
새가 앉았다 떠난 자리, 가지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다
나무도 환상통을 앓는 것일까?
몸의 수족들 중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듯한, 그 상처에서
끊임없이 통증이 베어나오는 그 환상통,
살을 꼬집으면 멍이 들 듯 아픈데도, 갑자기 없어져 버린 듯한 날
한때,
지게는, 내 등에 접골된
뼈였다
木質의 단단한 이질감으로, 내 몸의 일부가 된
등뼈.
언젠가
그 지게를 부수어버렸을 때,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돌로 내리치고 뒤돌아섰을 때
내 등은,
텅 빈 공터처럼 변해 있었다
그 공터에서는 쉬임없이 바람이 불어왔다
그런 상실감일까? 새가 떠난 자리, 가지가 가늘게 떨리는 것은?
허리 굽은 할머니가 재활용 폐품을 담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 끝으로 사라진다
발자국은 없고, 바퀴 자국만 선명한 골목길이 흔들린다
사는 일이, 저렇게 새가 앉았다 떠난 자리라면 얼마나 가벼울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창 밖,
몸에 붙어 있는 것은 분명 팔과 다리이고, 또 그것은 분명 몸에 붙어 있는데
사라져 버린 듯한 그 상처에서, 끝없이 통증이 스며 나오는 것 같은 바람이 지나가고
새가 앉았다 떠난자리, 가지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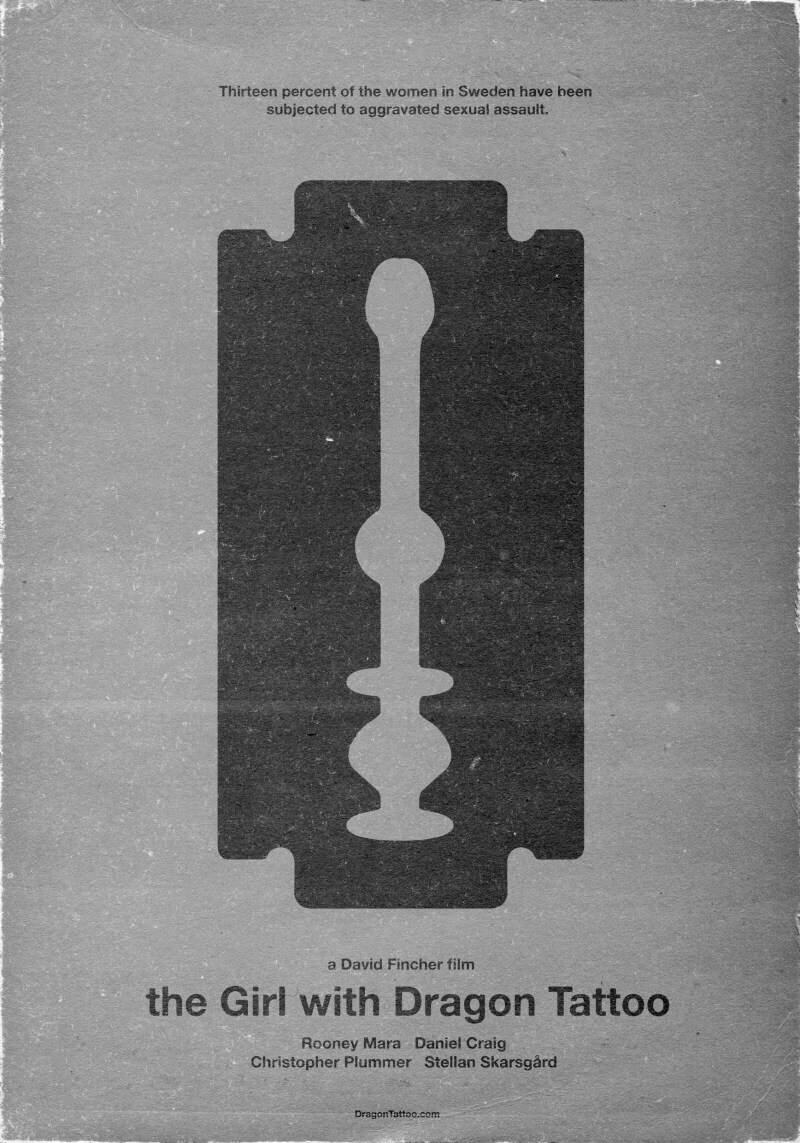
" 저기, 소금장수 지나간다 ! "
어리거나 여린 놈에게서는 젖비린내'가 난다. 간사한 놈에게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깡패처럼 독한 놈에게서는 피비린내가 난다. 하지만 정말 독한 놈은 단내'가 난다. 하혈을 하듯 눈물을 쏟아낸 자'만이 안다. 눈물은 짠 게 아니라 달다. 진한 꿀은 종종 쓰다. 김신용의 < 환상통 > 을 읽으면 입에서 단내'가 난다. 현대 시인들이 관념으로 허세를 부릴 때, 김신용은 독하게 쏜다. 누군가는 총천연색 칼라 같은 삶을 사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칼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의 시는 김연주의 시와 닮았다. 날것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다. 그들에게 시는 통증이다.
시인 김신용은 실제로 시장 지게꾼'이었다. 지게에 원단을 싣고 나르는 노동자'였다. ( 10대는 서울역 양동에서 앵벌이 생활을 했다. 아리랑치기'도 했다. 이 단어를 알고 있다면 당신은 거칠게 산 사람이다. 늦은 밤 어슬렁거리는 취객을 따라가 벽돌로 내리쳐 기절을 시킨 후, 지갑을 훔치는 일이다. ) 그런 그가 지게를 부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과 5범이었다. 내가 이 시를 읽었을 때 느꼈던 전율은 기시감'이었다. 대학 교단에서 심심풀이로 시를 쓰는 시인과는 달리 그의 시에서는 아주 지독한 달디 단 몸내'가 났다.
나 또한 서울역 양동에서 20대 초반을 보냈다. 내 친구는 아리랑치기범'이었다. 저녁에는 술을 마셨고, 밤에는 벽돌을 들었다. 주변엔 온통 앵벌이들뿐이었다. 러미날 먹고 환각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다. 문어처럼 흐느적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면 벌이가 쏠쏠했다. 누가 더 문어 연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벌이'가 정해졌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문어 새끼'이라고 조롱하고는 했다. 러미날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뼈가 녹았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적십자 구호 단체'였다. 잡히면 그들은 다리를 자르거나 팔을 자르거나 했으니깐 말이다. 그래서 앵벌이들은 경찰보다 적십자를 무서워했다.
내가 아는 앵벌이'는 종종 말하고는 했다. " 형, 우리 행불되진 말자 ! " 그들은 거리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행불이라고 했다. 행불이란 " 행방(행적)불분명 "의 약자였다. 거리에서 죽은 노숙자들은 대부분 행불 처리' 되었다. 경찰은 사건 기록지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 행불 > 이라고 적었다. 행불되지 말자고 말했던 그 친구는 동료 칼에 찔려 죽었고 그의 단짝 떠벌이 친구는 적십자에 끌려가서 다리가 잘렸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다.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 다리 하나 없으니 장사가 더 잘 돼 !!! "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늙고 병든 창녀들이 모이고, 그 창녀의 아이들이 자라고, 러미널을 먹고 쓰러지고....... 김신용의 시'는 그런 양동의 풍경을 시로 썼다. 그것은 나만이 알 수 있는 사인'이었다. 우리는 남대문 지게꾼을 소금장수'라고 부르거나 밀가루 부대'라고 놀렸다. 한여름 땀을 흘리고 나면 등짝에는 땀이 마르고 난 허연 백태 같은 소금기'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소태를 보며 깨달았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 아니다. 통증이다.
저기... 소금장수 지나간다.
■ http://myperu.blog.me/20168576423 : 옛날 신문을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