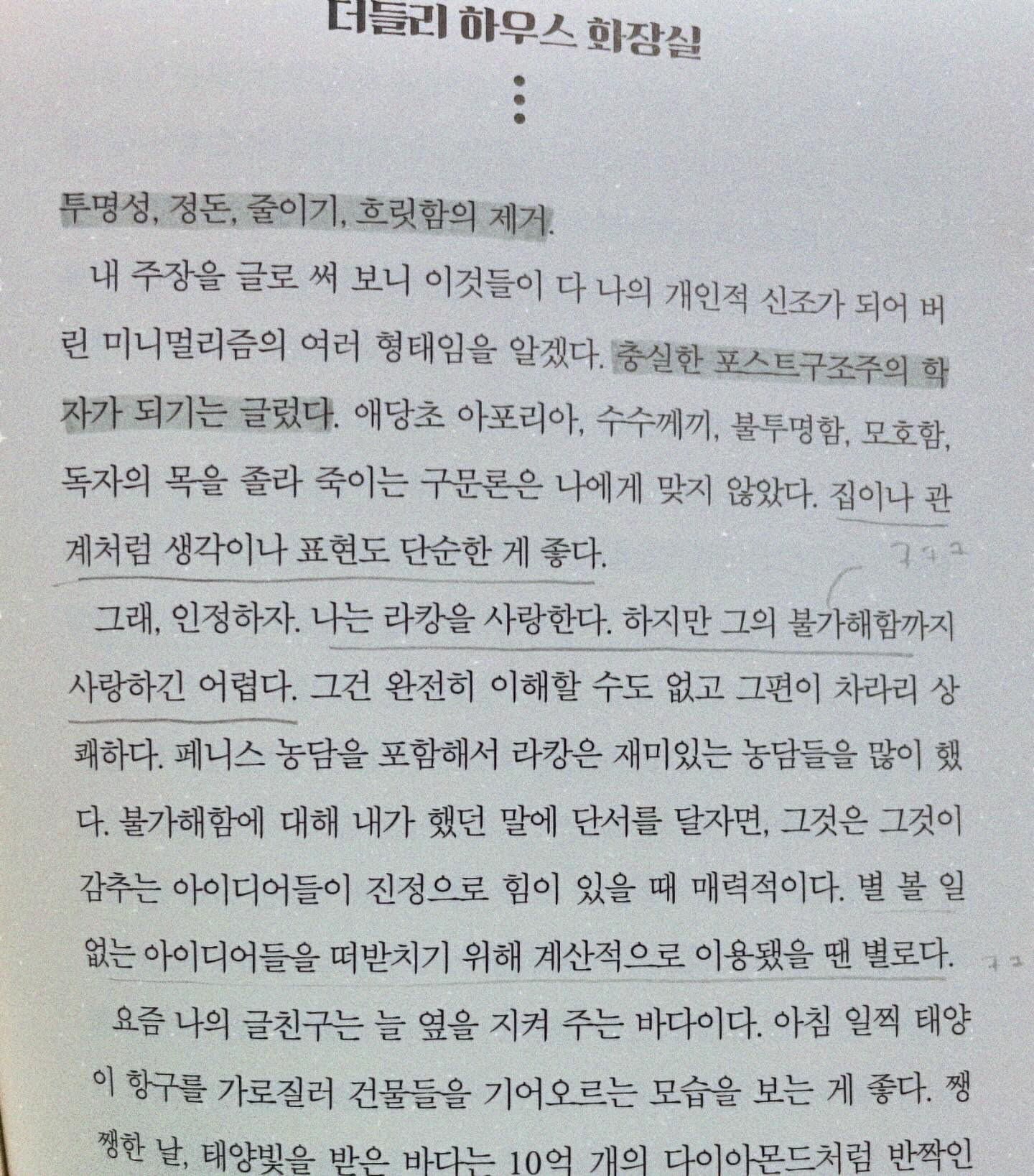-

-
남근선망과 내 안의 나쁜 감정들 - ‘명색이 페미니스트’ 마리 루티의 신랄하고 유쾌한 젠더 정신분석
마리 루티 지음, 정소망 옮김 / 앨피 / 2018년 12월
평점 : 


1. 푸코에서 (아렌트와 함께) 라캉으로
오랜만에 바나나 책 🍌
푸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르트르(내 경우 아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간극을 이렇게 써주는 사람은 #마리루티 밖에 없다. 푸코를 좋아한다. 물론 처음엔 무섭기까지 하고 어려운데ㅋㅋㅋㅋ 어느 시점을 지나면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 어찌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옹호 받는 것 같달까.
그런 의미에서 아렌트(보부아르, 어쩌면 사르트르)에게는 언제나 상처받는다. 읽다가 데인다. 입을 삐죽인다. 재섭다. 부럽다. 멋지다. 닮고 싶다. 존경한다.
결국 나는 루티가 말하는 #푸코주의자 에 가깝다. 그것이 결정론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 연민할 수 있는 여지를 옹호하기 때문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 대해서…… 희망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미학적 감각, 혹은 에토스랄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 이해하려는데 있어 나는 여전히 심각한 구조주의자다… 🤔 남 탓, 책임회피의 무의식일지도…
헌데 이게… 내 명랑의 근거일지도 모르겠다고 요즘엔 그렇게 느끼고 있다..
(안궁금하겠지만….) 밑줄의 꺅에 코멘트하면 무의식-프로이트(요즘은 라캉)는 내 일기와 읽기의 시작 지점이며 코어다. (자기분석) 정신분석연한 이이들이 제안하는 자유의 대가는 불안이다. 어느 시기의 얼마간은 그 불안을 견뎠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내공이 쌓이면 불안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너무 바쁘고 나는 안 익숙해져서…. 걍 푸코푸코거리며 사회 욕하는 랩하면서 산다…. 왈왈!!ㅋㅋㅋ 문득 루티 선생님이 그리워서 펴봄. 아아… 라깡 읽어야 할텐데요…
2. 글쓰기와 잊어버리기
라캉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도 명료한 루티를 사랑한다. 라캉의 의도의 천재적임과 그리하여 천재임을 따라잡아 읽기에는 번역과 해석이 필요하고. 읽을 겨를이 없는 사람들에겐 복잡한 코스 요리를 밀키트로 정리해주는 (아마도 내 기억에 의거하면 친구의 표현이다) 루티가 딱이다.
나를 상처주는 것들을 글씨로 가둬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어서 썼다. 되도록 분명하게 쓰고 싶었지만 언어는 부족했고 의미는 여분이 남았다. 누구도 정말로 읽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 언어의 한계일 테지만. 그리하여 각자는 각자를 정말로 읽어버린다. 텍스트 어쩌면 극도의 사회성. 거기에 배팅.
글쓰기의 기능이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효험을 지닌다는 건 알겠지만, 그것을 긁어파는 것만이 작가 정신이며 진짜 인생이며 글이란는 식의 언사는 혹독하게 느껴져서 경계한다. 치열하게 쓰인 밀도 높은 책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일상은 가벼운 것들과 축축한 것들과 달달한 것들과 슴슴한 것들 모두를 포함하고… 글 역시 그 모두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가서. 덮어두고 사는 것, 그냥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 했었다. 그래도 된다. 그러나 같은 밀도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쓸까 말까. 읽을까 말까. 그 사이에서 삶을 구축하고 있다. 의도한 건 아니다. (의식은 했지만.) 나는 잊지 않고 싶었고 똑똑히 기억해두고 싶었으며 파헤쳐 해석해보마 싶었다. 그러나 기억의 과잉.이 실존을 해칠 때. 쉬어. 잊어. 책의 마지막, 루티는 니체를 그런식으로 읽어보기를 권한다. 잊어버리기. 어려운 것을 잊어버리기로 극복할 것. 오늘은 거기에서 눈이 멈췄다.
#마리루티 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 아니다. 그의 사유와 문장들은 내 안에서 잔잔하게 고동치고 있다. 즉슨 내 안에 살아있다. 죽은 사람들의 책을 읽는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쓴 일기들을 읽는다. 만난 적도 없는데 그립다. 그리울 때가 있다.
덧붙임.
옛 슬픔을 밀어내는 새로운 열정들이 생기는 소식에 나도 같이 생기있어진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혹은 잊지 않고) 이 다음의 열정을 좇는 것이 무의미한 반복강박이 아님을 루티에게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