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는 나의 찬란한 고통
너는 나의 찬란한 고통
아, 마음이 급해. 지난주 토요일 경향신문의 북섹션을 사정상 어제 일요일에야 읽게 되었는데, 대부분 한 두권의 책들을 메모해두곤 했으나 이번에는 한 두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메모장에 적어두려다가 페이퍼로 급전환.
일단, 『나는 한국의 야생마』. 이 책은 이 책에 실린 그림 한장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문을 인터넷으로 뒤져 그림을 가져올까 하다가 너무 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보던 신문을 찍어버렸다.

오와..뭔가 낙원의 이미지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 그림책은 농장을 나와 야생마가 된 말들이 인간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그렸다.(경향신문 2012년 2월 25일 토요일 16면)'

아.. 책 표지는 뭔가.....뭔가.....너무.......말 스러워;; 어쨌든 저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영화 『킬러 엘리트』가 생각났다. 재이슨 스태덤은 호주의 한 드넓은 농장에서 자신이 살 집을 손수 짓고, 그의 옆에 말을 탄 여자가 찾아오는 그 장면. 여기가 바로 그곳인것만 같은거다. 나는 재이슨 스태덤을 찾아 갈테다. 말을 타고 갈테다.
또 하나의 책은 '데이비드 맥페일 그림과 글'의 『안 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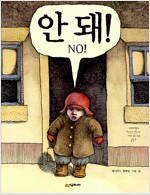
경향신문에 실린 소개글로 옮겨보자면,
한 아이가 정성스레 쓴 편지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간다. 바깥세상은 미사일, 탱크, 군인, 경찰 등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침내 다다른 우체통 앞에서 아니는 자신을 때리려는 소년에게 "안돼!"라고 외친다. 이 두 글자가 이 책에 나오는 유일한 글이다. 소년이 부당한 폭력에 대해 "안돼"라고 외치며 당당히 맞선 이후 돌아오는 길, 세상은 달라져 있다. (경향신문 2012년 2월 25일 토요일, 16면)
아직 조카에게 보여주기엔 이른감이 있는것 같다. 그런데 나는 궁금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사서 내가 먼저 볼 생각이다. 안돼, 라는 두 글자만이 책이 나오는 유일한 글자라니. 그것만으로 어떻게 뜻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알아챌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으로 부당한 폭력에 대해 안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뭉클해져서 천천히 그림책을 넘겨 볼 생각이다.
자, 이제 소설이다. 꺅 >.< '이응준'의 『내 연애의 모든 것』이란다. 그런데 일단 신문에서 뽑아낸 타이틀은 이렇다.
'사랑에 빠진 여야 국회의원의 금지된 로맨스를 상상하다' 읭? 이게 뭐야? 난 몹시 .. 몹시.. 비호감 상태가 된다. 신문에 실린 줄거리도 그저 뻔한 로맨스 소설과 다를바가 없는것 같다. 더 유치하면 더 유치했지 덜하진 않을것 같단 말이다.

그래서 흐음, 패쓰야,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응준' 이라는 이름이 걸리적 거리는거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뭐지? 그래서 비호감인듯한 책 이야기를 끝까지 읽는데, 거기에서 나는 왜 걸리적 거렸는지 원인을 찾아냈다. 그렇다. 이응준은 시집을 냈던거다. 내가 산 시집. 『낙타와의 장거리 경주』가 그것.

아아, 이 시집은 무릎 꿇었다는 바로 그 구절이 나오는 시가 들어있는, 바로 그 시집이 아닌가!
4월
내가 기차같이 별자리같이
느껴질 때
슬며시 잡은 빈손을 놓았다.
누군가 속삭였다. 어쩔 수 없을
거라고. 귀를 막은 나는
녹슨 피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너의
여러 얼굴들을 되뇌었다.
벚꽃 움트는 밤 아래
무릎 꿇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의 소설이라면 아무리 유치한 내용이라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 나는 '사랑에 빠진 여야 국회의원'이라는 유치하고도 유치한 타이틀에 두 눈을 딱 감고 이 책을 선택하기로 했다. 벚꽃 움트는 밤 아래 무릎 꿇었다, 어쩔 수 없었다, 에 어쩔 수 없게 되어버린거다. 어쩔 수 없었다.
또 한권은 '요 네스뵈'의 『스노우맨』이다.

이야기는 첫 눈이 내리는 오슬로의 풍경으로 시작된다. 그날 저녁, 퇴근한 엄마는 정원에 선 커다란 눈사람을 칭찬해준다. 하지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우린 눈사람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눈사람이 왜 우리 집을 보고 있어요?"
눈사람은 대개 집을 등지고 길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집 안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듯 창밖에 선 채 가족을 향해 집요한 시선을 던지는 눈사람의 존재에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날 밤 엄마는 사라진다. 아이가 엄마에게 선물한 소중한 목도리는 눈사람의 차가운 목에 둘러진 채 얼어붙고 있었다. (알라딘 책소개中)
경향신문에서 보다가 내가 꽂힌 부분은 눈사람을 만들지 않았는데 눈사람이 세워져 있다는 것. 마치 사탄의 인형의 처키가 생각나지 않는가. 게다가 엄마가 사라진다. 오! 궁금하다. 그런데 엄청 무서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어쩌지, 살까 말까, 계속 고민 고민. 무서울 것 같고 그렇지만 재미있을 것 같고. 흐음.
마지막으로 한 권 더. (아 이번 경향신문의 북섹션은 정말 유익하다.ㅠㅠ)

표지나 제목만으로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데, 책 소개를 보면 이렇다.
늘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한 번도 식당에 가본 적 없는 젊은이, 외도한 남편을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어느 밤, 크루즈 갑판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난 행복해"라고 말하는 아내, 자신을 수줍음 많고 우울한 성향으로 태어나게 한 아빠를 원망하는 딸 등 껍질을 두른 조개인간들의 몽환적이지만 쓸쓸한 아홉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알라딘 책소개中)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다. 내가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심히 관찰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나 역시 식당에 갔을 때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채로 그냥 내 밥을 먹지 그 사람들을 둘러보진 않으니까. 그러나 불과 몇년전까지의 나도 혼자 밥 먹는걸 꺼려했었다. 혼자 밥 먹는것만큼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 초콜렛을 사 먹거나 단 커피를 사 마시거나 했던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한 번 혼자 밥을 먹어 보니, 오, 이렇게 편한게 없다. 혼자 쇼핑하고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산책하는게 편하다는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혼자 밥 먹는것도 정말 최고로 편하다. 내가 먹고 싶은걸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을 수 있다. 메뉴 선정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게다가 속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최고다 최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또 스맛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건 정말이지 결코 외롭지 않은 오히려 충만한 일이다. 이 책속에서의 저 젊은이가 그래서 결국은 혼자 밥을 먹게 되었는지 어떤지 궁금해진다. 또한,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10년이 지나도 떠올리는'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극복되는게 아니니까. 아주 오래 때로는 눈감기 전까지도 지속되니까. 이거랑은 별 상관 없는 얘기기는 한데, 나 때문에 받았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는채로 가끔가다 툭 내뱉는 사람도 이 소개글을 읽다가 떠올랐다. 내가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심히 넘기려고 하지만 나라고 할말이 없는건 아닌데. 지겹고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토요일의 대전터미널 영풍문고에서는 이 책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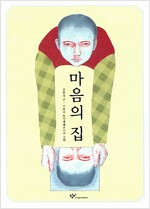
무슨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마음에 대해 설명해주기에도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딱히 와, 이 책 좋네, 하는 생각은 들질 않더라. 마음에 대한 설명이 내게는 식상하게 느껴졌지만 아이들에게 설명하기에는 편하고 좋을것 같다. 그래서 조카에게 사줄까 어쩔까 망설이다가 보류하기로 했다. 아직 단어 몇 개밖에 말할 줄 모르는 19개월된 아가에게는 좀 이른 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본 책은 파본이었다. 31페이지가 반복된다. 31-35 페이지가 두번씩 있다. 나는 들고가서 계산하는 직원에게 설명하고 이 책을 건넸다. 진열되어 있는 다른 책은 괜찮던데 내가 본 책만 그런 것 같았다. 이런식의 파본이 단 한권만 찍힌건 아닐텐데. 창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원하는 책을 찜해 두었으니 중고샵에 팔아야 할 책들을 좀 선정해내고 적립금이 모이기를 기다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