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남극엘 갔다.
남극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었는데 참 이상하네, 남극엘 갔다. 그런데 남극에 간 것도 일요일 오후에 갔다. 헬리콥터를 타고 혼자 갔는데 금세 도착했다. 후딱 다녀오자, 하고는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그냥 남극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배들과 어떤 기지 같은 것을 보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와- 일요일에 남극 가서 남극 바다위 사진을 찍다니, 대단한데? 해가 지고 있어 붉은 빛을 배경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 나온 거다.
내가 보고 있는 바다 앞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내 꿈 속의 남극 바다는 말 그대로 해변가였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했다. 집에 가서 자야 다음날인 월요일 출근을 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헬리콥터를 다시 타야 하는지 몰랐다. 집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은데 그런데 어디에서 헬리콥터를 타야 하지? 아주 큰 빌딩이 있길래 거기에서 누군가는 그걸 알겠지 싶어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그 자기계발 강의로 유명한 김미경 강사가 있는 게 아닌가. 남편이 남극에서 일한다고 했다. 나는 그분께 한국으로 갈 헬리콥터를 타야 하는데 어디에서 몇 시에 탈 수 있나요, 했더니 지금 당장은 없고 앞으로 두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어디서 타는데요? 했더니, 그건 올드타운 에서 탈 수 있으니 올드타운으로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올드타운은 어떻게 가는데요? 그건 모르겠으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서 가라고 좀 짜증을 냈다. 하는수없이 일단 나는 그 큰 빌딩을 나왔다.
나와서 돌아다니다보니 사람이 보여 올드타운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 저기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했다. 감사하다고 거기 가면 한국 가는 헬리콥터를 탈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럴 수 있을거라고 그런데 오늘도 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국에 가야 한다는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렸는지 한 명 두 명 내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국에서 온 운동선수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다. 혹시 여기 한국 가는 분 또 안계시나요? 물었지만 아무도 한국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알려준대로 올드타운으로 갔다. 올드타운은 각 나라별로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었다. 맞다, 남극이었다. 그리고 기업은행도 있었다. 나는 거기 익숙한 한국 길거리 음식과 은행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는 헬리콥터를 타고 한국에 가야한다고,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거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초조했다. 저 갈 수 있는걸까요? 저는 왜 일요일에 갑자기 남극엘 오고 싶었을까요? 한 사람은 '좀 미친 것 같은데요?' 했다. 그쵸? 하아- 그냥 집을 나서서 잠깐 남극에 다녀와야겠다, 생각하고 나왔어요. 오긴 잘왔는데 이제 돌아가는 게 문제네요..
나는 왜 남극에 갔을까?
잠에서 깬 후,
1. 월요일 회사 가는데 지장 없으니 꿈이라 다행이다
2. 남극에서 멋진 풍경을 본 것이 꿈이라니 안타깝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출근하는 길에 네이버로 남극 바다를 찾아보았다. 남극 바다는 너무너무 춥다고 했다. 바다 위로는 얼음들이 보였고 빙하들이 떠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았던 그 남극이 아니었다. 어휴, 안가길 잘했다. 갔다가 너무 추울 뻔했어. 그렇다면 남극에 간 꿈은 왜 꾸었나 꿈해몽을 찾아보았다. 일상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거란다. 낯선 곳으로 ㅋㅋ 아니 이게 근데 꼭 남극일 필요가 있는거냐고. 꿈해몽 좀 이상한듯 ㅋㅋㅋㅋㅋ 아무튼 남극에 다녀왔다 출근했다.
책을 샀다.

그간 인스타에 책탑 사진을 올리면서 '한주간 도착한 책들' 이라고 올렸었는데, 어제는 문득 이 '도착'이라는 단어가 거슬렸다. 도착하려면 책들이 자기 의지를 가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내 책들은 저들의 의지로 내게 온 게 아니라, 나의 경제력으로 내게 온 것인데. 그래서 어제 인스타에는 '소소한 책구매' 라고 올렸다. 왜냐하면, 소소했잖아, 지난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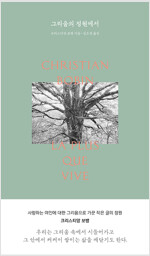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는 터키의 국민 작가, 야샤르 케말의 작품. 아마도 기억이 맞다면, 나는 시사인에서 장정일의 독서일기를 읽다가 이 책을 장바구니에 넣었던 것 같다. 표제작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는 납치혼과 명예살인에 희생되는 여성의 삶을 아이의 시선을 통해 보여준다고 한다. 아이의 시선이라니, 그 점이 감당 힘들것 같지만, 여성의 부당한 삶에 대한 터키 국민 작가의 책이라니 읽어봐야겠다.
《사라진 소녀들의 숲》은 허주은 작가의 작품. 얼마전에 작가의 《붉은 궁》을 재미있게 읽고 작가의 다른 책도 읽고 싶어져서 구매했다.
《프랭키스슈타인》을 이 페이퍼에 넣기 위해 검색하는데 프랭키슈스타인으로 넣고 검색이 안돼서 뭐야 왜 안돼, 하고 내 구매이력을 보니 프랭키스슈타인 이었다. 지금 쓰면서도 또 헷갈려. 이렇게 지독하게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오래전에는 '스튜어디스' 와 '스튜디어스'가 너무 헷갈렸는데, 이에 대해 알라딘에 언급하니 한 알라디너가 '남자는 스튜어드' 이니 남자를 외워두면 스튜어디스는 외워질 것이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랬다. 그러자 정말로 이제 안헷갈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 하면 그렇게 똑같이 말해줄 수 있었다.
아직도 '디아스포라'와 '디스포리아'는 헷갈린다. 아 정말 너무 헷갈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외워지질 않으니 대환장인데, 프랭키스슈타인은 직접 샀는데도 자꾸 프랭키슈스타인 이라고 머릿속에 기억된다. 어쩌쥬 ㅠㅠ
단어들만 헷갈리는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틸다 스윈튼과 케이트 블란쳇이 잘 구별이 안된다 ㅠㅠ 일전에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간다> 보고 나와서 친구에게 '틸다 스윈튼은 1인 2역을 했네' 라고 해서 친구를 뜨악하게 만들었다. 조쉬 하트넷과 에던 호크도 구별을 못해서, 향수 사러 갔다가 남자 향수 모델 보고 '오 에던 호크 오랜만이네요' 했더니 직원이 '조쉬 하트넷' 이에요 한 일도 있다. 아, 어쩐지. 에던 호크가 남자 향수라니 이 시점에 갸웃하긴 했었다만. 이게 지독하게 헷갈리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나 브리 라슨 볼 때마다 존 시나 생각난다.. 하아-
아래는 영화배우 브리 라슨

아래는 WWE 레슬링 선수 존 시나

그래서 브리 라슨에게 잘 몰입이 안됩니다. 미안합니다 ㅠㅠ
어쨌든 프랭키스슈타인은 알라딘의 폴스타프 님 리뷰 보고 샀다.
《그리움의 정원에서》는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품. 사실 크리스티앙 보뱅 책 몇 권 읽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다고 생각햇는데, 얼마전의 잠자냥 님의 글에서 이 책이 보뱅이 사랑하는 여성에 대한 글이라고 해서 오오 뭐라고? 해서 부러 급박하게 읽었다.
얼마전에 페이퍼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작가들은 천착하는 주제가 있고, 천착하는 주제를 가진 작가들이 좋은 소설을 써낸다고 나는 생각한다. 천착하는 주제가 아닌, 보편적인 주제를 가진 작가들은 베스트셀러를 쓰고. 여기서 베스트 셀러 앞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을 수식하면 그 말이 참이다. 그러나, 천착하는 주제를 가진 게 어디 작가뿐인가. 나는 독자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좋아하는 작가 취향이라는 것도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천착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전완근과 등근육... 이 아니라,
한결같음, 기다림, 그리움 인것 같다. 내가 천착하는 주제가 딱히 둘이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는 아닌 것 같고. 보뱅의 《그리움의 정원에서》는 내가 천착하는 주제를 담은 그런 책이어서, 보뱅의 그간 책들보다 내게는 더 잘 맞았고 좋았다. 그렇지만,
같은 주제라고 해도 나라면 보뱅처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역시나, 너무 좋기는 했지만 뭐랄까..
오래전에 건대 호수에 데이트 하며 갔던 일이 있었다. 밤이었고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는데, 호수 옆의 건물이 물 위에 유화처럼 보이고 있었고, 그게 너무 아름다워 감탄했더랬다. 그러자 이 호수로 나를 데려온 남자는 이걸 보여주고 싶어 데려온 거라고 했다(그 남자 건대 졸업했던가? 모르겠네?). 오, 여기는 데이트 하기에 좋은 장소구나.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 나는 다른 남자를 데리고 그 호수를 찾아갔다,
는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보뱅의 글은 그 때 건대 호수에 비친 유화의 느낌이다. 너무 아름다워 감탄이 나오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는, 뚜렷하지는 않은 그런 상이랄까. 내가 쓰는 글,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글은 분명하고 뚜렷한 글이다.
좋은 건 나누고 살자.
건대 호수 얘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페이퍼를 쓰면서 생각했다.
책은 앞으로 한 주간 네 권만 사자.
페이퍼에 딱 맞춤하게 들어가고 책 산 이유 쓸 때 짜증도 안나네. 네 권만 사자!!
헉.
보쓰 오늘 오후에 자리 비울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취소됐대.
이 말 들으려고 남극 갔다왔니? 흑흑 ㅠㅠ
릴렉스, 좋은 걸 생각해보자. 좋은 걸.. 좋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