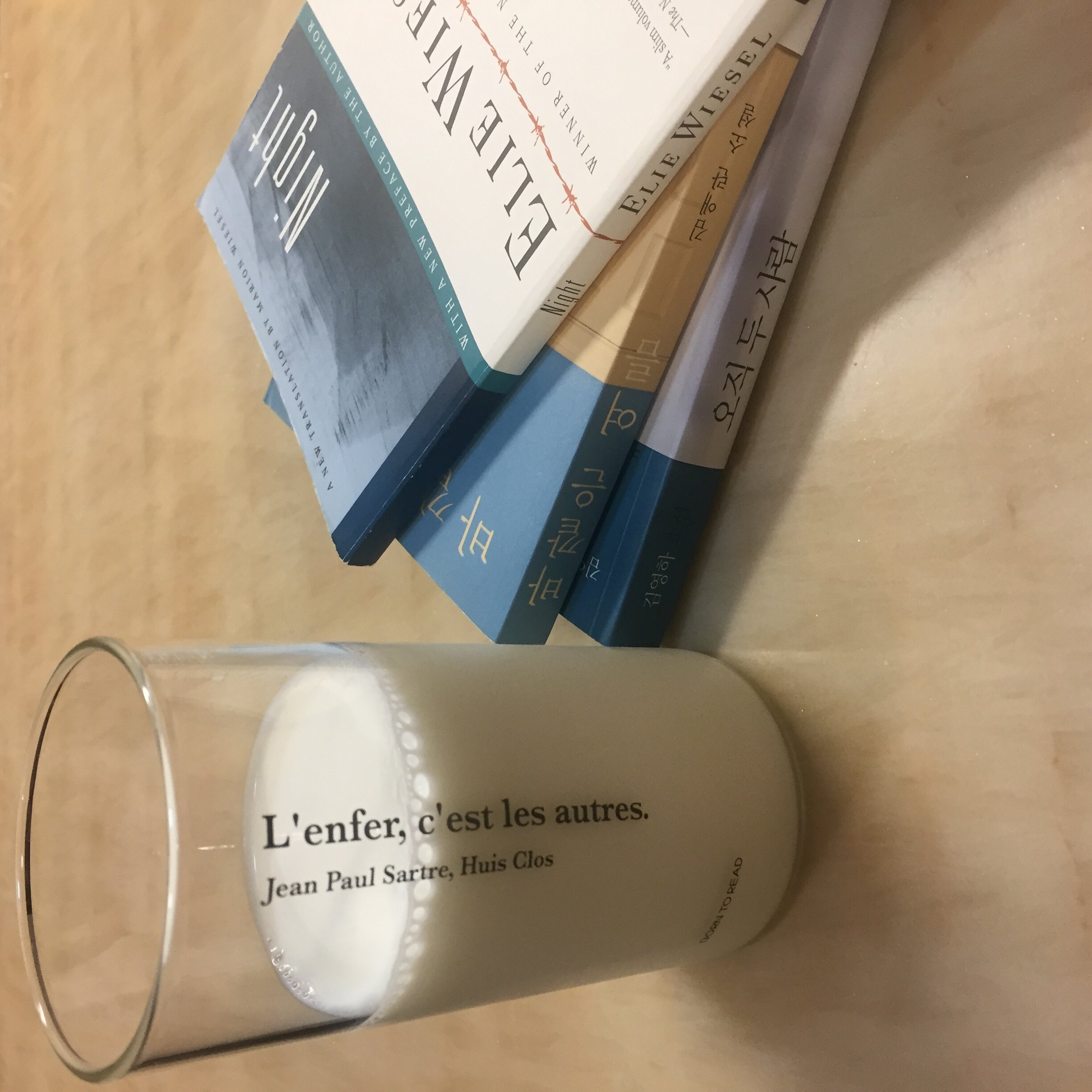병원에 있으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다른 가족들과 있었던 일은 잘 떠오르질 않아요. 엄마도, 오빠도, 그리고 동생인 현정이도 희끄무레한 안개 속에 묻혀 있는 것만 같아요. 기억 속에서는 아빠와 저, 오직 두 사람만 도드라져요. 그때 아빠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선물을 사왔는지 다 생생해요. 다른 가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거야. 아마 옆에서 웃고 있었을 거야. 아마 집에 없었을 거야. 그들은 모두 ‘아마’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14쪽)
몇 회였던가. <알쓸신잡>에서 김영하는 문학 또는 소설의 역할이 감정을 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은 소설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거나 감춰두지 않는다고 했다. 감정을 전하고 싶다고, 감정을 전하기 위해 쓴다고 말했다.
<오직 두 사람>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감정이라면 울분이다. 울분. 답답하고 분함 또는 그런 마음. 화자가 바보 같다고 여겨질 때도 여러 번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린애 같을까.
내 인생은 뭐가 남았지? 아빠와의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 공부해서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아빠가 권해준 전공을 선택했고, 주말마다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보란 듯이 예술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되지 못해 늘 미안했고, 아빠가 친구들에게 자랑할만한 직업을 갖지 못해 언제나 부끄러웠어요. (32쪽)
아빠가 원하는 대로 노력하는 인생. 아빠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 아빠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남자 친구하고나 할 만한 일을 아빠와 하나하나 해나가는 인생. 아빠의 기분을 헤아리고,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먼저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인생. 본인이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아프고 힘든 시간을 얼마만큼 보내고, 아빠를 피해 미국까지 도망쳐서야 ‘이젠 아빠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인생. 아빠와 진짜 이별한 후에야 인생의 또 다른 발걸음을 준비하는 인생. 무언가 처음으로 해 보려는 인생.
아빠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겠다고 결심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를 맞이하는 장면은 김애란의 단편 <건너편>의 그 장면과 꼭 같다.
『바깥은 여름』

도화가 이별을 준비할 때면 두 사람 사이에 꼭 무슨 일이 생겼다. 이수가 새 직장의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도화가 승진을 하거나, 이수의 생일이거나, 누가 아픈 식이었다. 미래를 예측해 결론 내리기 좋아하는 도화는 벌써부터 오늘 하루가 빤히 읽혀 울적했다. 과음한 이수는 하루종일 앓을 것이다. 술과 담배 냄새로 이불을 더럽히고 땀에 전 몸으로 오후 느지막이 일어나 두통을 호소하겠지. 그러다보면 우리는 오늘도 헤어지지 못할 것이다. (94쪽)
『나이트』,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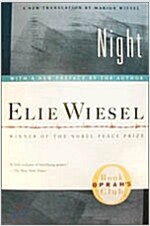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이 책도 생각난다. 나치 강제수용소에 이송되었다가 간신히 살아난 엘리 위젤의 자전 소설 『나이트』다. 같이 수용소로 끌려온 엘리의 아버지는 병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갈증 때문에 계속 물을 찾는 아버지는 엘레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른다. 시끄럽다고 독일 병사에게 맞게 될까 두려워,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엘레는 아버지의 애달픈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데...
I woke up at dawn on January 29. On my father’s cot there lay another sick person. They must have taken him away before daybreak and taken him to the crematorium. Perhaps he was still breaking . . .
No prayers were said over his tomb. No candle lit in his memory. His last word had been my name. He had called out to me and I had not answered.
I did not weep, and it pained me that I could not weep. But I was out of tears. And deep inside me, if I could have searched the recesses of my feeble conscience, I might have found something like: Free at last! ... (112쪽)
아버지는 지옥 같은 세계에서 나를 보호해준 유일한 존재이고, 또한 현재는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힘이다.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종교적 신념 혹은 사회적 약속 그 자체이며, 이름을 아는. 또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어떤 ‘신’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아버지와 영영 이별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마침내, 자유다!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는 존재 자체가 억압이다’라고 말했더니, 친구는 화를 냈다. 부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왜 부모가 억압이냐고 했다. 친구 말이 맞다. 친구네는 부부 사이가 각별하고, 가족끼리 터놓고 이야기하고, 공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일에 관해 아이들에게 강압하지 않는다.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서로를 좋아하는 유쾌한 분위기의 가정이다. 그러니 ‘부모는 존재 자체가 억압’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나로 말하자면, 컴퓨터 화면을 굳이 온몸으로 가리는 큰애 때문일 수도 있겠고, 학교에서의 일을 물을 때마다 “네, 아니에요~”를 연발하는 둘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나를, 나의 존재를 억압으로 느낄 수 있다고, 그렇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사람이며, 오늘 내가 넘어서야 할 사람. .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이며, 그 사랑에 근거해 내게 희망을 품는 사람.
나의 장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때는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떨어져 있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이기는 사람이자,
결국에는 나에게 지게 될 운명을 가진 사람.
김영하는 어떤 감정을 전하기 위해 소설을 쓴다고 했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서 난 답답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부모라는 억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