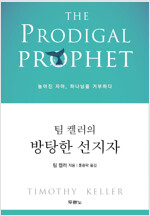고미숙 선생님은 하루와 일년의 순환과 상생이 그러하듯 인생 또한 봄-여름-가을-겨울의 순환대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하셨다(『나이듦수업』, 29쪽). 사랑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죽음을 이러한 순환의 한 지점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죽음과의 대면을 초연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진 직선의 시간관,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죽음은 이전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하나의 문이다. 죽음을 통해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변신한다. 형태를 볼 수 있는 유기체에서 또 다른 존재로의 전환. 이 모든 상상과 믿음의 근간은 ‘의미’다. 나는 내가 우주의 먼지이며, 별의 일부임을 인정하지만, 알 수 없는 화학물간의 의미 없는 조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의미에 대한 강박. 의미에 대한 집착이 한사코 나를, 나이게 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죽으면 다 끝이라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화면을 보며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담당교수는 내 나이쯤으로 보인다. 하얀 얼굴의 주치의는 스물 일곱. 앳된 얼굴의 간호사는 그보다 훨씬 더 어릴 것이다. 담당교수와 주치의, 담당간호사는 모두 우리에게 ‘선생님’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사기와 수액, 이름 모를 치료제와 진통제, 맥박, 호흡, 그리고 자가호흡률을 알려주는 기계와 기계들.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이 모든 치료 과정에서 소외된다. 침상 위의 몸뚱이는 예전 그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담당교수와 주치의, 그리고 담당간호사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무력할 뿐이다.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처럼 책을 읽지 않았다. 책읽기의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책을 읽지 않았다. 책상, 식탁, 김치 냉장고 위에 쌓인게 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책을 읽지 않았다. 글을 한 줄도 쓰지 않았다. 이전에는 돈을 받고 글을 썼던 사람인 것처럼. 이젠 돈을 받지 않게 됐으니 글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알라딘서재에 청탁을 받아 글을 썼던 것처럼,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아무런 글도 쓰지 않았다. 변명거리가 생겼으니 이제 이 일들에서 완전히 놓인 것처럼. 오랫동안 얽매였던 무거운 의무에서 이제 막 놓인 사람처럼.
그러다 다시, 책을 읽게 됐다. 살금살금.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씩. 한 권 또 한 권.
중환자실 면회는 20분씩 하루에 두 번, 두 명만 가능해서, 가까운 친척분이 면회를 오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오전에는 며느리들 오후에는 아들들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오전오후 면회때마다 병원에 갔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 차라리 병원에 가는 게 나았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 일이, 이 기다림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됐던 네째 주부터 저녁 면회에 가지 않는다. 집이 엉망이다. 김밥에, 컵밥. 아이들 밥도 잘 차려주지 않고 있는데, 다시 살아야해서, 그래서 책을 읽는다.
머리가 복잡할 때, 답답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책을 읽는다. 속상할 때, 허전할 때, 막막할 때 책을 읽는다. 책을 전혀 읽지 못 했던 지난 몇 주 보다 책을 읽기 시작한 요 며칠이 더 암담한 때인지도 모르겠다. 책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지 30일째다.
시간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