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기본 설정은 ‘받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한다. 학교 알림 말고 받는 알림은 겨우 몇 개 뿐이다. 그 중에 하나가 알라딘 알림이어서 아침마다 ‘시요일’ 알림이 온다. 보통은 읽어보지도 않고 ‘지우기’를 누르는데(담당자님, 보지 마세요), 그 날은 자꾸 마음에 걸려 ‘보기’를 누르고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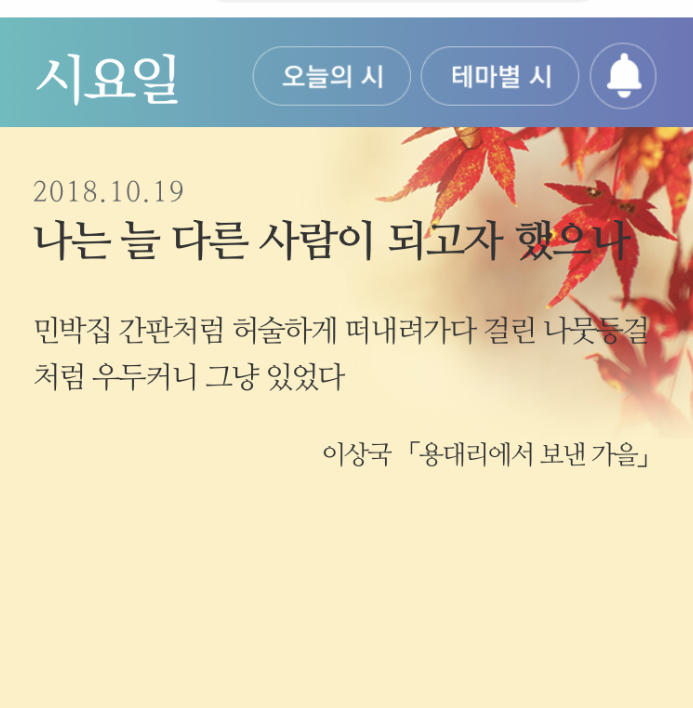
검색을 통해 이 시가 『뿔을 적시며』라는 이상국 시인의 시집에 수록된 시라는 걸 알게 됐다.
(생략)
나는 늘 다른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여름이 또 가고 나니까
민박집 간판처럼 허술하게
떠내려가다 걸린 나뭇등걸처럼
우두커니 그냥 있었다
이 촌구석에서
이 좋은 가을에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번 일러줬는데도
나무들은 물 버리느라 바쁘고
동네 개들도 본 체 만 체다
지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나도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소주 같은 햇빛을 사발때기로 마시며
코스모스 길을 어슬렁거린다
(이상국, <용대리에서 보낸 가을>)
맘에 콕 박힌 구절은 ‘나는 늘 다른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였다. 내가 상상하는 의미에 더 가까운 시구는 아마도 유진목 시인의 이 구절이 아닐까 싶다.

나는 일생을 다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을 겁니다 무엇이 나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까 … (유진목, <밝은 미래> 중에서)
나를 아는데도, 이제 내가 나를 알고 있는데도 내 안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소리친다. 욕심과 욕망, 그리고 탐욕, 이렇게 욕 삼종세트는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이상국 시인의 시를 읽으며 유진목 시인의 시구절을 떠올린다. 눈으로는 다시 이상국 시인의 시를 따라간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번 일러줬는데도
나무들은 물 버리느라 바쁘고
동네 개들도 본 체 만 체다
욕 삼종세트에 매여 자책하고 있던 어떤 사람은 피식 웃는다. 그렇게 여러 번 일러줬는데도 나무는, 동네 개들은, 자연은 나를 모른 체 한다. 각자 자신의 일을 꿋꿋이 한다. 말하는 나를, 소리치는 나를 모른 체 하고. 그렇게 자기 일을 한다. 물을 버리고, 본 체 만 체 나를 지나쳐 동네를 어슬렁거린다. 자기의 일을 한다.
바람이 차갑다. 겨울 바람이라 해도 곧이 믿을 만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가을이다.
이렇게 가을이 간다.
물을 버려 새로운 잎사귀를 만들고
또 그 잎을 떨어뜨리면서
말 시키는 나를 본 체 만 체 하면서
가을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