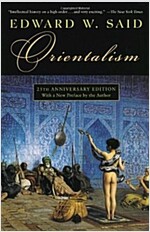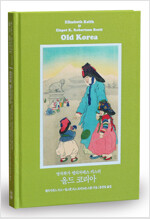총 6장으로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화/ 풍속에 관한 책입니다.
미국 오레곤 대학교(University of Oregon)의 소장된 작품들을 연구해서 서양 특히 영미권의 지식인들이 일제강점하의 조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연구한 책입니다.
본문이 총 194쪽 밖에 되지 않으니 약간 학술적인 산문 정도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서구 유럽이 비서구, 특히 중동과 동양( 또는 아시아)를 어떻게 보는지는 특히 비교문학 ( comparative literature)분야에서 그 단초를 제시하고 인문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관점입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의 문예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Said)의 명저 ‘오리엔털리즘( Orientalism, Vintage, 1978)’이 그 이론적 분석틀을 처음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 따른 서구의 ‘시선의 정치학(the politics of gazing)’을 다룬 책은 물론 이 책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리엔탈리즘이 기본적으로 동양을 여성적이며 정적인 대상이며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ahistorical) 주체가 아닌 대상 (objective)으로 보고 있으며, 남성적이고 역동적인 문명국인 서양의 국가들이 비문명적인 동양을 계몽하고 깨우쳐 문명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서양의 백인 남성들이 저지른 폭력과 착취 그리고 식민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소거된 체 겨우 300여년에 이르는 서구 유럽의 경제적 힘의 우위를 절대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자체가 매우 폭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제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변방에 머물렀던 서유럽이 이렇게 오만하고 폭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저질러온 식민지에 대한 착취와 노예무역의 역사를 지우고 고상하게 포장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자체의 폭력성은 공산주의가 사라졌다고 해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골수 자본주의자들, 특히 근본주의적 시장자본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성을 공격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폭력적인 건 두 체제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어로 쓰여진 책 중에서 제 인상에 가장 많이 남은 책은 고미숙 선생이 2001년 출판하신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찿아서 (책세상,2001)’입니다.
근대적 신체의 탄생과 병리학과의 관계, 위생관념과 근대개념을 연결시키면서 문명안들인 서양인들이 근대 초기 조선인들을 어떻게 인식했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책의 주인공인 세여인도 모두 기독교인이고, 모두 중산층이상의 집안에서 여유롭게 교육을 받았던 20세기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베라 잉거슨 (Vera Ingerson)은 평안북도 선천(宣川)에서 의료선교를 하던 미국인으로 특히 기독교의 교세가 강하기로 유명한 평안도 선천, 정주, 강계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신의 미국여인으로 조선으로 오기 전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받았습니다.
평안북도는 일제상점기 이전부터 청과의 사행로에 위치한 지역으로 조선에서 한양 다음으로 큰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대외무역이 종사해 해외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거리낌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서양인들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현재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감히교파가 모두 평안도에서 월남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우 반공 세력이 나온 지역이면서도 또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진출한 반일 세력의 근거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조선말기 19세기 평안도에서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는 아래의 책을 참조바랍니다.
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년 홍경래난 (푸른역사, 2020)
다음 인물인 거트루드 워너(Gertrude Warner)는 시카고 출신의 아시아 유물 컬렉터로 기본적으로 조선보다 중국과 일본의 고미술품과 풍속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글 서두에서 소개된 시카고 대학 교수인 프레드릭 스타(Fredrick Starr)외의 인연으로 그가 ‘조선불교’에 대한 강연 관련 조선의 불교 관련 사진과 슬라이드를 사들이기도 했던 그녀는 세번째 주인공인 영국출신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Elizabeth Keith)외의 친분으로 조선의 고미술품과 사진을 더욱 많이 수집하고 키스의 목판화를 다수 소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엘리자베스 키스는 이책뿐만 아니라 이미 그녀의 목판화에 대한 책들이 한국에 출판되어 있어 낯설지 않은 화가입니다.
세명 중 유일하게 영국출신이고 일본에 오랫동안 살았던 일본통 독신여성입니다. 일본에서 목판화 (우키요에, Ukiyoe, 浮世絵)를 배워 자신의 사실적인 회풍에 접목시킨 화가로 유명합니다.
최근 그녀의 저서 중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올드 코리아 (책과함께,2020)’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책은 그녀가 1946년 런던에서 출판한 ‘’Old Korea’를 번역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조선에 처음 입국해서 일제의 조선인 탄압을 직접 목격해 조선인들에 대해 동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책은 저자가 언급했듯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사례연구’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 활동한 영미권 여성들에 해당되는 사례이지만 서구 특히 영미권의 오리엔털리즘은 극복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확대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거짓정보가 내외신 가리지 않고 난무했던 사실이나 최근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커지자 영미권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거론하는 듯 백인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서구문명이 중국에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제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7세기-20세기를 제외하고 중국이 문명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인들은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 문화혁명 시기까지만 해도 별볼일 없던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이미 일본을 추월한 상태여서 일본을 아시아 정책의 축으로 삼았던 미국에서 격렬한 반응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 긴장이지만 그 내면에는 오리엔탈리즘이 깔려있고 서구의 오만함(arrogance)이 깔려 있습니다.
정치와 예술은 별개의 분야가 아니고 무의식과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