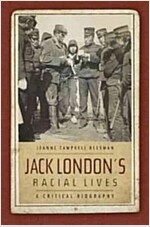일어 번역을 보면 당최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면서도, 그런대로 느낌이 올 때가 있다.
"이 드라이 마티니는 그야말로 극북의 드라이군요.“
이 문장은 하루키가 안자이 미즈마루의 만화 해설에 쓴 글에서 가져왔다. 극북은 '극한에 가까운'이라고 풀어쓸 수 있는데 영어로는 Extreame 정도 되는 듯하다. '북쪽의 끝'은 아니다. 그러면 북극의 마티니가 되니까. 일어 표현 특징으로는 지나친 소유격을 들 수 있는데, 정말 오만 데다 ‘~의’를 쓴다. 우리말 표현은 소유격을 주로 생략하므로, 일본처럼 '학교의 알림입니다'라고 쓸 필요 없이 ‘학교 알림입니다’라고 하면 된다. 그러고 보면 일상적인 표현에 필요 없는 소유격을 넣을 때가 있는데 이게 꼭 일본식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번역문, 번역체에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저 ‘극북의 드라이’ 문장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고칠까 생각해봤다. 자꾸 비속어 생각만 난다. (이 드라이 마티니는 ○○ 드라이하군요.) 솔직히 영어로 더 잘 어울리는 건 Extreame 보다는 Damn 인 듯. 어쨌든 일본인이 쓴 글은 그네들 스타일대로 읽어야 느낌이 있다. 글맛이 말이다.
아무튼 하루키가 시시콜콜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읽노라면 소소한 재미가 있다. 《야성의 부름》을 쓴 잭 런던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런던이 러일전쟁 취재기자로 조선에 왔던 적이 있다. 그때 쓴 취재기는 《잭 런던의 조선 사람 엿보기》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 읽으면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데 런던이 조선을 엄청 깔보기 때문이다. 1904년이니 어쩔 순 없지, 하면서도 하루키가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묘하게 빈정이 상하는 것이다.
런던이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관리가 찾아와 정중히 청하길, ‘틀니를 좀 보여주시오.’ 라고 했단다. ‘작가인 자기를 알아본 줄 알았는데 틀니라니!‘ 하면서 런던은 연단에 올라가 30분 동안 틀니를 넣었다 뺐다 하며 보여준다. 틀니를 처음 본 사람들은 연단 아래서 박수를 치고 말이다. 런던은 그 일화에서 인간이 사력을 다해도 그 분야에서 인정받기는 좀처럼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하루키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하루키는 그런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은 게 대단하다며 자기 같았으면 턱도 아프고 어쩌고... 이하 생략. 이 부분은 읽기 나름이지만 꼬아서 보면 또 그렇게도 읽힌다. 못할 이야기도 아니고 없었던 일도 아닌데 기분이 상했다. 이 짧은 글이 신문에 실렸다고 하니 일본인 특유의 돌려까기인가 싶기도 했다. 일상 속 그 미묘한 까기를 모르면 반응하는 이만 피해의식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배려해주니까 참 좋더라! 그건 당신이 외부인일 때 얘기고, 그들 내부에 들어가 그 코드를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뭐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 연유로, 잭 런던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출처를 찾아보았다. ’Korea‘로 검색해보니 런던의 인종차별 이야기만 한웅큼이다. 이럴 수가?! 그래서 이번엔 잭 런던과 인종차별로 검색해서 뜬 인디펜던트 기사를 보았다. 2010년 기사1)로 제목부터 의미심장하다. "잭 런던: 그냥 야성의 부름이 아니었다Jack London: Not just the voice of the wild." 기사 일부를 적당히 발췌하여 대강 요약해보겠다.
미국은 급진적 사상을 가진 인물들을 거세시켜 껴안아주고픈 고자(cuddly eunuch)로 만드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일례로 마크 트웨인이나 마틴 루터 킹이 있는데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세자는 잭 런던일 것이다. 당시대 가장 많이 읽힌 글을 쓴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현재 개에 대한 귀여운 이야기를 쓴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렇기만 하다면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기이하며 영감을 주는 한편, 역겨운 인물을 놓치는 것이다. 잭 런던의 사십생애는 이러했다: 슬럼가에 거주하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심령론자의 사생아, 미성년 노동자, 해적, 부랑아, 혁명적 사회주의자, 집단살해를 열망한 인종차별주의자, 골드 디거, 종군기자, 백만장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우울증 환자, 그리고 한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작가. 잭 런던의 전기를 쓴 제임스 헤일리는 런던을 가리켜 "미국 문학 목록(Literary canon) 중 가장 오해받은 인물"이라고 한다.
잭 런던의 어머니 플로라 채니는 부유하게 자랐으나 십대 때 가출하여 죽은 이와 대화한다는 종교 집단에 들어간다. 그 집단의 리더 윌리엄 채니와 내연 관계가 되지만 채니는 임신한 플로라를 구타했으며 낙태하라고 요구한다. 플로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 기도를 했으나 총기 오발로 목숨을 건진다. 1876년 샌프란시스코 슬럼가에서 잭이 태어났을 때, 플로라는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 해방노예 출신의 흑인 유모에게 맡겨버렸다. 버지니아 프렌티스는 잭 런던의 유년기 대부분을 보살핀 사람이며 잭은 버지니아를 "Mammy"라고 불렀다. 훗날 잭은 자신이 사회의 최하층(cellar of a society)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19세가 될 때까지 이를 닦은 적이 없어서 그때 이미 치아들이 썩어 있을 정도였다. 그는 대공황 시기를 겪으며 사회주의를 접한다. 1894년, 열여덟 나이로 길거리에서 봉기할 것을 연설하여 샌프란시스코 신문 1면에 "사회주의자 소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자본과 계급에 부딪치던 런던은 금을 찾으러 캐나다 북극으로 간다.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작가가 되기를 결심하고 쓴 첫 소설이 성공을 거둔다. 오늘날 잭 런던의 작품을 읽는다면 그가 미국문학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존 스타인벡, 비트 세대, 조지 오웰과 업튼 싱클레어 그리고 필립 로스까지... 런던의 스타일을 보면 수십 년을 앞선 말론 브란도와 제임스 딘이 보인다. 잭 런던이 부자가 될수록 그의 사상도 급진적으로 변해간다. "나는 사회주의자이기 이전에, 백인이다. I am first of all a white man, and only then a socialist." 아파르트헤이트를 동반한 잭 런던의 사회주의는 백인 아래 다른 인종들이 예속되는 것이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발언들은 역겹고 하나만 옮긴다.)
"우월한 인종이 지구 곳곳에서 강도질을 하고 학살한다." 잭 런던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플로라 채니는 인종 차별주의자였고 사회적 지위를 잃고 흑인 구역 가까이 거주하는데 모멸감을 느꼈다. 런던 또한 "심연의 덫에 걸린" 부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강한 충동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사실 역시 부끄럽게 생각했기에, 그들보다 더 아래인 열등 인간(Untermenchen)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충 해석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 다음에도 잭 런던의 모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기사의 논조는 아주 도발적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아마 해일리의 잭 런던 전기에 기초한 사실들이지 싶다. 잭 런던이 키플링과 니체를 좋아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잭 런던의 인종차별주의적 삶: 비평적 전기》에서 진 캠벨 리스만 교수는 잭 런던의 작품들이 일본에서 인기인 이유가 일본인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기 때문2)이라고 했다. 잭 런던은 러일전쟁 때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특파원으로 파견됐었고, 일본인들을 좋게 평가했다. 런던의 미완성 소설3)도 일본인들의 관습과 능력에 대한 경탄을 보여준단다. 제목이 《Cherry》다. 이쯤 되면 뭐, 파면 팔수록 더 알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인 하루키 이야기로 돌아가자. 하루키는 잭 런던이 러일전쟁 중 조선을 방문하여 의치를 뺐다 꼈다 하며 구경거리가 된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러고선 "사력을 다해도 자신이 열망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긴 힘들다"라는 교훈을 얻은 런던이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다.
개인의 감상까지 내가 뭐라할 건 아니지만 좀 의아한 구석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잭 런던이 멋쩍어서 저런 말을 덧붙인 것 같은데? 괜한 올려치기 아닌가. 하루키가 은근슬쩍 조선이 미개함을 어필했다는 생각은 '턱도 아팠을 거고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원문을 찾아보자. 검색어는 틀니, 의치다. 영어로는 False teeth, Artificial teeth가 되겠다. 일단 잭 런던이 부인 샤미언 키트리지에게 보낸 편지다. 편지 출전은 4).
To Charmian Kittredge
[Off the Korean Coast]
Monday, Feb. 15th, 1904.
Oh, yes, we waited for four hour! When four hours had past, wind came down out of the north, dead in our teeth. Lay all night in confounded tide-rip, junk standing on both ends, and driving me crazy what if my headache.
At four in the morning turned out in the midst driving snow to change anchorage on accout of the sea.
It was a cruel day-break we witnessed; at 8 A.M. we showed a bit of sail and ran for shelter.
My sailors live roughly, and we put up a fishing village (Korean) where they live still more roughly, and we spent Sunday and Sunday night there--my five sailors, myself--and about 20 men, women and children jammed into a room in a hut, the floor space of which room was about equivalent to that of a good double-bed.
And my foreign food is giving out, and I was compelled to begin native chow. I hope my stomach will forgive me some of the things I have thrust upon it. --Filth, dirt, indescribable, and the worst of it is that I can [not] help thinking of the filth and dirt as I take each mouthful.
In some of these villages, I am the first whiteman, and a curiousity.
I showed one old fellow my false teeth at midnight. He proceeded to rouse the house. Must have given him bad dreams, for he crept into me at three in the morning and woke me up in order to have another look.
We are underway this morning--for Chemulpo. I hope I don't drop dead when I finally arrive there.
The land is covered with snow. The wind has just hauled ahead again. Our sail has come in, and the men are at the oars. If it blows up it'll be another run for shelter. O, this is wild and vitter coast.
To Charmian Kittredge
Chemulpo
Tuesday night, Feb. 16 [1904]
Just arrived. Am preparing outfit--horses, interpreter, coolies, etc. for campaign into the North toward Yalu and most probably into Manchuria.
그리고 1904년 3월 4일, 잭 런던이 평양에서 보낸 편지에는 그동안 취재도 하고 여행하느라 고단하여 편지를 쓰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서 통역도 구하고 일꾼(쿨리라고 표현함)도 구하고 자기는 러시아 공사가 타던 말을 탄다는 이야기도 한다. 또 일본인 숙소에 군인들과 머무르고 있는데 세 명만 외국인이라 소개한다. 로버트 L. 던은 콜리어스 위클리, F. A. 맥켄지는 런던 데일리 메일 특파원이다. 두 사람은 잭 런던의 〈전선으로 향하는 종군기자의 골칫거리들〉5)에서 존스와 맥러드로 등장한다. 잭 런던은 한반도 북부로 향하는 중이며, 압록강(Yalu river) 너머 만주로 가고싶어 하지만 잘 안 된다. 어쨌든 2월 편지로 돌아와 런던은 제물포 도착 전 묵어가는 어촌에서 애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 사적인 기록이니 어조는 감안해야겠지만... 나만 그리 읽히는지 모르겠으나, 문명세계에서 오신 백인 나리는 조선 노인네를 놀려먹으신다.
In some of these villages, I am the first whiteman, and a curiousity. I showed one old fellow my false teeth at midnight. He proceeded to rouse the house. Must have given him bad dreams, for he crept into me at three in the morning and woke me up in order to have another look.
이 주변 마을들에선 내가 첫번째 백인인 모양이야. 다들 신기해 해. 한밤에 어떤 노인네에게 내 의치를 보여주었지. 그랬더니 온 집안을 깨우지 않겠어. 내 의치를 보고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게 틀림없어, 그 노인네가 새벽 세시에 살금살금 다가와 나를 깨우더니 의치를 한 번 더 보여달랬거든.
그런데 이건 하루키가 이야기하는 연단에 서서 의치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해서 다시 찾아보니 이번엔 유머집6)에 실려 있다. 하루키가 감동한 포인트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의아한 게 이런 거다. 이 에피소드가 유머집에 있다는 거.
3979. Give people what they want.
When Jack London was on Korea reporting the Russo-Japanese War, an official came to his hotel one day and told him that the entire population was gathered in the square below to see him. London felt enormously set up to think his fame had spread to the wilds of Korea. But when he mounted the platform that had been erected for him, the official merely asked him to take off his bridge of artificial teeth. The crowd watched closely as he did it. And then for half an hour they kept him standing there, taking out his teeth and putting them back again, to the applause of the multitude.
좀 더 정확한 출전을 고민하다 찾아냈다. 어빙 스톤이 쓴 잭 런던 전기7), 《말을 탄 선원》이다. 유머집에 실린 문장과 동일하며 마지막에 감상이 붙었다. 하루키가 감동했다는 잭 런던이 얻은 교훈이다.
When reporting the Russian-Japanese War, an official had come to his hotel and told him the entire population was gathered in the square below to see him. He had felt enormously set up to think his fame had spread to the wilds of Korea. But when he mounted the platform that had been erected for him, the official asked if he wouldn’t take out his bridge of artificial teeth. For half an hour he had stood there taking out his teeth and putting them back again to the applause of the multitude; it was then he had had his first glimpse of the fact that men rarely become famous for the things for which they strive and die.
러일전쟁 취재 중에 있었던 일이다. 한 관리가 잭 런던이 머물던 숙소에 찾아와 이르기를 마을 사람들 전부가 런던을 보기 위해 마당 앞에 나와있다고 했다. 런던은 제 명성이 조선 벽촌에까지 알려진 데 몹시 잘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준비된 단상에 오르자, 그 관리가 의치를 한 번 벗어보지 않겠느냐고 요청한 것이다. 그로부터 삼십 분간, 런던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의치를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를 반복했다. 그 때 런던에게 스친 생각이란, 사람들은 거의 자신이 열망하는 것으로 유명해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잭 런던이 우쭐해서 나갔다가 현타맞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 아닌가... 아니 솔직히 조선에서 백인을 본 사람도 많지 않은데 잭 런던 소설이 언제 읽혔겠냐고. 진짜 착각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유머집에 실린 게 아닌가? 뭐 런던도 처음엔 얼떨결에, 나중엔 사람들 반응도 좋고 하니까 의치 쇼를 보여준 듯하다. 솔직히 침도 흐르고 턱도 아프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현타가 왔을 법하다. 그러니 하루키 얘기도 꼬아보지 않으면 일리가 있다. 이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흑인을 울타리에 가둬두고 구경하는 일들이 있었다. 일본도 따라서 조선인 관람소(일종의 동물원) 같은 걸 만들었고. 상황은 다르지만 잭 런던은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데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단지 명성에 대한 생각만 떠올랐을까?
잭 런던이 조선 취재한 걸 보면 무기력한 조선에 대해 비평하고 일본을 좋게 평가하는데 일본 식민사관 저리가라다. 20세기 초 힘의 논리를 따지는 제국주의자 입장에서 조선을 어떻게 봤을지는 뻔하다. 일본에서 런던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고 참 관계라는 것이, 국적과 별개로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은 하루키가 런던을 좋아한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하루키도 일본 사람이니.. 인간은 참 복잡하다. 의치 쇼를 보여준 친절한 잭 런던은 실은 조선을 깔봤고, 그가 남긴 조선에 대한 기록에서 우월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와이 섬에 갔을 적에는 원주민 문화에 경외를 느꼈으나 미 정부가 이 섬을 정복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잭 런던의 소설 속에서 멕시코나 아시아 등 다른 민족들에게 보이는 관용은 그가 현실에서 보인 모습과는 매우 달랐다. 그런 모순적인 런던을 분명 알고있었을 하루키에게 의심의 눈총을 날리며 글을 마친다...
1)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books/features/jack-london-not-just-the-voice-of-the-wild-2059275.html", (2010.8.22)
2) Jeanne Campbell Reesman, Jack London's Racial Lives: A Critical Biography,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9, pp. 323-24
3) "Jack London's War" Archived 2012-10-17 at the Wayback Machine., Dale L. Walker, The World of Jack London. ≪According to London's reportage, the Russians were "sluggish" in battle, while "The Japanese understand the utility of things. Reserves they consider should be used not only to strengthen the line...but in the moment of victory to clinch victory hard and fast...Verily, nothing short of a miracle can wreck a plan they have once started and put into execution."≫
4) The Letters of Jack London: 1913-1916. Volume three
5) San Francisco Examiner, "https://thegrandarchive.wordpress.com/troubles-of-war-correspondent-in-starting-for-the-front/", (1904.4.4)
6) Ken Alley, The Encyclopedia of Wit, Humor and Wisdom: The Big Book of Little Anecdotes, 2000
7) Irving Stone, Sailor on horseback: Jack London, 1960, pp.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