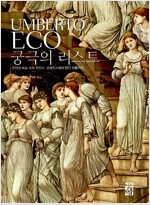목록을 나열해 보는 일은 재미있다. 목록이 얼마나 다양한 성질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움베르토 에코가 쓴 『궁극의 리스트』를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다. 사물의 목록, 장소의 목록, 신기한 것들의 목록, 현기증 나는 목록, 실용적 목록, 시적 목록은 물론 심지어 정상적이지 않은 목록까지, 그가 고찰해 보지 않은 목록을 찾기가 도리어 힘들 정도다.
이 가운데 '책의 목록'이 빠질 리는 없다.
책 목록에 대한 취향은 세르반테스부터 위스망스, 칼비노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가들을 매혹시켜 왔다. 더욱이 애서가들이 고서점의 카탈로그(확실히 실용적 목록으로 만들어진)를 무릉도원이나 욕망의 땅에 대한 황홀한 묘사처럼 읽는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쥘 베른의 독자들이 고요한 심해 탐험이나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과의 조우에서 즐거움을 얻듯이, 그들은 책 목록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고서 애호가인 마리오 프라츠는 1931년 문학 박람회 서적 시장의 카탈로그 15를 위해 쓴 텍스트에서, 애서가들이 고서점의 카탈로그를 읽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보통 사람들이 스릴러물을 읽으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어떤 독서도 흥미로운 카탈로그의 그것만큼 신속하고 감동적인 효과를 자아내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장 뒤에 바로, 심지어 재미없는 카탈로그들도 똑같이 흥미롭게 읽힐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377쪽)
- 움베르토 에코, 『궁극의 리스트』
딱 맞는 말이다. 내가 오늘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경험한 일은 '쓸데 없는 책들을 골라내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추려낸 '내다버릴 책들의 목록'을 보니 문득 그것조차 몹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려질 책의 '가련한 신세'에 비춰 보나, 그 책을 내다버릴 내가 품게 되는 '온갖 어리석음과 회한의 감정'에 비춰 보나, 버려질 책들의 제목이 여간 웃기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 여기서 '개'는 결국 '나'인 셈이다. 내가 뭘 보았기에 이런 책을 사게 되었나?
『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빌 게이츠가 '미래'를 제시하던 시대는 벌써 까마득한 옛날 아닌가?
『iCON 스티브잡스』---> 스티브 잡스는 이미 '아이콘'이 아니라 '아이해브곤'이 된 사람이다.
『마음의 녹슨 갑옷』---> '너'야말로 '내 마음의 책장에서 녹슨 책'이 되었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 '너'야말로 '책장 경쟁'에서 밀려난 책인데?
『이건희 개혁 10년』---> 이건희 '병상' 10년?
『사다리 걷어차기』---> 결국 책장 사다리에서 걷어차인 책?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신화』---> 커피 한 잔과 함께 쫒겨난 책.
『MARKETING is ... WAR』---> 책장 자리다툼 또한 전쟁이야. 살아 남거나 쫒겨나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야.
『무엇이 내 아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가』---> 무엇이 '내 책장'을 그토록 복잡하게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천년을 산다』---> 우리는 여기서 10년도 못 살고 쫒겨나고 만다.
『1494년 베니스 회계』---> 2017년 여름 회계. 이미 계산은 끝났어.
『앤드류 그로브, 승자의 법칙』---> 10년도 못 견디고 책장에서 쫒겨나게 된, '패자가 된 책들의 법칙'은?
『보랏빝 소가 온다』---> 보랏빛 '수레'가 온다. 헌 책을 내다버릴 때 끌고 갈 수레가.

오른쪽 구석에 누워 있는 책들 가운데 땅바닥에 쌓인 책들은 곧 '쫒겨날 책들'이고, 그나마 조그만 장롱 같은 '받침대' 위에 누워 있는 책들은 언젠가 '책장 속으로 들어갈 책들'이다. 이 사진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다.

곧 내쫒길 운명에 처한 책들은 '앞줄'에 쪼로록 모여 앉은 67권이다. 저자로부터 선물받은 책도 몇 권 있어서 눈에 밟히지만, 이런 저런 사정을 다 헤아리자면 '작별'이 어렵다. 내칠 땐 과감하게 내쳐야 한다. 책값이 아깝지만 그동한 '허투루 쓴 돈'이 어디 책값 뿐이랴.

이 각도에서 보면 '책장 속으로 들어갈 책들'이 확연히 구분된다. 책탑이 무려 '일곱 기둥'을 이룬 덕분에, 뜻하지 않게 '받침대'로 쓰여 왔던 '조그만 장롱'이 마침내 열리지 않게 되었노라고 (아내한테서) 타박을 받았다. '참을 수 없는 책들의 무거움'으로부터 장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쫒겨나야 할 책들을 골라내는 수밖에.

고작 67권을 골라냈을 뿐인데, 책장이 한결 숨통이 트이는 듯하다. 저렇게 비워진 공간 덕분에 책탑을 세 개나 없앴고, 오랫동안 '책들의 압박'을 온몸으로 견디며 누워 지내다 마침내 벌떡 일어나 몸을 꽂꽂이 세운 책들은 한 눈에 봐도 입이 귀에 걸렸다. 가령,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잃어버린 '책장'을 찾아서.
『마담 보바리』---> 책장 밖에서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멋진 책장'을 열망했는지 니들은 모를 꺼야.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나는 죽어 누워 가더라도 '꼭 가야 할 책장'이 있단다.
『말괄량이 길들이기』---> 거친 들판에서 오랜 시간 길들여진 덕분에 마침내 '책장'이라는 평화를 얻었어.
『한여름 밤의 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셰익스피어 전집_햄릿』--->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그게 늘 문제였어.
『내게 셰익스피어가 찾아왔다』---> 내게도 책장이 찾아왔다.
『전쟁과 평화』---> 책장과 평화.
『로빈슨 크루소』---> 그런데 프라이데이는?
『걸리버 여행기』---> 내가 지금 어디로 날아온 거지? 천공의 섬 라퓨타? 기분이 붕붕~
『고도를 기다리며』--->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려야지. / (에스트라공) 참 그렇지. 여기가 확실하냐?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먼바다에 섬들이 있소. …… 새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죽소."
『자기 앞의 생』---> "나는 이제 열 살이 되었다. 로자 아줌마는 내게도 생일이란 게 필요하다면서 한 날을 내 생일로 정해주었는데, 그게 오늘이다."
접힌 부분 펼치기 ▼
이런 글을 쓰고 나니 문득 로맹 가리의 소설들이 그립다. http://blog.aladin.co.kr/oren/7383466
갑자기 밀어닥친 파도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휩쓸려 떠내려간 '불쌍한 책들'도 어느새 그립고...
"몇 미터만 더 갔으면 물결에 휩쓸려갔을 거요. 이곳 파도는 몹시 사납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두 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녀의 얼굴은 어린아이를 연상시켰다. 사랑의 슬픔이군, 하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언제나 문제는 실연의 아픔이지.
"이 새들은 모두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먼바다에 섬들이 있소. 조분석 섬들이오. 새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죽소."
"왜요?"
"모르겠소. 갖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왜 여기로 왔죠?"
- 로맹 가리,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펼친 부분 접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