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권의 책 ; 그린 마일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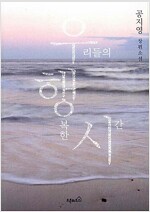
내 주량은 소주 2병'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1병'이라고 말하고 싶다. 돌이켜보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술자리'를 마쳤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소주 1병'을 마시고 난 취기'가 가장 기분 좋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나는 언제나 버릇처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 밀리언달러베이비 " 를 이야기한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병실'에 누워 있는 제자'를 찾아가서 몰래 안락사 시키는 장면이다. 감독은 스승이 반신불수인 제자의 병실을 찾아와 제자가 간절히 요구했던 소원대로 안락사'를 시키는 장면을 매우 빠르게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값싼 신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망설임 없는 신속한 처리'는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확고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감독은 숨죽이며 흐느껴우는 신파'를 버리는 대신 신뢰'라는 키워드를 건져 올린다. 감정의 과잉'이 보이지 않는다. 잠시 동안 나눈 눈인사'와 짧은 고해, 그리고 늙은 복서가 어두운 복도를 성급히 빠져나가는 어두운 어깨'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 종종 " 실망한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야말로 눈물을 쏘옥 빼버릴 만한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던가 ? 로미오가 줄리엣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장면이 아니었던가 ? 하지만 감독은 욕심을 버리고 건조하게 마무리한다. 늙은 감독이 이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신파'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술 기운에 흥이 난 나는 지난번에도 했던 말을 뻔뻔하게도 처음 하는 소리처럼 또 다시 늘어놓는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치켜뜬다.
" 그렇지. 감독은 그 장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신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야. 눈물을 보이지 말 것, 세련된 영화들은 슬픈 장면에서는 일부러 눈물을 보이지는 않아. 채플린을 보라고 ! 울컥 하는 장면에서 채플린은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아. 수줍은 얼굴을 보일 뿐이잖아. 이 영화도 마찬가지야. 죽음을 동정하는 순간 늙은 복서와 젊은 복서가 맺은 우정은 빛을 잃는다고 감독은 생각한 거야. 사랑으로 비춰지기'를 우려했던 감독의 뜻이지. 눈물이 넘치면 추해지고, 웃음이 지나치면 무례해지는 것과 같아. 감정이란 아슬아슬하게 경계 위에 있을 때'가 절절한 법이지. "
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 기분 좋게 취하다가 주량을 넘기면 추해지는 것처럼. 스티븐 킹이 쓴 < 그린마일'> 에서 " 비터벅 사형 장면 " 부분을 읽으면, 나는 밀리언달러 베이비'에서 느낀 그 담백한 장면들이 생각난다. 스티븐 킹'은 이 장면에서 호들갑스러운 연출을 자제하고 부드럽지만 깔끔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이끈다.
추장은 목사가 잔잔한 물가에 눕는다는 내용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울기 시작했다. 우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 울지 않으면 슬슬 걱정이 된다.
- 그린 마일
스티븐 킹'은 과감하게 "나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 울지 않으면 슬슬 걱정이 된다. " 라고 1인칭 고백체'를 통해 회상한다. 얼핏 읽으면 반인륜적인 표현으로도 보이지만 그 속내는 추장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다. 킹은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소설 속 상황을 알기 쉽도록 표현할까'에 목숨을 거는 작가 같다. 그는 그린마일'에서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앞서는 성질 급한 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독자를 웃긴다.
남자의 손은 겨우 절반만 길들인 동물과 같다. 대체로 온순하게 지내다가도 이따금 이탈해서 처음 보는 대상을 덮어놓고 무는 것이다.
이 정도면 완벽에 가깝지 않을까 ? 앞뒤 안 가리고 툭 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남자의 주먹을 사나운 개의 주둥이'로 묘사하다니 말이다. 나는 이 문장에 줄을 긋고 한참동안 웃었다. 오, 킹 아저씨 ! 오, 귀여운 킹 아저씨 !! 볼수록 정이 가는 선생님이다. 사형수를 다룬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종종 < 그린 마일 > 을 공지영이 쓴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과 비교하고는 한다. 결론은 스티븐 킹'이 얼마나 우아한가를 새삼 다시 느낀다. 다음은 공지영의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에 나오는 사형수 윤수의 고백이다. 그의 목소리는 장마철에 물 먹은 습자지 같다.
이곳 구치소에 들어와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았고,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인자로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제 육체적 생명은 더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영혼은 언제까지나 구더기 들끓는 시궁창을 헤매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만남을 설레며 준비하는 것, 인간과 인간이 진짜 대화를 나눈다는 것,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것, 서로 가식 없이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전쟁터로 향하기 전 군인들을 앞에 놓고 장광설을 늘어놓는 장군의 연설문 같다. 사형수와의 사랑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서 공지영은 구질구질하게 온갖 신파를 끌어들인다. 인간'이라는 단어만 무려 네 번 나온다. 인간, 영혼, 인간, 대화, 인간과 인간, 생명, 가식, 기도, 만남. 눈물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수사와 단어'가 동원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꼭 이런 물폭탄 장치'로 독자를 울리는 것이 클라이막스'를 위한 최선의 방식이었을까 ? 우아하게, 킹 할아버지처럼 우아하게, 소설가'라면 감정의 과잉을 적당히 숨겨야 하는 미덕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
공지영의 이 소설을 읽으면 60년대 한국 반공 영화'가 떠오른다. 적이 쏜 총에 맞아 최후를 맞는 주인공의 모습이 스친다. 총 맞고, 쓰러지고, 죽으면 되는 5초 분량의 장면'을 10분씩 끌고가는 그 신파 말이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죽을 듯 죽을 듯 죽지 않는 주인공의 질긴 생명력'을 보면 짜증이 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스티븐 킹'처럼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끌고갈 재주는 없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