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행운
김애란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12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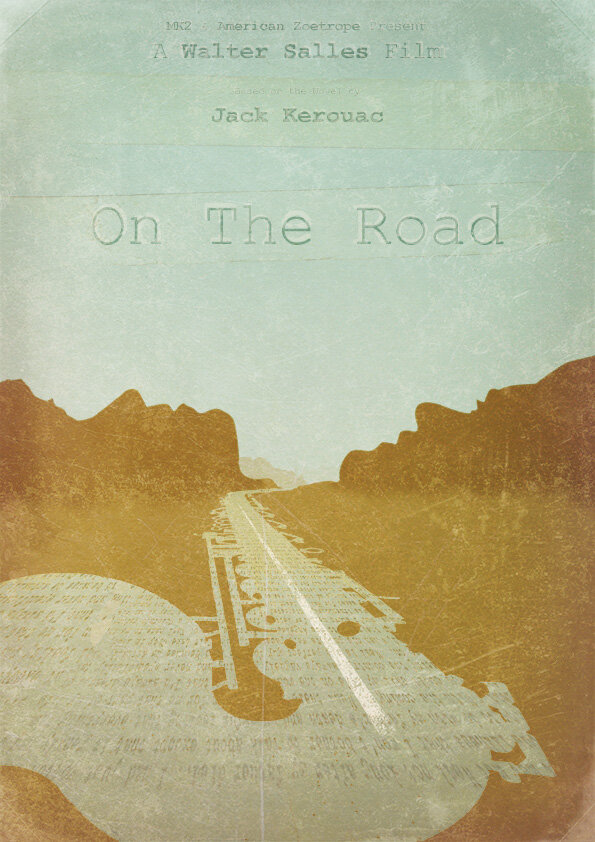
서른 즈음'에......
버릇이 하나 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다 보니 그리 되었다. ( 습관을 ) 탓할 일은 아니다. 시집을 읽을 때는 랜덤' 순으로 읽고, 소설집을 읽을 때는 반드시 단편 하나는 빼놓고 읽는다. 이제는 아예 읽지 않을 < 단편 하나 > 를 미리 고른 후 독서를 시작한다. 기준은 없다. 김애란이 쓴 소설집 < 비행운 > 에서 내가 읽지 않기로 결심한 작품은 표제작인 " 비행운 " 이라는 단편이다. 그렇다면 이 글은 < 비행운 > 을 제외한 서평일까 ? 아니다, 지금 이 글은 내가 읽지 않은 < 비행운 > 에 대한 서평이다. 가능하냐고 ? 가능하다 !
김애란'을 관통하는 것은 집/home' 이 아니라 방/room' 이다. 이 거처는 대부분 평균값보다 낮거나 높다. 반지하이거나 옥탑이며, 고시원이거나 원룸'이다. 여기서 room은 a room 이 아니라 one room'이다. 1인용 방'이라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이다. 김애란이 이십대 (초)중반에 쓴 소설집 < 침이 고인다 > 와 < 달려라, 아비 > 는 대부분 1인용 방'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주거 공간은 곁'을 허용할 수 없는 공간 구조'이다. 그러니깐, 그러니깐, 그러니깐 말이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생래적 고독이기보다는 (사회) 환경적 구조 탓이다. 옥탑 혹은 반지하에서 시작된 아비와 어미의 자식들은 고스란히 그 공간을 이어받는다. 한번 乙 은 영원하다 !
이 주거 공간은 < 비행운 > 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얼핏 보기엔 집'이지만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집 한 채는 단칸방이 확장된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 두 칸짜리 방이 있는 아파트는 벼랑 끝에 있거나 홍수에 잠기고, 하나 밖에 없는 외아들은 달랑 " 사식을 넣어달라 " 는 편지만을 집으로 보낸다. 남편은 외박하고, 아빠는 실족사했으며 외아들은 교도소에 있다. 이처럼 방은 one room에서 two room'으로 늘었지만 결국은 혼자'다. 단칸이다. 오히려 텅 빈 방'은 고립감'을 강조할 뿐이다.
이러한 < 1인용 방 > 이미지는 여행용 가방'으로 변형이 되기도 한다. 방 = 가방'이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뜻하는 캐리어 / carrier 는 까막귀인 내게는 커리어/career 처럼 들린다. 그것은 가방이 아니라 < 이동용 조립식 1인용 방 > 이자 < 계급 상승에 대한 욕망 상품 > 이다. 백화점 직원들은 여자는 손톱과 가방으로 남자는 안경테와 시계로 소비 수준과 구매력을 판단한다고 말한다.
" 여자 나이 스물일곱이면 알바 자리도 쉽게 나지 않는 " 취업준비생인 서윤과 이제 갓 취업에 성공한 직장 초년생인 나'가 욕망하는 것은 화려한 " 커리어(우먼) " 이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엇박자'가 난다. 캐리어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불편한 가방이다. 여행할 때 커다란 가방은 짐이다. 호텔 니약 따'에서 서윤이 은지가 가지고 다니는 커다란 캐리어'를 보며 불편해하는 이유는 은지와 맺는 계급 갈등/커리어 때문이다. 그것은 종종 불화한다.
전작에 등장했던 옥탑이거나, 반지하이거나, 고시원, 자취방'에 거주하던 주인공들은 < 비행운 > 에서는 확장된 주거 공간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큰 고립과 상실로 다가온다. 그들이 원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한 줌의 체온이었다. 사실 단편집 < 비행운 > 에서 " 비행운 " 이란 단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은 이 소설집에 수록된 < 너의 여름은 어떠니 > , < 벌레들 > , < 물속 골리앗 > , < 하루의 축> , < 큐티클 > , < 호텔 니약 따 > , < 서른 > 에 대한 단상이었다. 내가 도사도 아니고 무슨 수로 읽지 않은 소설에 대한 서평을 쓸 수 있는가 말이다. 하, 하, 하. 나는 삐에르 바야르'가 아니다.
이 소설의 백미는 < 서른 > 이라는 단편이다. 편지 형식을 빌린 독백은 르포처럼 사회 고발적 측면이 강하여 자칫 잘못하면 선동적 성격이 두드러질 수 있었으나, 김애란은 솜씨 좋게 문학적으로 다듬는다. 촌스럽게 말하자면 기똥차다 ! 그녀는 독한 마음으로 이 힘겨운 편지를 써내려갔을 것이다. 어쩌면 이 편지는 성공한 작가가 벼랑 끝에 몰린 동시대 친구들에게 보내는 부채 의식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연민이기보다는 살아남은 자가 느끼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이리라. 끝으로 < 서른 > 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글을 끝낼까 한다.
" 그때 저를 위로해준 건, 제가 직접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어요. 욕망이나 쾌락은 그다음 문제였지요. 어쩌면 사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기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만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