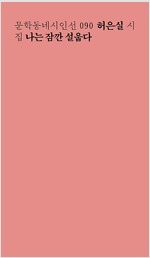
받침 위에 찻잔을 얹는 일 :
이마에 손을 얹는 일
한쪽 어깨가 주저앉았다는 사실은 인천의 어느 양복점에서 알게 되었다. 동생 결혼식 때 입을 양복이 없어서 맞춤양복을 전문으로 하는 양복점에 갔는데 몸 치수를 재던 재단사'가 그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재단사의 지적을 받고 나서 거울 앞에서 내 몸을 관찰하니 아닌 게 아니라 왼쪽 어깨는 콧대가 주저앉은 권투선수의 코처럼 푹 꺼져 있었다. 오른쪽 어깨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데 반해 왼쪽 어깨는 완만한 곡선으로 미끌어지다가 어깨 끝에 다다라서는 산사태로 유실된 벼랑처럼 아래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평생 내 알 몸을 봤지만 사실은 모르는 몸이었던 것이다(이 문장에서 유머를 발견한 사람은 내 언어유희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 옛날, 싸우다가 왼쪽 어깨가 부러졌던 그날이 생각났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 어마어마한 통증이 몰려왔다. 다행히도 바로 옆 건물에 일반 가정 내과 병원이 있어서 무작정 들어갔다. 대기실에는 몇몇 사람들이 대기표를 받고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내 직원에게 내 속사정을 말하니 그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사무적인 말투로 대기 손님이 여럿 있으니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 감기에 걸린 사람과 어깨가 부러져서 죽을 것 같은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네에 ? "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자 진찰실 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나와서 내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먼저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부끄러운 짓이었으나 그 당시에는 너무 아파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물며 생사를 오가는 응급실 상황은 어떨까 ? 아마도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환자는 많고 의사가 부족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응급실은 오는 순서대로 진료를 받지 않는다. 팔이 부러진 사람보다는 칼에 복부를 찔린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기다리다가 지친 환자와 격무에 시달리는 응급실 의사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마른 환자를 탓할 일도 아니다. 제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막연한 공포는 체면 따위를 생각할 여유를 지운다. 그럴 때마다, 어느 응급실 전문의는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짚으며 열을 체크한다고 한다. 손으로 열을 체크하기보다는 온도계로 열을 체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손으로 이마를 짚는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자신을 적대하던 환자들이 그 순간만큼은 순한 양이 된다고 한다. 의사의 환대에 환자의 적대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 마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세밑의 흰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ㅡ 허은실 시집 《나는 잠깐 설웁다》, 문학동네, 2017
허은실 시인이 < 이마 > 라는 시에서 "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 ㅡ " 다고 고백하는 대목에서 아플 때마다 내 이마에 손을 얹었던, 젊었던 어머니의 옛 모습을 떠올렸다. 죄 지은 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그 죄를 사(赦)할 수 있는 것처럼 손은 갱생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배가 아플 때 할머니가 손주의 배를 쓰다듬으며 내 손이 약손이다 _ 라고 주문을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치유가 되는 경험을 가진 이라면 모두 다 동의할 것이다.
무늬가 같은 받침 위에 찻잔을 올려놓는 것이 게스트을 환영한다는 호스트의 예의라면1), 아픈 이의 이마에 손을 얹는 일 또한 아픈 이에 대한 조건 없는 환대'일 것이다. 펄펄 끓는 이마 위에 손을 얹는 일은 받침 위에 찻잔을 얹어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일과 같다.
1) 아무리 비싼 찻잔이라 해도 차받침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단순한 용도로만 보면 받침은 실용보다는 장식에 가까워서 찻잔의 부속에 불과하지만 받침이 없는 찻잔은 빛을 내지 못한다. 냄비도 마찬가지다. 냄비뚜껑이 없는 냄비와 냄비뚜껑이 있는 냄비 중 가격을 후하게 받는 쪽은 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찻잔과 차받침(혹은 냄비와 냄비뚜껑)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몸인 셈이다. 허은실의 시 < 이마 > 를 읽다가 깨닫게 된다. 이마와 손바닥의 관계는 찻잔과 차받침의 관계와 같다는 사실. 시인이 " 이마의 크기가 /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 고 고백할 때 나는 냄비의 둘레에 이가 잘 맞은 냄비뚜껑을 덮는 장면을 떠올렸다. 펄펄 끓는 이마 위에 손을 얹는 것은 펄펄 끓는 냄비 위에 뚜껑을 닫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생김새와 쓰임새만 놓고 보면 이마와 손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시인이 "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마의 유사어는 손이 된다. 그것이 바로 시적 마술이다. 이마의 유사어는 손바닥이다.
2) 왠지 이 글에는 버둥의 < 이유 > 라는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 첨부한다. 한 번 듣고 홀딱 반했던 노래다. 버둥의 데뷔 앨범 << 조용한 폭력 속에서, 2018 >> 은 가장 주목할 만한 시선 중 하나이다. 가사의 깊이가 탁월하고 연출도 드라마틱하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버둥은 겉멋을 부리기 위해서 가사를 쓰기 보다는 소리와 주장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가사를 쓰는 싱어송라이터'다. 버둥,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