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골의 웃음과 공포
고골의 웃음과 공포
이번주 주간한국의 '지식인의 서고' 꼭지에 실은 글을 옮겨놓는다. 짧은 분량의 글이어서 고골의 대표작 <외투>에 대해 간단히 적었다(고교 독서평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다는 걸 지금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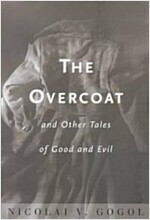
주간한국(09. 12. 17) 우리가 욕망 없이 살 수 없다면…
대학에서 러시아문학을 강의하기 때문에 매학기 고정적으로 읽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명작’들입니다. 보통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푸슈킨부터 시작하여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를 거쳐서 불가코프나 솔제니친까지 ‘투어’를 합니다. 이 거장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고골(1809-1852)입니다. 올해가 그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니 더더구나 그렇지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단편으로만 치자면 고골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외투>입니다. 페테르부르크의 한 하급관리가 어렵게 마련한 외투를 강탈당하고 죽은 후에 유령이 되어 다시 나타난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매년 다시 읽으면서 매번 경탄하게 되는 걸작입니다. 흔히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러시아문학사에서는 압도적인 의의를 갖는 작품입니다.
한데, <외투>는 한편으로 자주 오해받는 작품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인도적 박애주의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가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예비치 같은 ‘작은 인간’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의 형제요.”라는 아카키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쪽에선 주인공이 자신의 일에서 발견하고 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간과하는 듯합니다.
하급관리로서 아카키의 일이란 문서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쓰는 정서(淨書)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자 자족적인 즐거움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정서 외에는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글씨들만을 떠올리고, 근무가 끝나 집에 돌아와서도 음식에 파리가 붙었거나 말거나 요기만 하고는 다시 정서에 매달렸습니다. 정서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글자들이 나오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은 마치 딴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겨울이 되어 페테르부르크에 사나운 북풍이 휘몰아치자 그의 낡은 옷은 더 이상 바람막이가 돼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없이 새 외투를 장만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새 외투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면서 아카키는 ‘욕망의 주체’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아카키는 외투 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향유하던 모든 즐거움을 유보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충만한 만족의 세계에서 영속적인 결여의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욕망은 언제나 채울 수 없는 결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아카키가 새 외투를 마련하고 얼마 안 있어 강도들에게 강탈당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외투>는 저에게 욕망이 몰고가는 파국을 보여주는 섬뜩한 이야기로 읽힙니다. 고골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욕망 없이 살 수 없다면, 우리의 파멸 또한 필연적이라구요. 무섭지요?
09. 12. 19.

P.S. 찾아보니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무성영화 <외투>(1926)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http://www.youtube.com/watch?v=ki-zGGXIbH4&feature=PlayList&p=EC0B7D5C62078945&index=0). 나도 못 봤던 것인데, 감독은 그리고리 코진체프와 레오니드 트라우베르크이며, 시나리오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저명한 문학이론가 유리 트이냐노프가 맡았다(원작과는 좀 다르다). 오늘의 서프라이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