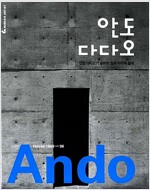교토문학기행 첫날이었고 지금은 오사카의 밤이다. 내일과 모레는 교토에서 숙박할 예정이고 금요일에 귀국한다. 3박4일의 짧은 일정. 그럼에도 둘러볼 작가들은 적지 않아서 다니자키 준이치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미시마 유키오 등 3대 탐미주의 작가에다 국민작가 시바 료타료가 더해지고, 도시샤(동지사)대학을 찾아 윤동주, 정지용 문학기행도 겸하게 된다. 마지막날에는 아라시야마를 찾아 바쇼의 자취를 더듬는다. 짧은 일정이어도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나중에 복기하는 데도 그만한 시간이 또 필요할 수 있다(물론 다음 문학기행에 떠밀리게 될 운명이지만).
지난해 설국기행차 도쿄를 두번째 찾았고, 이번에 교토문학기행차 간사이 지역을 9년만에 다시 찾았다(9년전 문학기행은 윤동주문학기행을 타이틀로 했었다). 관문인 간사이국제공항은 도쿄보다 가까워서 아침 8시반에 김포공항을 떠난 비행기는 10시쯤 간사이공항 활주로에 닿았다(실비행시간은 1시간20분인 거 같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곧바로 향한 곳이 다니자키 준이치로 기념관이다. 오사카부에 속한 간사이공항에서 효고현 아시야시에 위치한 기념관까지는 1시간반쯤의 거리. 비가 오는 날씨여서 버스에서 간편식(샌드위치)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일행은 기념관으로 들어갔다. 기념관의 규모가 아주 큰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왜소한 것도 아니었다. 다니자키의 생애와 작품세계 전반을 일별하게 해주는 전시로 채워져 있었다.
다니자키의 생애에 대해선 주로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세번의 결혼, 특히 첫번째 아내(지요코), 세번째 아내(마쓰코)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설명을 보탰고 대표작 몇편의 얘기를 더했다. 다니자키의 대표작은 단연 <세설>인데, 도쿄 출신의 작가 다니자키가 1923년 간토(관동)대지진이 아니었다면 간사이(관서)로 이주하지 않았을 터이고 마쓰코와의 인연도 없었을 테니 여러 모로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운명이다. 알려진 대로 <세설>은 아내 마쓰코의 친정(오사카 상인집안) 식구들(마쓰코를 포함한 네 자매)을 모델로 하여 쓰인 풍속소설이다.
1935년 세번째 결혼 이후(두 사람은 1934년부터 동거한다) 다니자키가 주력한 것은 <겐지모노가타리>를 현대어로 옮기고, 이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장편소설 <세설>을 쓰는 일이었다. 두 작업 모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는데 결혼생활의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심지어 <세설>은 태평양전쟁시 피난길에서도 쓰인다. 도저한 안정감이라고 해야 할까).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니자키가 <세설>을 집필한 집 이쇼안(의송암)이 있어서 일행은 그곳도 들렀다. 평일에는 열지 않는 곳이어서 외관만 확인했지만 다니자키 투어의 장소로는 의미가 있었다.
다니자키 기념관과 집을 차례로 둘러보고 일행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건축작품 가운데 하나인 효고현립미술관을 찾았다(고베시에 위치해 있다). 비가 오는 날씨도 감안해서 추가한 일정인데, 건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안도 갤러리‘와 소장품 특별전 모두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특히 가와바타나 미시마와도 연관된 작품도 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이런저런 감상까지 적는 건 다음 기회로 미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