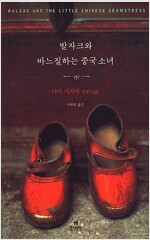
나는 『위르쉴 미루에』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베껴놓기로 했다. 책을 베끼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난생처음이었다. 방 안을 뒤져 종이를 찾아보았지만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사용할 종이 몇 장밖에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점퍼의 양가죽에 직접 옮겨 쓰기로 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주었던 그 점퍼의 겉면에는 길고 짧은 양털이 뒤섞여 있었지만, 안쪽은 털이 없이 매끈한 가죽이었다. 안쪽 가죽은 군데군데 갈라지거나 해져 있어서 글을 쓸 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 쓸 만한 본문을 선택하는 데 한참이 걸렸다. 나는 위르쉴이 최면상태에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쓰기로 했다. 나도 위르쉴처럼 침대에 잠든 채 오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가 뭘 하고 계신지를 보고, 또 부모님과 함게 저녁 식탁에 앉아 그분들의 앉은 자세라든가 반찬이나 접시 색깔을 관찰하고 음식 냄새를 맡고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다. 나도 위르쉴처럼 꿈을 꾸면서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들을 보고 싶었다.
늙은 산양가죽에 만년필로 글씨를 쓰기란 쉽지 않았다. 가죽은 윤기가 없고 꺼칠꺼칠해서 가능한 한 많은 본문을 옮기려면 깨알같이 작은 글자로 써야 했는데 그것은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소맷자락까지 글로 가득 채웠을 때는 손가락이 부러지기라도 한 것처럼 몹시 아팠다. (p.82-83)
'마오와 그의 당원들의 저서, 순수한 학술서를 제외한 모든 책이 금서'(p.70-71) 였던 때에, 주인공은 친구 '안경잡이'로부터 발자크의 소설을 빌려 읽게 된다. 함께 지내던 친구 '뤄'와 번갈아 그 책을 읽고는, 너무 좋아서 어디에 옮겨적을까, 하고 양가죽 점퍼에 몇 문장만 발췌해 적고 책을 돌려준다. '뤄'는 당시에 좋아하던 바느질하는 소녀에게 그 책을 읽어주고 싶지만 책을 이미 주인에게 돌려준 터라 그럴 수 없어 안타까워 하고, 이에 주인공은 자신의 양가죽 점퍼를 내어준다. 그 점퍼를 들고 뛰어가, 뤄는 바느질 하는 소녀에게 발자크 소설의 지극히 일부를 들려준다.
모든 책이 금서였던 그 때에 발자크의 소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면 안되었고, 그러므로 비밀가방에 꽁꽁 숨겨두고 지냈었는데, 주인공과 친구 뤄는 안경잡이로부터 다른 소설을 또 빌려 읽고 싶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다.
글을 알면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책을 읽을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었던 때에 발자크의 소설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이고 욕망이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양가죽 점퍼에 옮겨 적는 건 너무나 공간이 작지 않은가. 옮겨 적을 수 있는 분량도 적었을 터. 아...얼마나 감질났을까.....
나는 이 책의 절반정도를 읽었는데, 앞으로 남은 절반 정도에 어떤 이야이가 있을지 기대된다. 그보다는 사실, 누구의 어떤 책을 이들이 또 만나고 읽게 될지, 그게 너무 궁금해. 등장인물들이 책에 빠지는 걸 보는 건 너무 즐겁다! 그런데..나 아직 발자크를 안 읽어봤어. 위르쉴 미르에가 발자크 책의 제목이며 동시에 등장인물의 이름이기도 한 모양인데, 발자크의 책은 어떤 게 있는지 자,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넣어보자.





아니, 나 뭐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고리오 영감》 읽었잖아 ㅋㅋㅋㅋㅋㅋ 게다가 《나귀 가죽》갖고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미 읽고 가지고 있는 작품의 작가였구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책에 나왔던 위르쉴 미르에는 아직 번역된 게 없는가보다. 궁금하구먼....
다음 읽을 책은 자연스레 나귀 가죽으로 결정되는건가....
그나저나 나도 필사를 한 번 해볼까....
음...
귀찮군.....
그냥 읽기만 하자,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