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에 심한 과음을 했다. 과음도 모자라 '심한'. 비도 오고, 그래서 막걸리에 파전이 너무나 맛났다고 변명해본다. 함께 한 약간은 생경한 친구들이 왠지 너무 좋았다고도 변명해본다.. 그렇지만 결국 내가 그날 술이 너무 먹고 싶었던 것이고 덕분에 자제없이 달렸다.. 라는 게 더 맞는 말일 게야.
과음의 뒤는 뭐.. 전사. 내 인생에서 5/16 토요일 하루는 그냥 없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되겠다. 누워 자고, 밥 먹기 싫었지만 속이 안 좋아 겨우 해먹고 (누가 해주면 좋겠다고 골백번은 생각했다) 또 자고... 또 자고... 그러다 아 빨래는 하자 해서 어기적 어기적 일어나 빨래 돌리고 또 자고.. 세탁기가 삐삐 거릴 때마다 일어나 좀비처럼 걸어가 빨래를 꺼내고 아무 생각없이 건조대에 널고.. 또 자고... 아. 이게 뭐냐. 다신 술 먹지 말자. 라고 생각하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나 이제부터 금주할거야." 라고 메세지 보냈더니 당장 답이 왔다. "네가 금주한다는 말은 못 믿겠다.".. 날 너무 잘 아는 친구들. 킁. 그래 금주는 못할 거 같고 절주할 거야. 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날들에 <흑인 페미니즘 사상>을 읽는 것은 내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어 내리 스릴러 소설만 읽어대었다. 하나는 일본소설, 하나는 스웨덴소설. 쟝르소설이라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오지만 특히나 일본과 북유럽은 유독 많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아뭏든 두 권 홀랑 다 읽었다, 그저 드러누워서.
 읽을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 읽은 책인데... 중편 정도가 세 편 정도. 첫 편의 내용이 참 찝찝했다. 다락방님이 완전 싫어하는 내용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읽으면서 내내 좀 불편했다고나 할까. 끔찍했다고나 할까. 마치 신문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야기를 소설로 읽는 느낌이었고, 이건 뭐... 나머지 두 편은 소프트했다. 스기무라 사부로 시리즈 (북스피어에서는 '행복한 탐정' 시리즈라고 하지만)는 미야베 미유키가 유일하게 내는 시리즈물인데, 갈수록 탐정일 하는 주인공의 발전이 눈에 띈다. 그냥 부잣집 사위로 그 부잣집 회사의 사보 편집자로 일하다가, 잘 맞지 않는 옷인양 거북하게 지내다가, 결국 아내의 불륜이 드러나 이혼한 후 우연히 발견한 자신의 재주, 탐정하는 재주를 직업 삼아 지내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 폭이 넓어지고 탐정으로서의 역할도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인다. 첫 편의 찝찝함을 넘기고 나니 나머지 두 편은 너무 말랑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은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었긴 하지만. 다음 권에서는 장인 이야기와 딸 이야기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금 생각 중이다.
읽을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 읽은 책인데... 중편 정도가 세 편 정도. 첫 편의 내용이 참 찝찝했다. 다락방님이 완전 싫어하는 내용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읽으면서 내내 좀 불편했다고나 할까. 끔찍했다고나 할까. 마치 신문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야기를 소설로 읽는 느낌이었고, 이건 뭐... 나머지 두 편은 소프트했다. 스기무라 사부로 시리즈 (북스피어에서는 '행복한 탐정' 시리즈라고 하지만)는 미야베 미유키가 유일하게 내는 시리즈물인데, 갈수록 탐정일 하는 주인공의 발전이 눈에 띈다. 그냥 부잣집 사위로 그 부잣집 회사의 사보 편집자로 일하다가, 잘 맞지 않는 옷인양 거북하게 지내다가, 결국 아내의 불륜이 드러나 이혼한 후 우연히 발견한 자신의 재주, 탐정하는 재주를 직업 삼아 지내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 폭이 넓어지고 탐정으로서의 역할도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인다. 첫 편의 찝찝함을 넘기고 나니 나머지 두 편은 너무 말랑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은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었긴 하지만. 다음 권에서는 장인 이야기와 딸 이야기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금 생각 중이다.
 크리스티나 올손의 <파묻힌 거짓말>을 얼마 전에 보고, 마지막에 남겨진 여운 때문에 다음 책을 안 볼 수가 없었다. 거짓말 시리즈인데다 첫 권에서 해결 안된 얘기들이 <피할 수 없는 거짓말> 이 책에서 다 해결된다고 하니 ... 어떻게 안 보겠는가 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목만 달랐지, 한 권을 두 권으로 나눈 것에 불과했다 이거다. 아뭏든, <피할 수 없는 거짓말>은 재밌다. 마틴 베너 변호사의 과거와 현재가 겹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스토리였음에도 그 긴박함과 반전은 즐거움이었다고 얘기하고 싶다. 물론 루시와의 관계에서는 이넘의 마틴 베너,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서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내 현재를 위협하며 다가올 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과거가 누구나에게 다 있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과거는 교정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인지라 현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건 피하고 싶을 수도 있겠고. 간만에 조금 특이한 구성과 독특한 변호사 이야기를 만나서 쟝르소설을 좋아하는 자로서는,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싶다. 다음 책도 나온다고 하니 기다렸다 봐야지.
크리스티나 올손의 <파묻힌 거짓말>을 얼마 전에 보고, 마지막에 남겨진 여운 때문에 다음 책을 안 볼 수가 없었다. 거짓말 시리즈인데다 첫 권에서 해결 안된 얘기들이 <피할 수 없는 거짓말> 이 책에서 다 해결된다고 하니 ... 어떻게 안 보겠는가 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목만 달랐지, 한 권을 두 권으로 나눈 것에 불과했다 이거다. 아뭏든, <피할 수 없는 거짓말>은 재밌다. 마틴 베너 변호사의 과거와 현재가 겹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스토리였음에도 그 긴박함과 반전은 즐거움이었다고 얘기하고 싶다. 물론 루시와의 관계에서는 이넘의 마틴 베너,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서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내 현재를 위협하며 다가올 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과거가 누구나에게 다 있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과거는 교정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인지라 현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건 피하고 싶을 수도 있겠고. 간만에 조금 특이한 구성과 독특한 변호사 이야기를 만나서 쟝르소설을 좋아하는 자로서는,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싶다. 다음 책도 나온다고 하니 기다렸다 봐야지.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거짓말>을 다 읽은 게 5월 17일 일요일에서 5월 18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즈음이었다. 다 읽고 옆에 던진 채 자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뭘 읽을까 하다가 아 <중독자의 죽음>을 읽자 싶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책을 책장에 꽂은 기억이 안 나는 거다. 분명, 샀고 구매리스트에도 있고 내가 박스를 뜯었을 때 본 기억도 나는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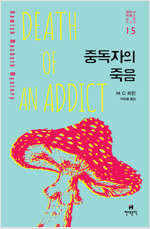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가서 뒤지기 시작했다. 어디다 두었지? 어디다 두었지? 떨어졌나 싶어 뒷 칸도 보고 아래 칸도 보고... 없다. 이상하네.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이러면서 새벽에 30분이나 샅샅이 뒤졌으나... 보이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기억을 되살려보니, 이 책들이 도착한 날, 택배를 몇 개 더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이 책을 제대로 안 빼고 한꺼번에 버린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도달. 절망. 다시 뒤지고 또 뒤지고. 없다. 없다. 아 책을 그냥 날로 버린 것 같다!
이게 다... 술 탓인 게다. 토요일날 받았는데, 술김에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는 그 책을 안 뺀 모양이다. 정말이지 하다하다 별 일을 다 하는 비연.. 이 시리즈는 내가 애정하는 시리즈라, 결국 다시 보관함에 넣어두고 다음에 재구입하려 하고 있다. 에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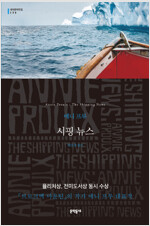
그래도 다음에 읽을 소설책 한 권은 정하고 자자 하고 절망감 속에 고른 책이 이 책, 애니 프루의 <시핑 뉴스>이다. 진작에 읽고 싶어서 사두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책장에 고스란히 놓여 있길래 냉큼 집어서 가지고 나왔다. <흑.페.사>는 가지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 이따가 집에 가서 읽을 생각이다. 지난 주에 그거 들고 다니다가 어깨 나가는 줄 알았다...
이번 주는 맑은 정신으로 지내기. 술약속은 있으나 (여러 개네..=.=;) 과음하지 않기. 책 그냥 내다버린 스스로를 기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