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드거 소텔 이야기 1
데이비드 로블레스키 지음, 권상미 옮김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9년 4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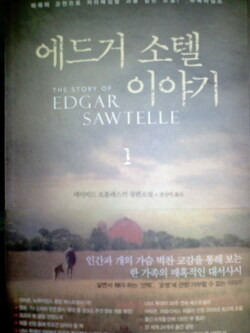
잘 듣는다는 것은 인간의 큰 덕목 중에 하나다. 경청에 관련된 책이 잘 팔린 이후 경청은 많은 자기계발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되었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로 이런 것이 있다. 한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가서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 떠드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진지하게 듣기만 했다고 한다.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상대에게 흥미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적절히 보여주고 듣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남자가 돌아가자 내내 떠들고 있던 대화의 상대자는 그 남자를 극찬했다고 한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터라 듣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기를 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모임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듣는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소통의 고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의미한 지껄임보다 잘 듣고 상대의 정보를 얻는 것이 오히려 호감도 사기 쉽다. 그런 면에서 이 책 '에드거 소텔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소년이었다. 잘 들었던 것이다. 문제는 너무 잘 들어서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만다.
소텔 집안이 원래부터 전문적으로 개를 키우는 집안이었던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인 존 소텔이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일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처음 그는 농장을 샀지만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었다. 개에 대한 애정이 존 소텔이 농장을 사게 만든 동기였다. 그는 끝내 소텔 종이라는 종을 만들어낼 정도로 교배에 성공했다. 존 소텔에게는 두 아들 가르와 클로드가 있었고 둘째 클로드는 해군에 입대하고 가르는 농장에 남았다.
에드거의 아버지는 가르였다. 어머니의 이름은 트루디로 뛰어난 훈련사였다. 두 사람은 에드거에게 어떻게 만나고 결혼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사이가 좋은 것만은 분명했다. 다른 지역에서 고립된 작은 왕국에서 에드거는 그저 행복했다. 아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가 맛본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집과 축사로 이루어진 작은 세계 말이다. 에드거가 태어나기 전 가르와 트루디는 아기를 원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었던 것이다. 허나 바라던 임신이 되었지만 트루디는 두 번의 유산을 겪는다. 세 번째의 임신,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번만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리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태어난 것은 이미 죽은 아기였다.
트루디는 남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절망했고 아기를 포기할까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 때 가르가 숲속에서 늑대의 새끼를 주워온다. 새끼늑대는 트루디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분유나 우유를 먹지 못했고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만다. 그 즈음이었다. 에드거가 잉태되고 건강하게 버티어 낸 것이 말이다. 이번에야 말로 집안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기뻐한지 5일이 지나자 이상이 발견된다. 아기가 결코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부모는 근심에 휩싸이고 온갖 검사를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소텔 집안의 개 앨먼딘도 이상을 알아챈다. 결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기의 존재를 안 것이다. 앨먼딘은 조용히 아기에게 접근한다. 그 이후 앨먼딘은 조심스러운 개가 되었다. 에드거의 반려견이 된 것이다. 트루디가 앨먼딘을 고른 것도 그 눈에 담긴 슬픔이 그가 가진 이상을 포용해줄 것 같아서였으니 틀린 선택은 아니었던 셈이었다. 앨먼딘은 지친 어머니가 듣지 못한 아기의 숨소리에 주목한다.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전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리가 나지 않는 입을 통해서 말이다. 앨먼딘은 트루디의 얼굴을 한 번 핥은 다음 조용히 물러선다. 그녀는 깨어나 아기를 보고 안아 올린다. 그 때부터 에드거와 앨먼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후 에드거는 성장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 그는 잘 들을 수 있었고 단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뿐이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수화나 필담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소텔 집안의 평화로운 왕국은 자의로 그곳을 떠난 탕아가 돌아오면서 무너져 내린다. 균열은 그가 돌아온 순간부터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미 프롤로그에서 한 남자가 한국의 부산에서 독약을 사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해군 기지가 있는 1952년의 한국의 한의원에서 검시를 해도 나오지 않을 독약을 산 남자는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는 편이었다. 남자가 하는 거짓말들이 에드거를 휩쓸지만 그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가 하는 감언이설에 속았다면 에드거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에드거는 너무 잘 들었다는 것이다. 앨먼딘이 에드거의 소리없는 비명을 잘 들었듯이 에드거에게 모든 것은 너무 분명했다. 1권이 끝난 시점에서 모든 것은 평온하지만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부술 답으로 에드거가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다음 권을 계속 읽어나가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