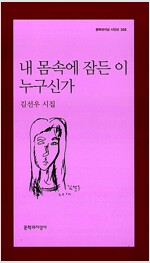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한다. 오늘 같은 아침, <한겨레>를 읽어도 답답한 마음이 가득한데, 이런날 하물며 <조선일보>더냐, <중앙일보>더냐.
<내 서재 속 고전>은 챙겨서 읽는 유일한 칼럼이다. 서경식, 고미숙, 강신주가 필진인데, 오늘은 강신주의 마지막 칼럼이다. 강신주가 고른 책은 김선우 시인의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이다. 그가 각별히 좋아하는 시인이라는 말에, 진작에 사두었고, 진작에 읽었으나, 아... 시는 언제나 어렵다. 그 깊이와 넓이를 아직은 잘 모르겠다.
죽은 것에 목메어 울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려고 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품어 주려는 시인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아파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가는 일 아닌가. ‘이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보자.
어리고 푸른 봄들이 눈앞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생명을 보듬을 진심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사방에서 자동인형처럼 말한다
가만히 있으라 시키는 대로 해라 지시를 기다려라
가만히 기다린 봄이 얼어붙은 시신으로 올라오고 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의 어른이라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식에 찌든 권력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이 참혹하다
미안하다 반성없이 미쳐가는 얼음나라
너희는 못 쉬는 숨을 여기서 쉰다
너희는 못 먹는 밥을 여기서 먹는다
(한겨레, 2014. 8. 25. <내 서재 속 고전>, 강신주)
아롱이 아침을 먹이며, 칼럼을 읽는다.
병원으로 실려간 유민아빠 김영오씨와 동조단식을 하다 쓰러진 김장훈씨와 동조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과 다른 여러 시민들에 대한 기사를 읽는다.


밥을 먹고 있어서 미안하고.
그래도 평범한 아줌마, 30대 후반의 전업주부인 나보다는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왜 피해자인 유가족을 만나지 않나,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답답하다.
이대로 잊는건, 잊혀지는 건, 결국 ‘가만히 있으라’던 그들이 바라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