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호대차로 책을 대출했다.
일반적으로 책의 표지는 반질반질한데, 이 책은 약간, 아주 약~간 질감이 느껴졌다. 색상은 화면으로 볼 때보다 옅은 것 같았다. (이건 인터넷으로 옷 사고 나서 상품후기에 주로 쓰는 말인데... 쩝...) 책을 잡았을 때의 느낌도 좋아서, 이 책도 새 책처럼 깨끗한 편이었지만, 완전 새 책을 잡았을 때의 느낌은 더 좋았으리라 상상할 수 있었다.
책을 펼치고, 뭘 먼저 읽을까.
‘패니와 애니’, 이게 이 책 제목이니까, 제일 대표적인 건가보네, 이거 읽을까.
‘목사의 딸들’, 이 제목 다락방님 페이퍼에서 본 거 같네, 이거 읽을까.
‘당신이 날 만졌잖아요.’ 이것도 다락방님 페이퍼에서... 헉.
이게 뭐야, ‘당신이 날 만졌잖아요.’
뭐..... 이를 테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 이거 읽어야겠다.
유리창 너머, 아롱이가 헤엄쳐, 헤엄쳐 내게로 온다. 당당하게도 아롱이는 등에 보조판을 떼고서 내게로 오고 있지만, 그것을 자유형이라 부르기에는 아롱이가 너무 자주, 일어선다. 아롱이가 내게 온다. 걸어서 온다. 손을 한 번 흔들어 준다. 오른손 엄지로 ‘최고’라고 말해준다. 아롱이가 뒤를 돈다. 아롱이가 헤엄쳐 선생님께로 간다. 나는 다시 ‘당신이 날 만졌잖아요’를 읽는다.
"난 너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를 외면하며 말했다.
“하지만, 내 몸에 손을 얹었잖아요.” 그가 말했다.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안 그랬다면 나도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야 했어요.” ...
“돈 때문이 아니라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난 네 어머니뻘이라고 해도 좋을 나이야. 어떤 면에서는 이제껏 네 어머니였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가 말했다. “머틸다 사촌은 내게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캐나다로 나가요 - 그게 좋을 거예요 - 날 만졌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몸이 떨렸다. 갑자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너무 망측해!“ 그녀가 말했다.
“뭐가요?” 그가 반박했다. “당신이 날 만졌잖아요.” (213쪽)
아주 잠깐, 순간이었지만, 그 때의 느낌을 잊지 못하는 남자와 그 모든 상황을 애써 외면하려는 여자의 모습이 가감없이 그려지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책에 자세히 나와있다.
작품해설을 읽어보니, 로런스(창비쪽 로렌스)는 이 단편을 남자주인공의 이름과 똑같이 『헤이드리언』 으로 바꿔달라고 출판 직전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작품해설, 335쪽) 내 생각에도 이 제목이 훨씬 낫다. “당신이 날 만졌잖아요.”
2. 안나카레니나 설문이후 나는 문학동네 <안나 카레니나>를 구입했다. 이 자리를 빌어 나의 물음에 성실히 응해주신 하이드님과 다락방님께 감사~~~~

문학동네판에는 영화교환권이 1장 들어있었다. 책 사이에 끼워놓아 한 동안 잊어버렸다가 확인해보니, 집 주위 영화관에서는 이미 상영이 끝난 상태였다. “어머나! 표를 날리게 생겼네.” 다행히, 충무로 대한극장에서는 아직도 상영 중이었다. 급하게 교환권으로 예매를 하고, 영화를 보러 시내에 나갔다.
자리에 앉아 팝콘을 한참 ‘폭풍흡입’ 하고나서야, 나는 내가 영화관에 혼자 왔다는 걸 실감했다. 아, 처음인가, 영화 보러 혼자 온 거? 생각 좀 하려는데, 영화가 시작됐다. 영화는 재미있었다. 스토리가 극장식으로 전개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 이미 자신의 역할을 한 배우들이 있는데 연기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게 될 테니까. 나도 ‘안나’역에 ‘키이라 나이틀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자신만의 ‘안나’를 그려낸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의 관심은 역시 브론스키.

이 정도 외모로 꼬셔주시면, 안 넘어가기 어렵다는 소박한 깨달음.
또 한 가지 깨달음. 오만과 편견에서 키이라 나이틀리의 상대배우였던 이 분.


이 영화에서는 안나의 오빠 오블론스키로 등장. 외모로 봤을때 유사점을 찾기 매우 어렵지만, 본인은 영화를 보며, 악센트로 알아냈다는. 조금 아쉽.
3. 저번주에는 알라딘서재에 <안나 까레니나>에 대한 페이퍼가 꽤 올라왔다.
나는 아직 문학동네 <안나 카레니나>를 사놓고 읽지도 않았는데, ‘박형규 교수’의 <안나 까레니나>라니. 게다가 저 표지 좀 봐라. 아, 어떻게 해.
아침부터 신랑한테 <안나 까레니나>를 보여줬다. 신랑이 말했다.
“야, 책 사는 게 취미냐? 책은 읽어야지. 집에 있는 책 다 읽었어?”
“자기야~~ 진정해. 책 다 읽고 나서 책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를 가르키며) 나보다 심한 사람들 엄~~청 많아.”
“쳇!”
그리고는 출근해버린 당신이었다. 그런데, 아롱이가 자유형인지, 걸어서인지 내게로 오던 그 시간에 신랑한테서 전화가 왔다.
“자기야, 내가 자기가 쓸데없는 짓 할까봐 그러는 건데.”
‘쓸데없는 짓? 뭐? 뭐 어떤거?’
“<안나 까레니나> 그거 생겼다. 자리 비웠다 오니까, 책상에 하나 올려져있네. ***님이 **들한테만 하나씩 돌리신거 같애. 러시아나 프랑스 문학 그 쪽을 좋아하시거든. 아무튼 이따 그거 가져간다.”
내참, 세상에... 신랑이 안 사준다니, 다른 사람이 사서 준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니.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벅차다. 신랑은 책을 건네며 “이건 뭐야, 이건 뭐, 주석이다, 주석”했지만, 나는 책을 품에 꼭 껴안았다.
아, 아름다워라. 아름답도다. 착용샷 한 장 올리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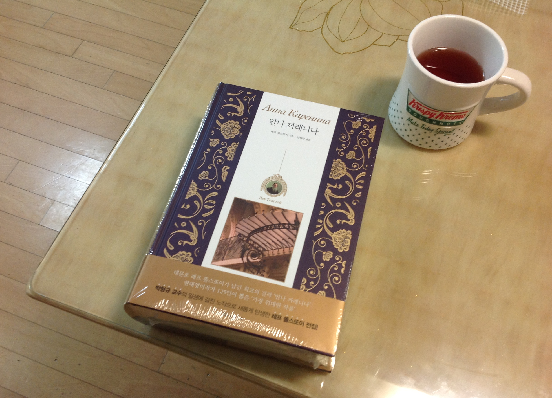
이제 읽기만 하면 되겠다. 우하하. 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