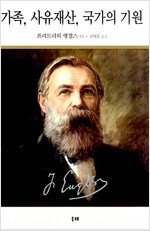캐롤라인 냅의 『개와 나』가 생각난다. <나와 개>와 『개와 나』는 아주 다르지만.
『레베카』를 읽으며 다시는 이 책을 읽지 않겠노라 결심했었다. 그 책의 여러 부분이 불편했고, 불편함을 느끼는 내 감각을 확인하는 것도 불편했기에 읽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였던가.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은 『Rebecca』 구매 버튼을 클릭하고 있었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읽지 않겠다던 그 『Rebecca』를 밤마다 세 쪽씩 혹은 네 쪽씩 읽어가고 있다. 불편했던 구절은 이렇다.
He stroked my hand absently, not thinking, talking to Beatrice.
‘That’s what I do to Jasper,’ I thought. ‘I’m being like Jasper now, leaning against him. He pats me now and again, when he remembers, and I’m pleased, I get closer to him for a moment. He likes me in the way I like Jasper.’ (『Rebecca』, 114p)
It was over then. The episode was finished. We must not speak of it again. He smiled at me over his cup of tea, and then reached for the newspaper on the arm of his chair. The smile was my reward. Like a pat on the head to Jasper. Good dog then, lie down, don’t worry me any more. I was Jasper again. (132)
자유로운 신분이지만 하녀에 가까운 삶을 살던 ‘나’는 맨덜리 저택의 주인 맥심의 청혼에 신데렐라와 같은 인생역정을 이뤄냈다. 맥심이 살던 맨덜리는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다. 갈 곳 없는 처지였던 나는, 그와의 결혼으로 ‘드윈터 부인’이 되었다. 나는 이제 맨덜리의 안주인이 되었지만, 나의 지위라는 것은 너무나 위태로워 내가 의지할 사람은 맥심뿐이다. 스무 살 연상에 무심하고 바쁜 맥심. 내게 청혼해서 나를 밴호퍼 부인에게서 구원해준 사람.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가끔 나를 쓰다듬어주는 사람. 나는 맥심의 발치에 앉아 그의 팔에 기댄다.
여자에게 운명처럼 강요되는 결혼(『제2의 성』, 579쪽)에서 여자의 선택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개인으로 존재하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집단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증여되는 제공물 중의 하나(580쪽)일 뿐이다. 결혼을 통해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고, 여자에게는 처녀성과 엄격한 정조를 남자에게 바쳐야 할 의무가 생긴다(583쪽). 남녀 모두 결혼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더 희생하는 쪽은 여자다(588쪽). 『레베카』에서 ‘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맥심의 기분을 살핀다. 그가 무얼 생각하는지, 무얼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옆에 붙어서 그의 관심을 받으려 애쓴다. 한편으로는 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돌아온 그를 뛰어가서 맞이한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밖에 볼 수 없음을 안다. 나는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고, 그 속에서 내 삶을 만들어간다. 결혼이 나의 선택이었던 것만큼 동시에 그것은 사회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관습에 기초한 결합에서도 사랑이 싹틀 기회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609쪽)이라는 보부아르의 주장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사랑이 반드시 열정적인 육체적 욕구의 실현 속에서만 구현되는가, 라고 묻게 된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를 구속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 관계의 ‘배타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학습’된 것인지 궁금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단단히 ‘구속’되기 원하는 그 이중적인 마음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마음과 양보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 여자는 하녀이지만 동시에 여왕일 수 있다. 남자는 주인이지만 또한 심부름꾼일 수 있다. 여자는 남자의 심기를 살피고 그를 안아주고 위로한다. 남자는 야구를 보면서도 옆 눈길로 여자의 눈치를 보고, 여자의 말을 기억해 먼 길을 돌아 여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란 무엇일까. ‘여자는 우상이며 하녀’(『제2의 성』, 227쪽)라는 보부아르의 주장과 훨씬 더 적나라한 실비아 페데리치의 말 ‘우리는 하녀이자 매춘부이고 간호사이자 정신과 의사’(『혁명의 영점』, 45쪽)라는 말 그 너머에, 어쩌면 결혼이라는 제도적 모순 속에서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 강고한 이성애 선호와 ‘행복한 나의 집’ 종류의 핵가족 신화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합리적인 구조 속에서도 가끔 그럴 듯하고 괜찮은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말? 그런 걸까. 보부아르의 결론은 이렇다.
결혼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개인들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 보날드, 콩트,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 제도 자체가 근원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675쪽)
『레베카』의 ‘나’와 맥심은 범죄의 공모를 통해 둘 사이의 침묵마저 편안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가 되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미리보기 몇 장을 읽는다. 『제2의 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흐미, 두꺼운 것.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